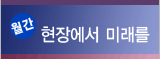특/별
특/별 /기/고
/기/고
일․미 제국주의의 상호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1)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 기초한 일․한 연대운동을!
도마츠 가츠노리(土松克典,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회원) |
글머리에
한국의 농민운동가 이경해(李京海) 씨가 자결로써 항의한 멕시코
칸쿤의 WTO(세계무역기구) 제5차 각료회의가 9월 14일
‘각료회의 선언’ 안(案)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99년의 씨애틀에 이은 이번 사태는 농업 교섭이나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무역 원활화, 정부 조달의 투명성)의 틀에
관한 합의를 둘러싼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과 ACP(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국가들 간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결렬을 근저에서 규정한 것은 칸쿤에 대비하여
오랜 준비기간을 쌓아온 세계사회포럼(WSF) 등, 전세계
반글로벌리즘(반세계화) 운동의 결합된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투쟁한 세계 인민의 이라크
반전(反戰)의 소리를 무시하고 3월 20일에 강행된 미․영
제국주의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은 5월 1일 부시의
‘전투종결선언’에도 미․영 점령군에 대한 게릴라 공격이
그치지 않고 미․영 제국주의에 의한
점령․부흥정책은 혼미에 빠져 유엔(국제연합)의 승인에
의한 다국적군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이라크에서의 전투가 ‘종결’을 향하고 있던 4월
30일에 미 정부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및 이스라엘에
제안된 중동평화계획(roadmap)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면충돌에 의해서 파탄에 직면해 있다. 그리하여, 미 정권 내의
‘네오콘’이 청사진을 그리고, 부시 정권이 실행하려고 한 중동
‘민주화’ 구상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제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8월 27일에서 29일에 걸쳐
조․미(朝米)*1) 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당사국인 조․미와 중개역의
중국, 거기에 관계국인 일본․한국․러시아가
참가하는 이 6자회담은 어떠한 계급적 성격을 갖는가? 그리고,
일․미 제국주의는 여기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어떤 내부갈등을 거쳐 이번 6차회담에 임했는가?
나아가, 부시 독트린 발표 후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을 거쳐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고 전쟁의 위기가 강하게 주장되는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호소하고 싶다.
일․미 동맹의 질적 전환(1)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주변사태’(周邊事態)
대응으로 ― 일․미 안보의 ‘재정의’
금년 6월 6일, 일본의 제156 통상국회에서 ‘유사 관련
3법’(有事關聯3法) 안이 중의원에서 9할 이상, 참의원에서 8할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성립되었다.
이 전쟁법이 성립하게 되는 배경에는 언제나 미 제국주의에 의한
일․미 동맹의 강화․개변(改變) 압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일본 제국주의 자체의 세계적인 전개에 의한 권익
확보를 군사적으로 담보하고 싶은 충동이 존재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라고 표기한다)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악선전이
최대한 이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한 배외주의(排外主義)
정책은 현재에도 그치지 않고 재생산되고 있다.
이 ‘유사 관련 3법’의 성립에 이르는 일․미 동맹의
변천을 동북아시아 정세와의 관계에서 보면, 직접적으로는
93년․94년의 조․미 핵위기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교착된 조․미 교섭을 당시의 클린턴 미
대통령은 무력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일본 인민은 이미
잊었거나 본디부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부르주아 매스컴의
정보 조작이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거기에서
입을 한․미 연합군과 민간인의 많은 희생도 그렇지만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에 ‘조선 유사’에 대응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턴 정권은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들이댄 ‘유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일(對日) 요구사항은
실로 1,700항목이나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조․미 핵위기 사태는 이때에는
‘조․미 제네바 합의’(94년 10월)로 조․미 간의
대립관계에 평화적 해결의 길이 열림으로써 일단 수습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후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
일․미 동맹의 질적 전환(일․미 안보체제의 강화와
‘주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 태세 정비)을 계속
요구하고, 조셉 나이 당시 국방차관보의 이니셔티브로 일련의
일․미 안보 ‘재정의’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쏘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의 일본
정부(호소가와<細川>내각)가 ‘방위문제 간담회’를
설치(93년 2월)하고, 유엔이나 기타 지역적 안전보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다각적 안전보장 협력’을
‘일․미 동맹의 견지’보다 앞에 위치시킨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방향―21세기를 향한
전망』(히구치<樋口> 보고서, 94년 8월)에 대한 미
제국주의 측으로부터의 견제였다. 이 『희구치 보고서』의
구상이 미 제국주의에게는 일․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
제국주의가 군사적 ‘자립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나이 이니셔티브는, 우선 일본과 한국의 주둔기지를 중심으로 한
미군 10만 명의 동아시아 전방전개병력의 유지를 강조한
『동아시아 전략보고』(나이 보고서, 95년 2월)로 시작되어,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의 각의결정(閣議決定, 95년 11월)을
거쳐, 하시모토(橋本)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에 의한
『일․미 안전보장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동맹』(96년
4월)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공동선언』에서는 강고한
일․미 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해
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하여, ‘일본
유사’에만 한정했던 ‘일․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주변 유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일․미 공동작전체제를
포함한 ‘신(新)가이드라인’(97년 9월)이 일본과 미국의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변사태법’(99년 5월)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의해서
자위대는 ‘전수방위’ 이외에 ‘주변지역’에서의 사태에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군의 전투행동의
‘후방지원’(병참 활동이나 정보 지원 등)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미 동맹의 질적 전환(2)
헌법 개악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요구 ―『아미티지
보고서』
클린턴 정권 말기인 2000년에 들어오면, 나이 이니셔티브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일․미 안보 ‘재정의’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특별보고서 『미국과 일본 ― 성숙한
파트너쉽을 향해서』(아미티지 보고서, 2000년 10월)가
그것이다. 보고를 총괄․정리한 아미티지는 2001년 1월에
발족한 부시 정권에서 국무부 부장관의 자리에 취임하고, 이후
이『아미티지 보고서』가 부시 정권의 대일(對日) 요구의
기본으로 자리잡았다.1)
거기에는 “일․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은
태평양에 걸친 이 (일․미) 동맹에서 일본이 수행할 역할의
증강을 향한 출발점이며, 최종목표는 아니다”라고 하여,
“일본이 집단적 방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간의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 금지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안전보장상의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되어 있다. 나아가 일․미 동맹의 모델로 미․영
동맹을 들고, 미․영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정된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실한 실행, 그것에는 유사입법의 성립도 포함된다”고 하여,
일본국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2)의 행사와 전시총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사입법’의 제정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발언하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는
“권리는 있지만, 헌법 해석상,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97년에 개정한 ‘일․미
신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전제로 “일본의 모든 행위는 일본의
헌법상의 제약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이러한 헌법상의 제약을 모두 “제거해
버려라!” (결국, “개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국가의 길로 급선회하는 일본―개헌을 지시하는 고이즈미
내각
2001년 4월에 취임한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부시 정권의 이러한
대일 요구에 충실히 응해 왔다. 9․11사건 직후, “깃발을
보여라”(Show the flag)*2)고 요구하는 미국 측에 전면적으로
호응하여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2001년 11월, 2년간의
한시법, 연장 중)을 성립시키고,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이지스함을 포함한 자위함대와 항공자위대를 파견했다. 또한
부시․블레어의 이라크 전쟁에도 맨 앞에서 지지를
표명하고, 이번 국회에서는 ‘유사 관련 3법’에 더해서 이라크
부흥 지원을 빙자하여 ‘이라크 특별조치법’(2003년 7월,
4년간의 한시법)도 성립시켰고, 이번에는 “현지 파병”(Boots
on the ground)을 요구하는 미국과 영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금년 연말에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병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는 ‘유사법제’ 가운데에서 국회상정이
좌절되었던 전시총동원법인 ‘국민보호법’안이나 미군과
자위대의 원활한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이 내년의
통상국회에 상정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테러 대책특별조치법’이나 ‘이라크 특별조치법’과 같은
한시법이 아니라 항시 가능하게 하는 파병항구법도 그 후에
상정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항구법의 성립을 허락한다면,
조선에 대한 파병도 자동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고이즈미는 지난 8월25일 자민당에 대해서 2005년
11월까지 아미티지의 요구에 맞게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헌법 개악에 착수하는 구체적 정치일정을 점점 더 명백히
하였다. 고이즈미로 하여금 헌법 개악에 착수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준 것은 명백히 이번 국회에서 ‘유사 관련 3법’에
찬성한 민주당의 동향이다. 민주당도 가담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제국주의의 두목들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일․미 동맹의 강화와 다국적에 걸쳐 전개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익’ 확보를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지금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을 지렛대로 ‘헌법 개악’ = ‘전쟁
국가’의 길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독트린 ― ‘국익에 기초한 국제주의’
한편, 2001년 1월에 대통령직에 취임한 조지 부시는 같은 해
9․11사건에 대응하여 ‘테러와의 전쟁’ 정책을 명확히
하고, “테러 편에 붙을 것인가, 우리 편에 붙을 것인가, 중간은
없다”라며, 양자택일을 전세계에 강요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2년 1월에 미국 국방부는 『핵태세 재평가』(NPR)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핵 사용 대상국으로서
이란․이라크․조선․리비아․시리아․중국․러시아의
7개국을 명시했다.3)
나아가 부시는 같은 달에 발표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이란․이라크․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결자세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9․11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02년 9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아메리카 국가 안전전략』에 서명하고 20일에
그것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지만, 테러리스트가 미국민이나 미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행동하고, 선제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시
독트린은 단독행동주의․선제공격전략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동시에 여기에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관철을 위한 국제전략이 망라되어 있다. 그것은 부시 독트린의
밑그림이 된 콘도리자 라이스 미국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의 외교문서 「국익에 기초한
국제주의를 모색하라」4)에 보다 단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거기에는 부시 당선 후의 새로운 정책의 골자로서, “△ 미군이
틀림없이 전쟁을 억제하고, 전력을 전개하고, 억제가 무너진
경우에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 △ 자유무역과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이 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정치적 개방을 촉진할 것. 지금까지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인 지역으로는 그다지 간주되지 않았던
서반구*3)도 그 대상으로 삼을 것. △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번영 및 자유를 보호 신장하기 위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동맹국과 강고하고 긴밀한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 △ 장래의 국제정치체제의 성격을 형성해갈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대국과의 관계, 특히
러시아, 중국과의 포괄적인 관계를 정책의 초점으로 삼을 것. △
불량배 국가의 정부나 적대적인 국가가 만들어내는 위협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임할 것. 그러한 나라들은 테러리즘이나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에 손을 대고 있다”고 쓰여 있다.
거기에서는 단독행동주의․선제공격전략과 함께 자유무역과
국제통화체제의 유지․확장, 동맹국 관계, 대국간 관계,
‘불량배 국가’에 대한 대응전략이 열거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제주의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확고한 기반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여 클린턴 전 정권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5) 그로부터의
전환을 명확히 표명했다. 그리하여 부시 독트린을 처음 실천에
옮긴 것이 미국과 영국의 정권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이었다.
일․조 정상회담 ― 미국의 견제를 받은 ‘자주외교’
그런데 이 독트린에 부시 스스로가 서명한 바로 그 날 (2002년
9월 17일),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일․조 정상회담이
열려 고이즈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일․조
평양선언”이 교환되었다. “선언”은 제1항에서 10월 중의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를, 제2항에서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을,
제3항에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제4항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강화를 강조했다. 일․조 양국 간의
전전․전후를 통한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금후의
선린우호관계 수립의 길을 개척, 그것을 통해서 조선반도를
필두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단서가 될
“선언”이었다.
그런데 일․조 정상회담의 실시와 “일․조
평양선언”의 발표는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나이
이니셔티브로부터 『아미티지 보고서』를 거쳐 부시 독트린으로
쌓아온 일련의 일․미 동맹의 재편․강화라는
역방향(力方向, Vektor)으로부터 명백히 벗어나는 일본 정부의
대미 ‘자주외교’였다.6)
부시 독트린에서 일본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통의 이해와 가치, 그리고
양국 간의 긴밀한 방위․외교협력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 규모의 문제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일본 제국주의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도적
역할의 발휘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기초한다”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부시 정권은 재빠르게 손을 썼다. 일․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 달인 10월 3~4일, 켈리 국무차관보를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에 파견하고, 귀국 후 10일 가량이 지난
10월 16일 미국의 국무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느닷없이 켈리의 조선 방문 시에 “조선 측이 핵무기의 개발을
시인했다”7)고 발표했다.
이후 부시 정권은 11월의 KEDO(조선에너지개발기구) 이사회에서
조․미 제네바 합의에서 의무로 되어 있던 조선에 대한
중유 공급을 12월부터 일방적으로 정지한다고 선언하고, 각 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압력을 요구했으며, 금년 1월
6일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조선의 ‘핵계획’
포기결의까지 채택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1월
10일 NPT(핵비확산조약)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8) 그리고 사태는 중국을
매개역으로 한 4월의 조․미 회담 개최, 8월의 6자회담의
개최에 이르고 있다.
이야기를 본디로 돌아가자. 일본 정부의 대미 ‘자주외교’였던
일․조 정상회담은 이렇게 해서 켈리의 조선 방문에 의한
‘핵 문제’의 재연으로 미국 측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또
때마침 터져 나온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등에
의해서 출구를 잃어버렸다.9) 작년 10월 29~30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루어진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 제12차
본 회담은 핵과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결렬로 끝나고, 이후
오늘날까지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은 재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 ― 부시의 방일과
럼스펠드의 방일․방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부시 독트린에 기초하여 미국과
영국의 정권이 국제여론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강행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의해서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부시 정권은 금년 3월에 이라크 전쟁과 병행해서 강행한
미․한 합동군사연습 ‘폴 이글’이 끝난 후에도 F-117
스틸스 폭격기와 F-15E 이글 전투기를 한국에 계속 배치하고, 또
같은 시기에 3시간이 못 걸려 조선에 도달하는 B1, B52 폭격기
24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하였다. 나아가 금년
5월의 대(對) 이라크 전투종결 선언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대규모 재배치를 책정 중인데, 조선반도에서는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에 배치된 부대와 서울 주둔 미군을
4~5년에 걸쳐서 한강 이남의 오산․평택기지(하늘의 거점
‘에어 허브’)와 부산․대구 지역(바다의 거점 ‘씨
허브’)까지 물리는 재배치 계획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작년의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2명의 여자 중학생 압살사건으로
고조된 한국 내의 반미투쟁을 배려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미군은 하늘과 바다로부터의 공격으로 사상자를 가능한 한
내지 않고, 지상전은 한국군과 조선군의 ‘동족 전투’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배치로 되어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7월에 들어와 명백해진 미국 국방부의 ‘작전계획 5030’은
과거의 모든 작전계획을 종합하고, 이번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경험도 보태어 조선의 정권 전복을 노린 위험하기 그지없는 비밀
작전계획이다. 또, 8월에는 미․한 합동도상연습
‘을지․포커스렌즈’가 조선반도를 무대로 실시되고,
9월에는 미국․일본․호주․프랑스 등이
참가하여 조선 선적(船籍) 선박의 검문을 상정한
국제합동검문연습 ‘퍼시픽 프로텍터’가 강행되었다.
그리하여 전쟁 준비 과정에서 10월 17일 부시 대통령이 방콕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앞서 방일하고,
나아가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11월에 일․한 양국을
방문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 방화자(放火者)들의
방일․방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가을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반전․반제 국제연대운동의 투쟁의 질과 넓이가
중요한 이유이다.
6자회담의 계급적 성격
이렇게 한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진행시키면서,
부시 정권은 조선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8월 27일부터
29일에 걸쳐서 북경에서 이루어진 ‘조․미간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10)에
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목표가 어디까지나 조선을 무장해제시켜 사회주의의
요소를 철저하게 해체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부시 독트린이
‘불량배 국가’나 적대 국가에 단호한 태도로 임하고,
자유무역과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모든 나라에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정치적 개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도 투쟁이 맥동치고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세계에서 모두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투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기화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화평’을 축으로 중동 전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중동 ‘민주화’ 구상이나 사회주의 쿠바를
제외한 남․북 미대륙 34개국을 설득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구상과도 공통성을 갖는 미
제국주의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나 지역도, 일찍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고,
지금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적 구성요소를
부분적이지만 정착시키고 있는 곳이다.
6자회담을 준비한 중국 정부도 부시 독트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클린턴 전 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대화자로 위치 짓고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에 비해서 부시 정권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고쳐 위치 짓고 주의 깊게 대응해 왔다. 그에 대항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사회주의 건설의 “기간은 대단히 길고, 100년
이상, 나아가서는 수백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11)라고 하는 과도기 인식
하에 국익 중시와 다국 간 협의 중시라는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정책의 최적(最適) 선택은, 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미․중 쌍방의 공통이익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력한다, ②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다, ③ 미국과 의견 차이나 모순이
있는 분야에서는 차이를 남기고 공통점을 구한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대만문제 등에서 우리의 핵심적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두 손에 대해서는 두 손으로 단호하게 투쟁한다”12)고 하는 대미 정책
하에서 이번 6자회담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 인민끼리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연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크게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앞으로 6자회담이 가령 ‘평화리’에 타결을 보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역에 “자유무역과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가
확대되어 조선에 한숨을 돌릴 기간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의 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이대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붕괴된 후에도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싸우는 나라들과 인민의 곤란이 있다.
그러한 고뇌를 함께 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며, 이 지역의 자유무역권 창출을 태연히 주장하는
지식인․리버럴리스트의 최근의 논조13)에 필자는 강한 위화감과
함께 깊은 분노조차 느낀다. 역으로,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
후의 제국주의 열강의 동향은 우리에게 양국 간이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협정(BIT)에 대한 동아시아 수준의
(나아가서는, 국제적 수준의) 반대운동 형성의 필요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필자는 이 투쟁에서 수행할 일․한 양국
인민의 연대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주의도 또 80년대 후반부터 자본의 다국적 전개에
착수했고, 지금 또 FTA나 BIT라고 하는 자본축적의 폭력적
장치를 무기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의 다국적 전개를
꾀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이다.14) 이번에 일․한
양국에서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책동은
부시 미 정권의 요청에 기초한 일․미, 그리고 한․미
동맹의 재편․강화의 일환으로 강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국적으로 전개해 가려고 하는 일본과 한국
자본의 진출처에서의 권익 확보를 군사적으로 담보해 가는
일본과 한국의 지배계급 독자의 이해관계(interest)로부터도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확립과 사회주의를 전망하며
필자는 모두(冒頭)에서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의 결렬은
전세계의 반글로벌리즘 운동의 결합된 힘이 쟁취한 것이라고
썼다. 또, 아프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의 중동 지역이나
쿠바, 베네즈웰라 등의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부시 독트린에 기초한 미 제국주의의 지배정책이 세계 각지에서
파탄나기 시작하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부시 독트린이,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이 지상에서 지워 없애버리려고 기도한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은 이들의 투쟁 속에 분명히 숨쉬고 있다.
반글로벌리즘 운동 속에서 세계적으로 외쳐 온 슬로건에는
명확한 목표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세계는
가능하다!”―“그것은 사회주의이다!”라고.15)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사회주의 압살 책동과의 투쟁을
빼놓고는 진실로 싸울 수 없다. 그것을 자각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 재생의 깃발을 내건 국제적인 운동조류를
형성해 갈 것을 한국에서 고투(苦鬪)하는 친구․동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다.16)
지금 한편에서는 미 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세계화의 전개와 그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반글로벌리즘 조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관점에 서면, 위의 호소는 결코 필자의 주관적
소망의 표출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부르주아 매스컴이 널리 강요하는 정보 속에서
사고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의 변혁운동의 총체적인 상황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필자도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인민 측의
이러한 지배적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는 또한
계속해서 거듭 논구(論究)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 이 글에서 필자는 그러한 전망이 가능하다는 논거와
투쟁의 소재(所在)를 우선 제기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일․한 연대와
국제연대운동의 전진을 위해서!
<미 주>
*1)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을 가리킨다.
*2) “어느 편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라”는 뜻.
*3)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 해의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를 가리킨다.
* 편집자 주 :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活動家集團 思想運動)의 회원으로서 동북아
평화문제와 한국의 노동운동의 연구가인 도마츠
가츠노리(土松克典) 씨가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을 위하여 특별히 집필해 주신
“日米帝國主義の相互關係と北東アジアの平和問題―プロレタリア?インタ―ナショナリズムに基づく日韓連帶運動を!”를
번역한 것이다.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의
배경과 경위, 그 긴박성을 꼼꼼히 추적하고 그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 기초한 일․한
연대운동을” 조직․강화할 것을 호소하는 글로서, 모든
독자의 필독을 강하게 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필자인 도마츠 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참고로, ‘일미’,
‘일한’, ‘조미’ 등은 ‘미일’, ‘한일’, ‘북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관행이나 여기에서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일․미’, ‘일․한’, ‘조․미’
등으로 옮긴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역자의 주는 본문에서는 ‘*’를 붙인 번호로
표시하여 미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아미티지 보고서』는 안전보장의 측면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정치․경제협력․외교 등 일․미 관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기나라가 공격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써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戰力)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집단자위권의 행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3) 미국의 국방부는 애초에 이 7개국의 명단을 감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민간 인터넷에 의해서 폭로되었다.
4) 이 외교문서는 20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 라이스가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의 신분으로 집필했다.
포린어페어즈 콜렉션(Foreign Affairs Collection) 특별판
『ネオコンとアメリカ帝國の幻想』 (朝日新聞社刊)에 자료로서
수록되어 있다.
5) 거기에는 94년 조․미 제네바 합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6) 당시 이 대미 ‘자주외교’를 일본측에서 담당한 사람이 일본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아시아대양주국장(현
외무심의관)이었다. 다나카는 외무성 경제국장 재임
당시(2000년), 씨애틀에서의 WTO 제3차 각료회의 좌절 후의
일본의 통상외교정책의 중점을 다국간의 WTO 중심주의로부터
양국간․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FTA)나 투자협정(BIT)으로
이동시킨 중심인물로서도 알려져 있다. 다나카의 행동에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 내의 한 지배조류는 일․조 정상회담의
실시와 ‘일․조 평양선언’의 발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포섭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세안(ASEAN) + 3(일본․한국․중국)이라는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창출의 기폭제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7) 『조선신보』(朝鮮新報, 03년 1월 25일자)는 오성철 조선
외무부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켈리 특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작년 10월,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대통령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했다. 우리의
입장은,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특사는 대좌하자마자 엉뚱한 말을
꺼냈다. 자신들의 위성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새로 지하에서 행하고 있다, 이는 조․미
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중지하라고, 오만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허위정보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우리에
대한 고립말살정책에 매달리면서도 한번도 정확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증거를 내놓아 보라는 우리의 요구에
특사는 그 위성사진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지역조차 명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특사에게 말했다. 당신들 쪽은 ‘핵개발’을
운운하지만, 조선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항상 받고
있다. 당신들 쪽이 계속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핵무기는 물론 그 이상의 것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본성적인 요구다. 그러한
강도와 같은 요구를 들이댄다면 이야기할 게 없다고 강고한
태도로 잘라버렸다. 이것이 켈리의 조선방문의 내막이다.”
8) 조선의 NPT 가맹으로부터 탈퇴까지의 경위는
『조선중앙통신』(03년 1월 21일자)의 “NPT 탈퇴까지의
경위”에 상세히 보도되어 있다.
9) ‘일․조 평양선언’으로 조선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일․조 국교정상화를 통해 조선도 끌어들여
‘평화리’(平和裏)에 동아시아 자유무역권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 지배조류에 대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관방부장관(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 등의 또 하나의 지배조류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위협’론을 최대한 선동하여 유사법의 성립 등 국내의
반동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조선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 후자의 세력이 보다 더 부시의 대(對) 조선반도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느 세력이나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억압민족이고, 조선의 남북분단에 책임이 있고, 지금도 조선압살
책동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발 아래에 있는
노동자․인민인 우리가, 이점을 불문에 붙이고, 조선
사회주의의 굴절이나 오류만을 꼬집어 비판하는 것은 현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압살 책동에 가담하는 이적행위임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해 두지만,
필자는 조선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의 굴절이나 오류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은 역사적 경위와
계급관계에 기초하여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백색 테러나 폭탄
사건,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 조선인 자녀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등, 민족배외주의적 공격이 매일같이 빈발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 국내의 위험한 정치상황 하에서 재일을 포함한 조선의
노동자계급과의 연대와 방위는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긴요한 과제이다.
10) 이번 일본의 상업 매스컴은 일제히 ‘북조선의 핵문제’
내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문제’를 둘러싼 6자협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이번 6자회담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조선의
위험한 핵개발을 주지시키기 위한 다국간 협의”라고 왜곡하여
묘사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조선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력으로 삼키려고 하는 미 제국주의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전쟁정책에 있다. 조선 정부와 인민에게 “위험한 것은
실로 미제”이고, 이번 6자회담의 장(場)은 “미제의 선제
핵공격” 내지 “미제의 적대․압살 정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조선의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일환이었다.
11)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12) 夏立平 (샹하이국제문제연구소 국제전략연구쎈터 주임),
“國際關係體系轉變中的戰略思考”, 『國際問題論壇』 2003年
第1期号. 일본어 번역의 요지는 『世界經濟評論』 2003년
8월호에 수록된 凌星光, “中國での國際戰略調整論議”에
소개되어 있다.
13) 대표적인 논문으로서, 다니구치 마고토(谷口誠),
“東アジア經濟圈を提唱する ― 日本はより積極的な貢獻を”,
『世界』 2003년 10월호, 특집
“北東アジアに平和を築くために” 수록. 이러한 논조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창출이 미 제국주의의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주의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미화론에 다름 아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계 다국적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원정 투쟁단을 일본에 보내
폐업․해고 철회투쟁을 260일 이상이나 계속하고 있는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의 한국시티즌노동조합의 투쟁이 분명히
고발하고 있다.
14) 일본 자본의 다국적기업화를 극적으로 진행시킨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87년의 루브르 합의를
계기로, 사회주의가 붕괴된 동유럽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자본의 다국적 전개가 진행되었다. 한국 자본은 그 후
97년의 IMF 위기의 시기를 거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의 집중을 강행하고, 재차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 국가’ 구상의 구호 하에 중국․동아시아로 자본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15) 그리스 공산당이 주최하여 이루어진 금년의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약칭, 아테네회의)에서 그리스
공산당 서기장인 알레카 파파리가는 “또 하나의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의 애매성을 지적하여, “이 슬로건은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본질을 은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思想運動』 2003년 7월 15일호에 번역 게재).
16) 이 점에서 필자는 본지 『현장에서 미래를』 2003년 5월호에
게재된 채만수 소장의 권두언 “반미․반전․반제
노동자․민중전선을 강고히 조직하자” 및 7월호에 게재된
원영수 국제기획실장의 쟁점연구 “북핵문제와 남한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응방향”의 글 속에서 호소된 일본
노동자계급․인민에 대한 국제연대의 호소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