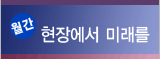현대자본주의의 신경향 :
포스트포드주의의 전형과 “유연한” 자본주의
세계화, 주주 자본주의, 아메리카니즘
테제 1.
기존의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경향은 이제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위기 지속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전형과정(Transformation Process)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경제,
금융자본주의, 정보화 및 연결망사회 등의 키워드는 단순한
“점진적 시행착오”(trial-and-error-incrementalism)에 의한
포드주의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기술․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포디즘적
축적체제에서 포스트포디즘적 축적체제로의 이행으로 파악한다.
이는 기존의 포디즘적 사회운영방식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그러한 구조적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생산과 노동조직의 탈집중화와 유연화: 극소전자혁명에
근거한 생산의 과학화, 산업지형에서 점증하는 3차 산업화 및
노동세계와 산업관계에서의 광범위한 변화
2. 화폐 및 금융자본의 경향적 자립화에 따른 가치창출의 새로운
토대로써 경제의 세계화 및 “비물질화”(Entstofflchung:
Albert·Brock·Hessler·Menzel·Neyer, 1999): 이와 관련한
거대은행, 기관투자자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의 핵심적 역할,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를 지향하는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 기업 인수합병의 증가
3.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neoliberal competitive regime)로의 이행(Deppe, 2001):
사회성의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 De-commodification)
4.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착되었던 “개입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Ruggie, 1982)의 해체:
사회구조의 변화(대량실업의 확산, 사회 불평등의 확대심화,
사회의 분열과 주변화), 사회 속으로 “시장 문명”(market
civilization)의 침투(Gill, 1995a), 문화산업에 의한
대중사회의 마비
5. 전통적 노동 및 노조운동의 약화와 이들의 “대표성
위기”(Ingrao and Rossanda, 1996: 41)
6.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체제경쟁 종식에 따른 국제정치에서
초국적 협의기구 역할의 확대(예를 들어 IMF, World Bank, WTO,
EU, NAFTA, MERCOSUR)
테제 2.
포스트포드주의라는 개념에 내재한 시대구분(periodization)의
문제는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현재 국면을 분석함에 있어서 단지
이론적․기술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전략적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이 포드주의의 위기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포드주의의 사회구성체적 성격은 첫째,
미래지향적인 자본축적 내지는 발전양식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러한 축적양식은 시공간적으로 특수하고
동시에 제한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의 상황은
신․구 생산양식이 혼재된 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축적체제는 아직까지 맹아적 상태로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도 일반적인 사회화(Vergesellschaftung) 연관을
담보하는, 구조적이자 역사적인 동력을 제시하는 하나의
경향성을 드러낸다. 그람시(Gramsci)의 용어를 빌어서
부연하자면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는 자본축적의 동학은
“경향”과 “반경향” 그리고 “연속”과 “불연속”의 연관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 포스트포디즘적 사회화과정은
포디즘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위 자본주의의 객관적 발전법칙의
명령에 맡겨둘 수 없는,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구상과
전략의 추구를 전제로 한다. 그에 조응하는 변형된 생산관계의
포괄적인 제도화 즉, 사회와 생산현장이라는 두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창출에 근거하여 사회의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는 포스트포디즘적 조절양식(생산관계의 새로운
통제양식)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았으나, 그
형성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은 그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갈등적인 지배 집단들이
한편으로 축적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상이한 전략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계급 및 계층과
정치적․사회적인 합의와 계급타협을 구축해나가면서
자신들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제 3.
포스트포디즘적 축적체제의 진단은 물론 자본주의 발전의 구조와
경향의 분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분석의 단위수준은 이제
국민국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경제(IPE)의
발전경향과 구조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의
축적구조와 기존질서의 재편과정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다(국독자론의 한계!). 나아가서 우리는 축적구조의 분석과
관련해서 조절이론과 신그람시주의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 기능주의 내지는 환원주의를 배격하고,
경제구조의 발전을 정치와 사회의 유기적 결합의 산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축적구조는 “국가와 사회의 복합체”(state-society-complex:
Cox, 1987)의 변증법적 발전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포디즘적 전형의 핵심은 현재 상대적으로 응집력 있는
구조적 특성과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금융자본 주도의 유연한
축적모델”(Aglietta, 2000a 및 2000b; Boyer, 2000; Dorre,
2000), 현존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된 정치적․경제적 변화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미국 헤게모니의 재확립으로 요약되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윤을 추구하는
가치증식과정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자자본주의”(manager capitalism)로부터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가치의 조정을 지향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로의 이행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Dorre, 2000: 39).
물론 이러한 변화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 내에서 진행되는 국가성격의
변화(세계시장 지향적 근대화정치와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내지는 “베스트팔렌국가”1)에서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이행), 생산조직 및 산업관계의 변화(“경쟁적
코포라티즘”: competitive corporatism)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테제 4.
포디즘의 위기와 패권적 세계질서의 재편: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구가하였던 “황금시대”(Marglin and Schor, 1990;
Hobsbawm, 1994; Sassoon, 1996)는 이윤율과 성장의 둔화,
인플레이션 압박, 생산성 하락 등으로 집약되는 경제의 위기적
경향은 재정적자의 누적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가속화하였다.
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의 교환관계에 근거하여
사회계급간의 이해균형을 지향하는 코포라티즘적 제도와
“계급투쟁의 제도화”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창출하였던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내에서 구체화된
“전후(前後) 개혁주의”(Huffschmid, 1999: 119)는 현저하게
침식되었다. 그러므로 안정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초석으로서
계급간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조절양식”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포드주의의 위기는 경제적 생산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였다. 뉴딜정책의 시행 당시에 확립되었던 “생산성의
정치”(Rupert, 1995)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황금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축적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였던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영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포드주의의 위기는
정치(국민국가의 해체와 헤게모니 위기)와 사회(고용의 재생산과
문화)의 영역에까지 해당되는 포괄적인 사회화의 위기였다.
“근대의 프로젝트”(Habermas, 1990)로서 포드주의적
사회화과정은 이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의 탐색과정으로서 실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불투명성”(Habermas, 1985)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끔 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구조조정과정은
사회경제적이고,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었던 시기로 파악된다. 그 요체는 신자유주의로의 정치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이였으며, 그 핵심 프로그램은
탈규제화, 민영화 그리고 유연화라고 하겠다. 국가사회주의의
소멸과 함께 양극 세계질서가 자연스럽게 “단극(單極)
세계질서”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지배로의 복귀는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에곤 마츠너는 단극 세계질서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패권정치의
핵심적 영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Matzner, 2000: pp. 190):
1. “군사적-기술적 핵심”: “전략적 방위시스템”의 예에서
보여지 듯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적·조직적
구상의 지속
2. “통화적-화폐적 핵심”: 세계통화로서 달러 그리고 IMF,
World Bank, WTO 등의 국제기구와 영미 중심의 사적인
신용평가기관과 회계회사 등을 통해서 통화 및 무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3. “이데올로기적-매체적 핵심”: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CNN, MTV, UPI
등의 세계적 방송 매체와 국제 연구소를 통한 과학적, 윤리적
정당화
위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단극 세계질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과정을 그 핵심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기술하는 포스트포드주의적
전형의 중요한 기축이 되었다. 군사적 패권과 함께 세계화시대에
미국의 헤게모니는 이중적 과정을 통해서 정착되었다.
정치로부터 경제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한 탈규제와 급진적
시장자유화를 매개를 의미한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구조조정과정은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합체”
내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초국적 기업과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에 유리한 권력과 지배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경제적 구조변화에서 형성된 새로운
권력블록은 경쟁과 유연화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새로운 자본의
가치증식전략으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사영화(私營化)”
(Bruhl․Debiel․Hamm․Hummel․Martens,
eds. 2001)를 추진하였다.2) 주식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금융이윤을 추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바람직한 개인의 성공으로 윤색하는
“네오아메리카니즘”(Dorre, 2000) 내지는
“앵글로색슨”(Albert, 1992) 유형의 “유연한
자본주의”(Senett, 1998) 모델은 1990년대에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종합”에 의해 특징져지며, 여전히 포드주의적
사회화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라인형
자본주의”(Albert, 1992)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우위를
관철하여 나갔다.
이러한 승전과정은 단순히 헤게모니적 지위변화의 문제가
아니라(Krasner, 1994)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광범위한
구조변화의 문제이다(Strange, 1994; Rottger, 1997). 미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장악한 초국적 경제주체들(다국적
기업, 거대은행, 보험회사, 기관투자자)은 동일한 신념을 지닌
정치가와 지식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 차원에서 축적의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인 신자유주의와 함께 자본주의의 주요 중심부를 가로질러
포스트포드주의적 사회화를 강제하였으며, 지역적 단위에
제한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포드주의적 사회화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조직의
상부에 G-7(1997년 이후 G-8) 국가들과 자본분파들의 구성원들이
결합된 “초국적(transnational) 역사블럭”이 완성되었으며,
이들의 주요 목표는 “착취율과 장기적 이윤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별국가와 시민사회 내에서 자본주의적 규율을
강화하는”(Gill, 2000, 40) 데 있다. 길은 자본주의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이런 역사블록의 핵심을 현재 진행 중인
경제와 사회의 세계화의 추동력으로써 “규율적
신자유주의”(disciplinary neoliberalism: Gill, 1995a,
2000)이라고 명명한다.
미국의 “국가와 사회의 복합체”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세계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적 역사블록”의 형성을 이
글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근대화를 설명하기 위한
해독코드로서 ‘아메리카니즘의 제 2의 물결’로 규정한다.3) “신자유주의적
반혁명”(Cockett, 1995)에 의한 자본주의의 포스트포디즘적
전형과정은 이제 미국 헤게모니의 보호아래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테제 5.
포스트포디즘의 특성: 세계화는 단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미 백 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의
통합과정이다(Altvater und Mahnkopf, 1996; Dicken, 1998).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Bairoch, 1996). 현재의 경제적
세계화의 새로운 특성은 우선 가치실현의 최적화로서 세계의
‘철저한 자본화’와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경제와 정치 연관의
사회구성체적 대상화로서 그 ‘관철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Rottger, 1997: 20). 세계화의 중요한 추동력은 무엇보다
기술적 변화이다. 그 하나는 교통과 운송시스템의 개선에 근거한
신 물류제어시스템(logistics) 구상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발전이다(Reich, 1993: Altvater und
Mahnkopf, 1996: Castells, 1996: Scholte, 1996). 전자는
세계적인 연결망화과 표준화에 기여하였으며(Borrus und Zysman,
1997), 후자는 금융시장의 탈규제화와 기업 및 경제기관들의
국제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본의 세계화”(Hirsch,
1995: 13)와 연관된 독특한 징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연결망화된 생산의 세계화 및 지역화: 생산과 판매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글로벌 소싱”, “아웃소싱”, 국제적
하청계약, 그리고 금융조달, 마케팅, 자원조달과 관련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정보, 생명공학, 자동차 및 항공)에서 다국적
기업들 간의 전략적 동맹(Dicken, 1998; Schamp, 2000), 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으로는 공간적 “근접” 혹은
“클러스터링”(Porter, 1990; Camagni, 1994) 그리고
“산업특구”(industrial district: Pyke und Sengenberger,
1992)
2. 상품과 자본이전의 세계화: 무역과 직접투자4)에 있어서 대외경제와의
유착 강화와 세계경제에 있어서 지역적 블록 형성(EU, NAFTA,
MERCOSUR, ASEAN)5),
대외무역에 있어서 신 정치질서(GATT, WTO)와 “초국적
경제외교”의 발전(예를 들어 G-7: Amin und Thrift, 1994)
3. 금융시장의 자유화: 국가 금융시장의 탈규제화,
“통화투기”와 유가증권시장의 확장에서 비롯된 “카지노
자본주의”(Strange, 1986)에서 자본흐름의 국제화, 주주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경영과 통제(corporate governance), 파생상품
거래의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화(Huffschmid, 1999;
Weed, 2000)
상기한 구조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적절한 자본의 가치증식조건을 복원하기 위한 국제자본과 국가의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전략”(Hirsch, 1995: 9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생산과 시장관계의 합리화와 유연화는 그 중심에
놓여있다. 자본주의에서 시스템의 합리화는 언제나 사회·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와 관계하고 있으며6), 나아가서 그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포스트포드주의적 세계화는 경제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7) 세계화과정은
이때 두 가지 현상을 드러낸다: 그 하나는 국경을 넘어서는
과정의 확대로서 “범위” (scope)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작용관계로서 “강도”(intensity)이다(McGrew und
Lewis, 1992: 23; Petrella, 1996: pp. 64).
그러나 포스트포드주의를 포괄적인 전형과정으로 규정한다고는
하여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경제는 정치를 선행한다. 정치
즉, 국민국가와 복지체제 내에서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현재의
결과는 이를 반증한다.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세계화의 중핵은 금융시장의 국제화이다.
경제학자 오브리안(1992)은 이를 “세계적 금융통합”에 의한
“지리학의 소멸”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거대은행, 투자기관,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 그리고 초국적 기업 등의
국제무대에서의 연기자들(“global player")은 세계화의
핵심적 담지자로 간주된다. 이들은 가치창출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에 비해 더 강력하게 국제 분업을 지향한다. 나아가서
이들은 포스트포드주의적 의미에서 생산과 사회의 합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사회의 소유관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90년대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초한 미국식
성장모델로서 생산과 재생산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지배는
“주주가치 체제” (shareholder vale-regime)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때 “경영자 자본주의”로부터 “주주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실질적인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Albert, 2000: 14).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특성은 단지 지난 수년 동안에 시장에서
발생한 비약적 성장에서가 아니라8), 자본의 확대 재생산의
관철형태와 경제와 (국제)정치에 대한 지배메커니즘의 관계
속에서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앞서 강조하였듯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메커니즘을 둘러싼 미국 헤게모니의 이해가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 및 금융자본의
과잉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정치적 전제조건은 분석을 위한
필수적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테제 6.
금융자본의 과잉과 “달러-월스트리트-체제”: 자본교역의
자유화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전제조건의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유세계질서”를 위해 행했던 유일한
자선행위였던 브레튼우즈조약이 1971년 미국의 일방적인 달러의
금태환정지 통고, 뒤이은 달러의 평가절하 그리고 미국의
대외무역수지악화 등에 이어 1973년에 완전히 붕괴하였다는
점이다.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의 도입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사영화에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아리기가 미국정치의 “광란의 시대”(Arrighi,
1994, 300)라고 표현한 레이건 정부 기간에
신자유주의적·통화주의적 학설 및 이데올로기와 함께 관철된
미국의 금융 및 화폐시장의 탈규제화와 자유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전제조건들은 단지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포드주의적 발전의 부정적
결과의 소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화폐와 금융자본의 과잉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일반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늦어도 1970년대에 명료하게 드러난 “구조적 과잉축적”은
일반적으로 맑스주의적 논쟁에서 “화폐적 축적으로부터 실질적
축적의 분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조적
과잉축적은 “단지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투자)자본의 주어진
양이 아니라, 투자를 찾는, 그러나 아직 생산영역에서 충분하게
발견할 수 없는 화폐자본의 존재”라고 하겠다(Conert, 1998:
290). 요약하면 축적되었으나 아직 실물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은
화폐자본이라고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 1960년대에 두 가지
특수한 이유9)와 결합되어
유로달러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유로시장에서는 형식적이고
지리적 지위가 문제시되지 않는, 다만 런던, 뉴욕과
룩셈부르크에 그 사업이 집중되어있는 국제금융시장만이
문제된다. 역외(域外)시장(offshore market)으로서
국제금융시장은 중앙은행과 개별국가의 금융시장감독의 영향권
바깥에 놓여있었으며,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에게 이자연계나
자본세 등 자국 내에서 부여된 사업제한을 회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로시장에서 화폐자본은 비록 신용을 통해서
실물자본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미 통화투기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Arrighi, 1994, pp. 301; Conert, 1998: 396).
앤드류 월터는 유로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변화를
“국제금융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Walter, 1991: 200).
금융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맑스적
의미에서 “가공자본”(fiktives Kapital: MEW vol. 25, 483)을
의식적으로 반주기적 경제조정을 위해 사회적 가치증식과정으로
인도하였던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의 폐기와 관련되어있다.
브레튼우즈조약의 붕괴에 따른 국제통화 경쟁의 회귀는 물질적
재생산과 국제무역을 위한 지불수단과 신용으로써의 화폐기능을
“화폐자산의 투자수단”으로 변형시켰으며(Huffschmid, 1999:
119), 따라서 은행에서 신용의 형태로 창출되었던
“가공자본”은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198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 핵심국가들 내에서
관철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플레의 억제만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고정관념(소위
NAIRU 원칙:
non-accelerating-inflation-rate-of-unemployment)에 기초한
통화정책은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통화투기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왜냐하면 NAIRU는
실물경제적이 아니라, 다만 화폐적으로만 규정되기
때문이다(Heise, 1996: pp. 142; Huffschmid, 1999: pp. 130).
신자유주의적 통화정책은 더욱이 조세와 긴축정책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분배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저임금과 화폐자산(예를 들어
이윤분배 -profit sharing-, 주식배당에의 참여, 기업연금)의
이중적 소득구조를 강요하였다. 이때 기업과 투자금융기관은
그러한 자산의 직접적인 관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국제자본시장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며,
세계화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종합하는 추동력이다. 이제 이러한
화폐 및 금융자본의 세계적 관철형태는 이들의 배경과
매개방식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
통화, 금융관계는 언제나 지도적인 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인
결정의 산물이며, 동시에 지배메커니즘을 위한 잠재적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피터 고웬은 IPE의 체제이론(regime theory)에
근거하여 미국헤게모니 아래서 금융시장의 경제지배와
패권정치의 결합구조를 “달러-월스트리트-체제”(이하 DWSR)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DWSR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 미국의 패권정치적 지배를 회복하기위한
닉슨정부의 이해관계에 연결되어있다. 그에 상응하였던
닉슨정부의 조처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고의적인 폐기를 통한
국제금융시장의 자유화였다. 이러한 조처는 달러를 취급하던
역외시장(“city of London”)이 미국정부의 정책에
종속되어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세계통화로서 달러(금본위가 아닌 달러본위)와 “국제적
투기”(global gamble)가 벌어지는 미국중심의 국제금융시장의
상징으로써 월스트리트 간의 긴밀한 관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헤게모니의 토대가 타국에 대한 직접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시장중심으로 구조화된 권력형태로 이전하였음을
의미한다(Helleiner, 1994; Gowan, 1999, 19-23). 현재의 DWSR
구조적 요소로는 다음의 것들을 언급할 수 있다:
1. 연방준비은행(FRB): 국내 이자율의 결정을 통해 국제적
이자율을 조정
2. 워싱턴의 정치: 그때그때의 미국의 이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미시경제적 관리(예를 들어 국제은행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방침의 확정으로 1988년의 바젤 협정)
3. 통제되지 않는 국제은행과 금융시장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새로운 역할: 유럽가입국가들의 지원에 근거한 미국경제의
파산관리자 역할, 특히 IMF는 1985년의 소위 “베이커 플랜”에
기초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국가들을 DWSR로
통합시키는 집행자 역할을 수행(Marazzi, 1996)
4. 월스트리트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통제기능의 유착: 자국
내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됨에 따라 국가의
금융시스템과 월스트리트와의 결합이 강화됨(Gowan, 1999, pp.
28).
DWSR에 기초하고 미국의 이해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이중적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미국은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통해서 국제적 관리자로서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지배의 새로운
형태(주주가치)와 재 복권된 자유방임적
불로소득자-이데올로기(rentier ideology)를 관철시켰다. DWSR은
정치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달러지배에 기초한 금융거래규모의
확대와 함께(특히 1980년대 FRB의 고금리정책의 영향) 흡사
“자립적 체제”(self-sustaingin-regime: Gowan, 1999:
33)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정치가 언제나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한 점에서 DWSR은
포스트포드주의의 전형과정에서 국가와 시장간의 새로운 관계를
반영한다.
시장 급진적 경제독트린의 세계적 확대는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수렴을 통해서 진척되었다. 그러한 승전과정의 이데올로기적
만병통치약은 일찍이 라틴아메리카의 채무국가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마련하기위해 미국정부, IMF, 세계은행 등의
수뇌들이 모여 만들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은 1989년 경제학자 윌리암슨에 의해서 정리된
경제 및 금융정책적 권고 10항목10)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본질적인 내용으로 압축된다: “1.
통화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통화의 안정화 즉, 화폐공급의 엄격한
제한과 국가예산 및 경상수지 적자의 철폐 2. 가격을 비롯한
모든 시장규제의 철폐와 정부보조금의 철폐 3. 기업 및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 및 관공서들의 급속한
민영화”(Matzner, 2000: pp. 126). 시장자유주의의 계시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프로그램은 남미에서의 적용을
거쳐서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레이건과 대처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이후 EU, OECD 그리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정부기구에서 점차로 관철되었다.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DWSR 동력 간의 피드백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행정부 내의 핵심적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모두 월스트리트의 “동료”(FRB의 그린스펀,
재무부장관인 루빈, 그의 후임자인 서머)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이들 “삼총사”는 “세계화된 경제의 정치국”(“Times”의
표현으로 Matzner, 2000: 190에서 재인용)을 구성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국제정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적 경제원칙은 이제 IMF, GATT/WTO,
G7/G8와 같은 다자간 정부기구의 지원을 통해 DWSR 방식의
경제와 자본의 가치증식조건을 세계적으로 통일시켜나갔다. 미국
헤게모니 아래의 월스트리트 중심의 금융시장은 이제 개별
국민경제에 대한 세계법정이 되었다.
테제 7.
금융자본주도의 유연한 축적체제: 자본축적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조정 시도는 점증하는 소득편차와 사회응집력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핵심국가들 내에서 점차적으로
관철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신경제”(new
economy) 현상에 기인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 현상으로
핵심기술로서 ICT의 급격한 확대, 동일 분야에서 급속한
생산성증가뿐만이 아니라 “구경제” 분야에서 ICT의 적용에
따른 부가적 효과, 자본시장에의 영향, 기업환경의 재편,
주식투자 붐, 새로운 소비물결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1990년대 미국에서의 경제성장과 기적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반현상과 함께 미국 자본생산성의 인상적인
성장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신경제”가 새로운 생산력이나
ICT에 근거한 가치창출의 새로운 원칙뿐만이 아니라, 공장 및
사회구조 그리고 그들의 권력관계에 관계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코포라티즘과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낡은
형태를 넘어서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일 경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 등의
집합명사로서 “신경제” 개념은 (거시)경제뿐만이 아니라 근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아글리에따(2000a, 2000b)와 브아예(2000) 등의
조절이론가들은 이러한 “신경제”를 동반하는 미국의
성장양식을 “자산소유자의 축적체제” 혹은 “금융주도의
축적체제”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ICT에
기초한 신 생산패러다임11)과 주주가치를 지향하는
자본의 가치증식의 종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테제는 장기적인 포드주의의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축적양식이 이미 운동 상태에 들어섰음을 제시한다(Aglietta,
2000a: 142; Boyer 2000: 116). 두 이론가들은 증대된 자본의
생산성, 지속적인 위험자본의 유입, 단기적인 다품종 소생산,
지속적인 기술혁신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정책 등에 종속된 주주자본주의의 성장순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거시경제의 상승과 관련하여, 노동자산과
화폐자산(예를 들어 주식 및 자본참여, 기업연금)의 결합에 따른
자산효과와 지속적인 수요 사이의 연관관계는 임금의 표준화를
매개로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서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 테제는 포스트포디즘적 조절양식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유연생산모델의 내재적 동력이 사회의
응집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인하며, 동시에 사회의
응집력(즉, 산업관계의 민주적 규제)을 확보는 실천적 과제임을
의미한다.
실천적 전망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헤게모니가 공장에서 출발한다”는(그람시) 포드주의의
전제와는 달리 “포스트포드주의의 헤게모니유형”은 정보기술에
토대를 둔 공장조직의 합리화원칙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장 내지는 기업에서 경영과 고용 간의 행위는 오히려
금융체제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된다. 즉, 헤게모니는 이제
공장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화된 소유자자본주의와
국민국가 내부의 노동사회 간의 긴장은 시장조절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도출되며,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핵심적 모순이다. 한편 유연한 축적체제에 신
“시장중심적 통제유형”과 “통제된 자율성”(kontrollierte
Autonomie) 간의 민주적 잠재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의 자세로서 “자발적 적극성”과 노동자들의
(기업)목표 순응적인 태도는 경영의 위계적 통제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테제 8.
금융자본주도의 축적과정에 대한 함의와 잠재적 평가:
사회구성체 변화는 단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무엇보다 계급관계와
분배관계의 제도적, 법률적 규제형태)가 사회적, 정치적 주요
행위자들 간의 역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야만 한다(Deppe,
2001b: 51). 시대구분의 관점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발전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상호 유착된 영역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1. 생산관계의 변혁 2. 기술과 분배의
역사적 발전경향(즉, 축적과정) 3. 특수한 권력형태의 계승과 타
계급과의 타협.
주주자본주의는 생산관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소유와 처분의 관점에서
그 이전 경향의 수정은 감지된다. 주주지향의 기업지배는 경영에
대해 소유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이는 20세기 초의
금융자본시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핵심은 거대 자본기업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라고 하겠다. 이전에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의
원자화된 소유구조는 이제 투자금융, 기업연금, 보험회사,
거대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들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안전하고 재빨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소액투자자들과 함께 한 기업의 소유자가 다른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네트워크 유형의 소유구조”를
형성한다(Hirsch-Kreinsen, 1998: 211). 따라서 경영자의 결정과
행위는 기업의 소유자 또는 투자자들의 이해에 얽매이게 되었다.
자본주의 핵심국가들 내에서 그러한 변화는 기업 내에서 경영의
자율성 소멸과 코포라티즘적 타협의 회피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곧바로 계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계급의식 및 노동과 자본 간의 전통적인 투쟁의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주주자본주의 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주주가치 지향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지 노동관계에 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경험과 가치지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ennett, 1998).
실업률은 빈번하게 임금 통제와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었다. 더구나 임금과 이윤 간의 오래된 갈등은
점차적으로 이자, 이윤 그리고 임금 간의 갈등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에서 자본의 소유자는 헤게모니적
권력블록의 중핵이다. 이들은 모든 다른 계급이나
계층에게(경영자,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 새로운 규율을
강제하며,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축적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타협을 시도한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양보 협약”(concession bargaining), 저임금과
화폐자산(이윤배당, 스톡옵션, 기업연금 등)으로 구성된
소득구조의 이중체제 등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임금의 유연화방식은 초기에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철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보잘것없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예를 들어 Employee Stock Owership Plans; 401-plans;
Granted Stock Option)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추가적 동인이 되었다(Holley und Jennings, 1988: 471; Priewe,
2001: 114). “국민자본주의”, “참여기업”, 공동기업“ 등
이에 대한 온갖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자산형성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임금단체협상체제의 파괴를 겨냥하고 있으며, 낮은
기본임금과 기업이윤에 결부된 추가소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자산소유 축적체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한다(2000a: 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핵심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통제양식으로서 주주가치 전략은
기업의 동질성(corporate identity)과 노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나갔다. 되레는 새로운
헤게모니 체제를 “이중운동”으로 파악한다: “시장과 경쟁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제 구조조정으로서의 거시경제적 논리는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노동과 기업조직의 협력적, 참여지향적인
근대화 시도와 조우한다”(Dorre, 2000: 29). 다시 말해서
되레는 금융체제 아래의 주주자본주의가 생산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때 그러한 잠재력은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적절한 규제와 함께 기획될 수 있다고 본다(ebd. 392).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보면 현시기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구성체적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새로운 축적모델의 핵심 즉, 성장속도의 발전기로서 경제와 사회
불평등의 불가피성은 이미 EU 국가들 내에서 조차 오래전에
관철되었다. 그 사례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일련의 백서
“성장, 경쟁, 고용을 위한 백서”(1993)나 “정보사회로의
유럽의 길”(1994)에서 단초가 발견되며, 2000년 7월에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회의에서 결정된 행동강령인 “정보유럽
- 만인을 위한 정보사회”에서 구체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주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범주만이 아니다. 이는
경제로부터 사회와 정치에 작용하는 “신입헌주의”(Gill,
2000)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이다. 물론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는 응집력있는 조절양식은 현재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의 미싱링크(missing link)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양식은 조절이론가들이 포드주의의 분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역사적 습득물”(hitorische Fundsache)로 치부될
성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와 생산현장에서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포스트포드주의적 전형과
관련된 생산과 정치 그리고 사회간의 역동적 구성관계가 보다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1555년 Augsburg 종교회에서 천명된 Cujus regio, ejus
religio(Wer die Macht ausubt, bestimmt in seinem Bereich die
Weltanschauung) 독트린에 근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재천명. 이러한 로마법의 부활은 주권국가에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IPE에서 국민국가의 주권에 대한 정치적
기초를 확립하는 역사적 계기로 파악됨(Cox, 1987: 112).
2) “사적인 국제정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적인 정치포럼을
통해 엄호되었다. 이미 1970년대에 “로마클럽”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관심에 대항하여 설립된 “삼각
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는 이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구성에 있어서 북미, 유럽 그리고 일본의
동등한 머릿수로 구성된 이 초국적 엘리트 네트워크는
1980년대에는 집행위원회에 세계 100대 초국적 기업 중 2/3가
소속되었다(Gill, 1990, p. 157). 1990년대에 “사적인
국제정치”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함께 1991년에 “지속가능한
기업회의(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 등의 설립에 의해서 강화되었다(Pijl, 2001,
p. 97).
3) 물론 필자에게 아메리카니즘의 제 1의 물결은 포드주의
시대의 팍스아메리카나를 의미한다.
4) 세계무역은 1960년대 이후 세계적 규모에서의 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대외 직접투자는 세계무역과
국내직접투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1986년과 1990년
사이에 GDP의 연간평균성장률은 9.0%, 국내직접투자는 10.0%,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13.0%, 그리고 대외직접투자는 24.0%를
기록하였다(UNCTAD, 1994: 20).
5) 1980년대에 지역 내부간의 무역은 세계무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비중은 1985년 46.2%에서 1995년 52.1%로
증가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유럽내부의 무역량은 65%에서 68%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40%에서 50%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북미에서는 39%에서 36%로 감소하였다(Stiftung Entwicklung und
Frieden, 1998: 214).
6) 맑스는 이러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생산관계의
총체성은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를 지탱하며, 특정한
사회의 의식구조형태에 조응하는 실질적 토대로서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한다”(MEW vol. 13: 8).
7) 이와 관련하여 하비(1990)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강조한다. 사회학자
로버트슨(1992: 8)은 조금 특이하게도 현재의 세계화를 “세계의
압축 그리고 전체로서 세계의식의 강화”로 규정한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를 기준으로 국경을 넘어선 공채와
주식의 연간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1975년과 1993년 사이에
독일은 5.1%에서 169.6%로, 미국은 4.2%에서 134.3%로 비약적인
증가를 경험한다. 1995년 기준으로 평균 매일 10조 달러가 넘은
돈이 증시에서 거래된다(Hickel, 1996: 14).
9) 그 하나는 초과달러수입을 미국 내의 은행구좌에 지불하지
않으려는 수출국가들(특히 소비에트연방)의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엄격한 미국의 은행감독(2000년에 폐지된 글래스-스티걸
법: Glass-Steagall Act, 1933)을 피하려는 해외 및
미국기업들의 이해이다(Huffschmid, 1999, pp. 26).
10)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엄격한 재정 운영 2. 공공비
지출에서 선택적인 우위선정 3. 조세개혁 4. 금융자율화 5.
무역거래를 위한 조화로운 환율 6. 무역자율화 7.
무역장벽철폐와 해외직접투자 8. 민영화 9. 소유권 10. 탈규제화
(Williamson, 1994, pp. 26).
11) 카스텔은 자신의 "정보경제"(informational
economy) 개념에서 신기술에 조응하는 기술패러다임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보기술적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사회관계를
형성한다”(Castells, 1996: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