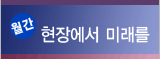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
|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
| 글번호 |
274번 |
등록일 |
1996-12-01 00:00:00 |
| 글쓴이 |
불프강 도이블러 |
글쓴곳 |
|
| 발행호수 |
16 |
분야 |
7 |
| 첨부파일 |
 9612(16)독일노동법에서의탄력화와규제완화.hwp
- 52 KB
9612(16)독일노동법에서의탄력화와규제완화.hwp
- 52 KB
|
| 제 목 |
독일 노동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 완화 |
|
독일 노동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 완화(3)
볼프강 도이블러(독일 브레멘대 교수)
이 글은 독일의 도이블러(Prof.Dr.WolfgangDubler. 브레멘대학)
교수가 95년 9월 7일 「Flexibilisierung und
Deregulierung im deutschen Arbeitsrecht」라는 제목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강연한 내용을 교수 본인이 대폭 가필하여
일본의 ꡔ法律時報ꡕ 68권 8, 9호(96년 8, 9월호)에
니시타시 사토시(西谷敏, 오사카 시립대) 교수의 번역으로 실린
것을 재번역한 것이다. 도이블러 교수는 1995년 8월부터 3주
동안 오사카 시립대학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오사카에서 세
차례 강연했다. 본 지에서는 이 글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자본 측이
정리해고제나 파견노동제 등을 주장하면서 ‘규제완화와
탄력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것이
표준적 노동 관계를 침식하고 노동 협약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글에서는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자본 측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언급하고 있어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목 차
A. ‘규제 완화와 탄력화’-개념의 의미와 내용
B. 표준적 노동 관계(Normalarbeitsverhltnis)의 해체
1) 표준적 노동 관계의 개념
2) 표준적 노동 관계의 기능
3) 표준적 노동 관계의 다양성
4) 표준적 노동 관계 침식의 원인들
5) 은밀한 해체 - ‘표준적 사용자’의 후퇴
6) 노동조합의 대항 조치 가능성-비전형(非典型) 노동 관계의
제한과 개선
7) 노동조합의 대항 조치 가능성-표준적 노동 관계의 확립
C. 산업별 노동 협약에 대한 공격
1) 입법자의 활동
2) 사용자로부터의 공격
3) 노동 협약 불이행
4) 노동 협약 적용 범위 축소
5) 원인들
6) 협약 자치의 발전
D. 전망
C. 산업별 노동 협약에 대한 공격
기획 번역:독일 노동법(3)
독일 노동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 완화
1)입법자의 활동
80년대 중반까지는 입법자가 노동 협약 교섭이나 그 결과에
접근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었다. 1949년의 노동협약법은,
협약법상의 중요한 원칙에 관한 단편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교섭의 실시와 결과에 대한 평가는 오직 관계자에게만
맡겨두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협약 교섭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 협약에
대한 개입은 판례에 의하여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동 쟁의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제도였다이
문제에 대한 개관은 Dubler, Das Arbeitsrecht 1, Rn 471 ff.
상세한 사회정책적 기능에 대해서는 Blanke, AuR 1989, 2 ff.
참조.
. 더욱이 노동조합에게 유익하지 않는 몇몇 협약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었다. 특히 협약 격차 조항Zachert,
Tarifpolitik ohne Trittbrettfahrer? Das Konzepttariflicher
Vorteilsregelungen, in:Bispinck (Hrsg.), Tarifpolitik der
Zukunft. Was Wird aus dem Flchentarifvertrag? Hamburg 1995,
S.194 ff.
이라든지, 협약에 의한 보호를 실제로 지불받는 급여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른바 실효 임금 조항최근에는 BAG DB
1987,1522. 이 점에 대하여 LAG Hamburg AiB 1991, 63
mitAnm.Engel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핵심적 영역’에
대해서는 자치적인 결정 과정이 보장되어 왔다.
입법자는 이러한 억제적 태도를 우선 1985년에 포기하였다.
「대학․연구소 연구 직원과의 유기한 계약에 관한
법률」Vom 14. 6. 1985 BGB1 I S.1065.
은, 연구원을 기한을 정하여 채용할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였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대학기본법 57 a조
제2를 삽입함으로써 기존의 노동계약보다도 당해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선언된 점이다. 그럼으로써 관련 당사자에게는
연방직원노동협약의 특칙(特則) 2 y항에 의한 유기한 계약의
제한이 무효로 되었던 것이다. 이 법률개정은, 학설상으로 위헌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Nagel, PersR 1985 42;Peiseler NZA
1985, 242;Plander, Recht im Amt (RiA) 1985, 54 ff. 이 점에
대하여 Dallinger NZA 1985, 652 ff.는 합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연방헌법재판소가 교육과학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 소송에
대하여 제소한 지 10년이나 지났건만 아직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는 법률에 맞추어 변경되어 버렸다.
모든 협약상의 유기한 계약 규정에 대하여 동일한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연방노동재판소는 결국 그것을
저지하였다. 1985년 취업촉진법Vom 26. 4. 1985, BGB1 I,
S.710.
제1부 제1조는, 이른바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기타의 경우에
요구되는 기간 설정의 ‘합리적 이유’가 불필요함을
규정하였는데이 점에 대해서는 본 글의 앞부분 B-6)-2를 참조할
것.
, 그때 기존의 노동 협약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판례는 이 점을, 유기한 계약의 제한에 관한 협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BAG DB
1988. 1022 und DB 1990, 1923.
, 대부분의 경우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던 법률 상태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고용촉진법 116조의 개정이다. 그것에
의하여, 동일 산업 분야 내의 다른 협약 지역에서 일어나는 파업
혹은 직장 패쇄 때문에 취로(就勞)할 수 없었던 자는, 1986년
이후 원칙적으로 조업 단축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각
기업 간의 결합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덴부르텐베르크 주에서 파업이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계속되면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 30만 명~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도
못받고 조업 단축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생기게 된다. 노동조합은 재정적 이유로 인해 이들
노동자에게는 파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서, 공격이 노동조합으로
향해지는 사태를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 측이 거기서
확대된 연대 형태를 찾아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그러한 ‘대분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도 힘겨루기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행동 가능성은 고용촉진법 116조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은 특히, 다른 협약 지역에서의
취로 불가능이, 사용자가 록아웃(직장 패쇄)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장(예를 들면 바덴부르텐베르크 주에 존재하는)을
마비시킴으로써 생겨난 경우에도 조업 단축 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되는 점을 생각하면 명백할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4일의 결정에서, 이러한 법률 상태도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고용촉진법 116조를
이용함으로써 노사 쌍방의 동등한 교섭상의 지위 즉 소위 대등
원칙이 현저하게 저해 받을 경우에는 입법자 혹은 노동재판소가
개입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는 유보 조건을 달았다BVerfG DB
1995, 1464 ff.
.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상사태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이 무조건 항복 직전의 상태에 있음을 재판소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권리
보호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숨겨진 투쟁 형태를 가지고
그것을 회피하는 등, 다른 대항 수단에 대한 유혹을 지나치게
강화할 것이다상세한 것은 Dubler, Das Arbeitsrecht 1, Rn 700
ff. 참조.
.
1990년대 초두 연방정부의 규제완화위원회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별 기업에서 경제적인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
협정에 따른 노동자에게 불리한 협약으로부터의 일탈을
인정하라고 제안하였다Marktffnung und Wettbewerb, 1993,
S.149.
.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재차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는데예를
들면, Handelsblatt vom 12./13. 2. 1993, S.6 참조.
, 그것에 대응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현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노동 협약의 불가변적 효력은 협약 자치의
‘핵심적 영역’에 있으며, 거기에는 입법자라고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은 법률가의 논문에서는 (거의)
일치하여 인정되고 있다Berg,
in:Dubler-Kittner-Klebe-Schneider,a.a.O.,§77 Rn 76;Hanau
RdA 1993, 4;G. Mller AuR 1992, 258;Zachert DB 1991, 225.
노동협약의 불가변적 효력은 기본법 9조 3항에 의하여 보장된
협약자치의 핵심적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는 Dubler,
Tarifvertragsrecht, 3. Aufl., Baden-Baden 1993, Rn 352, Fn
20의 인용문헌을 보라.
.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거출 의무의
대가로서, 질병 시 임금 계속 지불 때 1일 혹은 2일의 이른바
임금 불지급일(Karenztage)까지 승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규정은 현행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 시 임금
지불을 흔히 6개월을 초과하여 확대하고 있는 많은 노동 협약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임금 불지급일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대단히 명백하였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그 대신에 법정
경축일을 하루 삭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 하나의 공격은 한층 교묘했고 그 때문에 성공하였다.
1994년에 개정된 고용촉진법 94조 1항에 따르면, 고용 창출
조치에 따라 취로하는 자(ABM-Krfte)ABM이란
고용촉진조치(Arbeitsbeschaf Fungsmaßnahme), 즉 국가의
재정원조를 받는 노동관계이다.
에게 지불되는 보수의 90%만이 보조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용
창출 조치의 실시자는 전형적으로는 전혀, 혹은 거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협약 임금 이하로
일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하는 셈이 된다. 더욱 분명한 것은,
고용촉진법 249 h조 4항 1이다. 그것에 따르면 구동독에서의
이른바 고용 회사(Beschftigungsgesellschaft)나 그와 유사한
제도의 조치에 대한 보조금은, 임금이 협약 임금보다도
‘적절하게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게 되어 있다. 전액
보조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협약상 주당 소정시간의 80% 이하의
노동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고용촉진법 242 s조는
이 모델을 구서독에도 도입하였는데, 거기에서는 보조 대상을
직업 소개가 곤란한 실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는 협약 자치라는 것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분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노동조합은
유사 협약으로부터 10% 혹은 20% 깎인 협약 임금밖에 협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도) 헌법상의 문제점이
표명되고 있지만Udo Mayer Aur 1993, 312 ff.
, 여기에서도 어떤 수정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할 것이다.
2)사용자로부터의 공격
부담이 되는 협약 기준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사용자 측의
시도는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그 방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협약 교섭 자체 안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 인상은 때때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임금 인하 없이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하여 협정한다고
하는 노동조합의 오랜 원칙은 실현 불가능해지고
있다폭스바겐사의 노동협약(Bauer의 해설 부가)에 대해서는 DB
1994, 42 참조. 금속산업 전체의 교섭결과는 NZA 1994, 355에
수록되어 있다.
. 화학 산업에서는 실업자 중에서 받아들여진 직업 훈련생에
대하여 통상의 협약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경과적
임금률(Einstiegstarife)’이 도입되었다W.Schroeder,
Arbeitgeber- und Wirtschaftsverbände:Strategie und
Politik, in:Kittner (Hrsg.), Gewerkschaften heute, Jahrbuch
fr Arbeitnehmerfragen, Kln 1995, S.586에 보고되어 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이 역시 전통적인 규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또 하나의 전략은, 한층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일정 수의―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기업이 그 분야의 사용자 단체를 탈퇴하였다고
전해진다몇몇 자료에 대해서는 Mller-Jentsch WSI-Mitt 1993,
501에 거론되어 있다. 나아가 Buchner, NZA 1994, 2 참조.
. 구동독에서는 인쇄 관련 기업의 약 60%(추정)가, 또한
목재․합성물질 분야 기업의 40%(추정)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Mller-Jentsch WSI-Mitt 1993, 501에
보고되어 있다.
. 노동협약법 3조 3항에 따르면, 탈퇴는 우선 협약의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으며, 노동협약법 4조 5항에 따르면
해약된 노동 협약도 여후 효력(여후효)을 갖지만상세한 것은
Zeitschrift fr Tarifrecht (ZTR) 1994, 448 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그 점이 실제로 배려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기업별 협약 체결은 드물게밖에 성공하지 못한다. 몇몇 사용자
단체는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가입 기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탈퇴 사태 현상에 선수를 치고 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문이 많은 제도지만Rckl DB 1993,
2384;Schaub BB 1994, 2007.
, 사용자 단체 자신이 어떻게 방어에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협약에서 도망치기 위한, 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은 종업원 대표위원회와의 계약이다. 그때
실질적인 노동 조건 수준의 인하가 문제가 되는 수도 있지만,
협약상의 노동 시간 배분에 관한 내막을 기입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본래는 허용되지 않는 주말 노동을 경제적인 대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동독에서 금속 산업 협약이 비상 해약된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위법이었지만Zachert NZA
1993, 299 ff.
사용자는 요구를―약간의 부분에 대해서이기는 하지만―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Mller-Jentsch WSI-Mitt 1993, 500.
.
3)노동 협약 불이행
체결된 노동 협약을 존중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적인 자명한
이치에 속하는 한 법률가도 그렇고 협약 정책 담당자도 협약
준수에 기여하는 수단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법적 수단이 상당히 불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통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그(사용자 단체) 구성원이 협약을
준수하도록 공작할 것을 요구만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BAG DB
1992, 1786.
. (사용자 단체의) 그 공작이 효과가 없으면 (사용자 단체는 그
사용자 단체 구성원에게) 냉담한 경고 문서를 송부하는 것이,
아마 전화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과
함께 예고된 뒤에는, 노동조합이 법률적으로 취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협약 실행의 부담’은 모두 개별 노동자의
어깨에 달려 있게 된다. 즉 노동자는 협약 임금에 대하여
협약상의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노동자는 노동 관계가 해약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한 자신의 사용자를 법정에 끌어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것이
사업장 안에서의 승진 가능성을 없애고, 자신의 직장조차
위험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모든 소송의 80%가 노동 관계 종료 후에
제기되었다고 한다. 노동 관계 존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비교적
소수의 노동자 대부분은 공적 기관에 근무하던 자였다Ramm,
in:Naucke-Trappe (Hrsg.), Rechtssoziologie und
Rechtspraxis, Neuwied und Berlin 1970, S.169.
.
대량 실업과 사업장 내의 리스트럭처링 시대에는 거의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강해질 수 없다. 거기에서, 노동협약법 3조
2항이나 4조 5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단체로부터의 탈퇴에
의하여 협약 보호가 사실상 붕괴로 귀결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개별 노동자는, 종업원 대표위원회와
사용자의 동맹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승산은
없다. 그럴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사업장을 퇴직하는
것을 결단한 사람이라든가 순교자 혹은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에 한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노동재판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에 대하여,
협약을 위반한 경영 협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예외적으로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BAG DB 1991, 1834. 이 문제에 관한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Dubler, Das Arbeitsrecht 1, Rn 923 ff.
참조.
.
노동 시간의 길이와 배치에 관한 또 하나의 시도는 훨씬
교묘하다. 법률 분야의 문헌에서 많은 논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즉, 더 긴 주당 노동 시간을 정한 노동
협약상의 계약은, 노동 협약보다 ‘유리’하며, 국가적인
노동보호법(현재는 6개월 평균하여 주당 48시간)만이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Adomeit NJW 1984, 595;Bengelsdorf ZfA
1990, 581;Buchner DB 1989, 2029;Heinze NZA 1991, 329,
336;Joost ZfA 1984, 176 ff.;Richardi DB 1990, 1617;Zllner
DB 1989, 2121. 이 점에 대하여 Belling, Das
Gnstigkeitsprinzip im Arbeitsrecht, Berlin 1984,
S.183;Dubler DB 1989,
2534;Hagemeier-Kempen-Zachert-Zilius, TVG, Kommentar,
2.Aufl., Kln 1990, §4 Rn 166 a;Kppler NZA 1991,
754;Linnenkohl-Rauschenberg-Reh DB 1990, 630;Lwisch NZA
1989, 959;Zachert DB 1990, 985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 연방노동재판소는 이러한 견해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절차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었던
것이다Neumann, NZA 1990, 966 참조.
. 이러한 견해는 결과적으로 협약으로 체결된 주당 노동 시간이
단순한 권고 기준으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긴 노동 시간을 협정하는 것은, 보다 높은 보수를 이유로
언제라도 가능하게 되며, 보다 짧은 노동 시간도 파트타임
노동으로서 어느 쪽이든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은 주말 노동에서도 보여진다. 자유 의사에 따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취로하고 싶은 자는, 거기에 대립하는 협약 규정이
있어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그것은 개개인의 기호에
양보해 버리는 셈이 된다특히 Lwisch NZA 1990, 388 und BB
1991, 59가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
. 여기에서도 협약의 규정이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4)노동 협약의 적용 범위 축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정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의 90%는
노동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Mckenberger KJ 1995, 30.
. 이것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노동
협약이 채용되는 데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실정 하에서는
‘협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매우 예외적으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취로하고 있는 노동자,
치과 의사이자 사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노동자, 혹은 바이에른의
삼림이나 슈바빙 알프스 지방―요컨대 노동조합이 아직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사회민주당 당원이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으로서 입후보하는 지방―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미화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이 증명될 것이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일정한 기능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그러한 업무가 직접 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하는 일이
일상적인 다반사가 되어 있다. 그것은 건물 청소라든지 식당
경영의 외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 공정의 급격한 단축―많은
부품이 제3자로부터 납입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공장 부지
안에서 생산되거나 하는 데 따른다―에까지 이른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청부 기업이 중소규모의 회사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낮거나 중간 쯤이다. 서비스업에서는 종업원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외주(Outsourcing)’가 예를 들면 금속관련이나 화학관련
기업에서 생기면, 금속 산업 협약이나 화학 산업 협약의 적용
범위는 자동적으로 축소된다. 거기에서 작업을 인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든지 기껏해야
수준이 낮은 협약의 적용을 받아들이는 데 불과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외주일 경우 종업원대표위원회의 공동결정권이 갖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Kreuder AiB 1994, 732 참조.
.
청부 기업이 저임금 노동력을 독일에 파견해 주는 외국 기업인
경우, 문제는 정점에 달한다. 영국의 노동자가 독일에서 외견상
독립 영업자로서 일하고, 영국에서 발행된 증명서에 의하여 사회
보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그러한 사례도 주지하는 바
그대로이다. 어느 경우이건 소셜 덤핑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다이 점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Dubler DB 1995,
726 참조.
. 지금까지, 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되었던 건설 산업 협약을
이러한 일련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공하였던 예는 없는
것이다.
5)원인들
노동 협약의 보호 기준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독일노동법은 80년대의 규제 완화 캠페인으로부터 비교적
사소하게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영국이나 스페인에서는
보호법이 잇달아 폐지되었지만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상태가 유지되었다. 확실히 몇몇 점들―예컨대 유기한 계약
허용이라든가 고용촉진법 116조의 개정 등―에서 후퇴가
보여졌지만, 예를 들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균등 대우 등은
적극적인 발전이 실현되었다. 탄력화와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규범 구조의 틀 안에서 실시되었다. 요컨대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빈번히 유기한 계약을 체결하고, 풀타임 노동자보다도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며, 파견 노동자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는 보다 심각한 공격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판례는 역시 상당히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입법자도 또한 어느 정도 억제적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협약의 보호 수준에 대한 ‘압력’을 회피할 수 없다. 가장
현저하게 후퇴 현상이 보여지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 직접적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이다. 그 점은 조합원 수의 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991년 말부터 1994년 말까지 조합원 수는 15%나
저하하였는데Lhrlein,Mitgliederzahlen,in:Kittner(Hrsg.),Gewerkschaften
heute, a.a.O., S.94.
, 이것은 연방공화국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불과하다. 적어도 종속적 노동자 내부에서의
구조 변화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즉
전통적으로 조직률이 높았던 현업 노동자 분야에서 명백하게
후퇴하고, 그만큼 조직률이 낮은 직원층의 증대가 보여지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화
과정(Individualisierungsprozeß)이 보여진다. 각자는 자신의
설계에 따라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그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동조합 같은 거대 조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화는 사회적인 정책적 전망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동구와 소련에 존재하고 있던 지배체제의
붕괴는, 아마 유토피아의 상실을 처음으로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강화시킨 것은 확실하다. 1989년 이래
‘현실의 사회주의’로부터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장래의 가능성의 기준으로 느끼는 것도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급속하게 고립화 속으로 도피하고 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에 박힌 말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메이데이에는 피크닉하러 나간다거나, 좀더
마이홈 자금 만들기에 신경 쓰는 편이 똑똑하다는 식이 된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인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데 있다. 유럽 내부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일상 생활에서는 동구로의 생산 거점
이동이나 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쪽이 더욱 절실감을 가지고
있다. 세계 규모에서의 투자 입지 경쟁은 사용자의 선전
수단으로서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기업에 대하여, 노동 비용을 절약하는 것, 예를 들면 투자
환경이 정비되면 제3국에 투자하는 것을 실제로 강제하고 있다.
가트의 라운드에서 관세를 한층 더 인하하는 것이라든지 서비스
부문까지도 자유 무역 안에 편입하는 것이 결정될 때마다, 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6)협약 자치의 발전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연장시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더욱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역부족
때문에, 사태를 눈치챈 경영자의 전략에 훨씬 더 명확하게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간 부문의 약
10%에밖에 노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상태에
가까워진다. 그것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떠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궁이 거기에서 생겨날 것인가는 미국의 어느
도시나 조금 걷다 보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면―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개인의
생활 설계에도 부적절한 환경일 터이지만―, 노동조합이 그
구상에서도 현실에서도 다시 힘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길은, 협약 내용을 종래 이상으로 노동자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적합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협약 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 협약을 단순한
‘대강(大綱)으로 후퇴시키고 그 이행을 종업원 대표위원회나
노동 계약 당사자에게 위임하는 것’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노동 시간에
관한 선택권이나, 아마도 그룹 노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
되는 선택권이다. 노동 협약이 개개인의 행동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 요컨대 노동 협약이 경기 변동에 따라 인플레율을 1%
올리거나 내리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초래한다는
것을 개개 노동자에게 체험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약 자치의 그와 같은 ‘새로운 정착’의 내용에는, 노동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노동은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 통상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노동자라고 해도
4시간 지나면 ‘그로기’ 상태가 되는 작업도 있는가 하면,
8시간 지난 후에도 역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도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콘베이어 벨트 노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콘베이어 노동은 점차로 예외가 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그러한 현상[과중한 노동]이 보여진다.
예를 들면 독일의 어느 방송국에서는, 한 사람의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시청자 누구라도 언제나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핫라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화가 3분마다
울린 것은 아니고, 직원은 이웃집 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살 예고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장해를 가져오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일을
2~3시간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일은, 그밖에도 무수히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은 노동 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대제 노동에서, 오늘날
이미 노동 시간을 다른 직장보다 짧게 하는 규정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일정 범위에서 금후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대제는 특히 부담이 큰 작업의 한 가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D. 전망
노동법 정책은 모든 법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다 광범한 정치적
구조 속에서 책정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의 여러 상황 하에서는 지금까지 스케치한 노동 관계의
다양한 종류의 발전이나 협약 자치에 관한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간단하게 처리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노동조합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한 것이 아닐까. 이미 누구도 밑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우리의 사회에서는 분배 분쟁이라는
것은 2차적, 3차적인 것이 아닐까. 특수 계급적이 아닌,
만인에게 닥치는 위험이 주요한 문제라고 하면, 이들 위험은
누구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몰아세울 수 없는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개인화는 유효한 카드인가이 문제에 끼어든 판단에
대해서는, Beck, Gewerkschaften heute, a.a.O., S.25 ff., 115
ff.
.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의 손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집단적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현실들 모두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현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 * *
실업자가 된다는 위험은 일반화되고 있다. 기술적 인텔리층에
속한 ‘특권적 그룹’에서조차 점차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환경이나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상호
크게 다르다고 하여도 실업의 공포는 임금에 대한 종속성 그
자체보다도 강력한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군사 기술 및 일반적 기술의 위험성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개개인의 직장 생활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생활을 뒤덮고 있다. 그것은 저항을 야기한다. 평화 운동이나
환경 보호 운동은 그러한 저항들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위험 원인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묻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스모그(매연)는 민주적이다”)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위험
사회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조합은, 그 사회 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노동 운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의 사람들 속에 동맹자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핵전쟁이나 환경 시스템의 파괴를 막는다고 하는 관심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이다. 히로시마의 그림자
아래서는 이미 개인주의 따위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업화가 점덤 더 많은 생활 영역에 침투하고 있고, 그 결과
개개인은 ‘사생활’에서조차 타인이 결정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노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의
영역에서도, 나아가 장래의 정보 사회에서는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상품과 금전의 교환에 의존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유전자 기술의 이용―예를 들면 인공
수정(Leihmtterschaft)의 예에서 확인되었다―을 둘러싼 논쟁은,
사람들이 자본의 본질인 저 “엄청난 상품의 집적”에는 속하지
않는 물질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의 태도는, 사람들이 비디오텍스트(Bildschirmtext,
BTX)를 예상밖으로 약간밖에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도 보여진다.
사람들은 종래대로 진짜 카탈로그를 한 장씩 넘기거나, 은행과
여행사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다. 컨트롤되지
않고, 규정도 받지 않고, 목적이 없는 대화는 사람들이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는 ‘재산’인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주말문화’의 의의에 대해서는 Rinderspacher, Am Ende der
Woche. Die soziale und kulturelle Bedeutung des Wochenendes,
Bonn 1987, S.44 ff. 참조.
.
가사․육아를 특정한 성에게만 할당하는 방식은 점차로
많은 여성으로부터 수용되지 않게 되었다.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 노동에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가하는 그녀들의
권리는 명백히 저항에 부닥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원자화된
개개인의 사회라는 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관심사이다.
공동으로 옹호해야 할 이익이 아무리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조직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실을 가시적인
것으로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동시에 전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해방된 노동 및 해방된
사회―거기에서는 인간이 결국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관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항성(恒星=붙박이 별. Fixstern)이 없으면 정치적인 일도
계획을 갖지 못하는 방황이 되어 버린다. 각각의 구체적인 한
걸음은, 언제나 그것이 적어도 본래의 목표에 가까워질 기회를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과 전망이 적합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토피아 속에서 탐닉하면서 일상 활동을 그것과 완전히
구별하고 있는 사람은, 성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이 사는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훌륭한
나침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사고는, 공장의 문을 나오면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반적 이익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사회적
운동들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위험 사회와의 투쟁,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을 위한 투쟁 등이다. 그것은 동시에
일상적인 연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음모나
음험함을 비도덕적인 것으로서 물리치는 생활 태도까지도
의미한다. 해방된 노동은 금방 내일이나 또는 모레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연대적으로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의 한 조각을 선취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적
과제인 것이다. ꃁ 한/노/정/연
|
|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