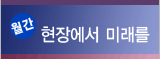신자유주의는 수정되었는가?
래이 킬리(Ray Kiely)
이 글은,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최근의 세계은행 보고서들, 특히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부상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관리’(governance)의 위기에 관한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있다. ‘시장친화적 개입’(market friendly intervention)과 ‘올바른 관리’(good governance)라는 개념이 비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개념들로 동아시아의 ‘성공’과 아프리카의 ‘실패’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NICs의 부상에 대하여 대안적 설명이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대한 일정한 함의가 도출된다.
* 이글은 Noe liberalism revised? A critical account of World Bank concepts of good governance and market friendly intervention, ꡔCAPITAL & CLASSꡕ, Spring 1998, Vol. 64, pp. 63~88을 초역(抄譯)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수정되었는가?
ꠏ세계은행의 ‘올바른 관리’와 ‘시장친화적 개입’ 개념 비판
래이 킬리*1)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매몰된 세계은행(World Bank)1)이 최근 들어 그것을 수정하려한 시도에 대한 연구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가를 본래부터 비효율적인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경제개발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인 정책입안과정으로 환원시킨다.
세계은행은 ‘시장친화적 개입’(market friendly intervention)과 ‘올바른 관리’(good govern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경제개발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미 무력해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수정하려고 시도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계속적 집착으로 두 개념 모두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두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세계은행의 낙관적 전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중략)
1. 신자유주의와 경제개발
1982년에 시작된 ‘외채위기’로 말미암아 ‘정통적인’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수입대체정책을 추구한 국가들에서는, 소비재 수입의 대체가 자본재 수입을 야기함으로써 심각한 외채 부담을 가져왔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은 비효율성과 타락을 초래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외양상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사용한 수출지향정책과 날카로운 대조를 보였다.
물론 수출지향정책들도 1980년대 초반에 불황을 피할 수 없었고 한국도 1982년 당시 엄청난 부채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경기회복이 빨랐고,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인도 등의 많은 국가들에서 목격되었던 경제의 황폐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자를 상환해낼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정황, 즉 수입대체정책을 사용한 국가들의 실패와 수출지향정책을 사용한 국가들의 성공이라는 상황은 개발경제학 내부에서 신자유주적 ‘반혁명’(Toye 1987)을 출현시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NICs가 남북 문제의 ‘예외’가 아니라, 사실상 그들 국가들이 나머지 개도국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챵과 우(Tsiang & Wu, 1985: 329)는 그들 국가의 성공은 “경제적 책략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신고전적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에 의해 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몇몇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어떤 논자들은 명백하게 동아시아적 경험을 그밖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소간 반복될 수 있는, 혹은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Fukuyama 1992: 100~08; Berger and Tsaio 1987).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근대화 이론의 새로운 변형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로써 (서구 자본주의 발전론자인) 로스토우(Rostow)의 이론에 기초한 ‘서구모델’은 신자유주의적 이론에 기초한 ‘동아시아 모델’로 대체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NICs의 성공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에 기초하였다고 주장한다.
(i) 정부의 제한된 경제 개입
(ii) 경제에서 낮은 수준의 가격왜곡
(iii)대외지향적 수출촉진전략(Balassa 외. 1986).
이 원칙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를 구성하였다.2) 실질적 의미에서 이들 정책은 국가의 산업보조금, 최저임금제, 가격통제와 같은 장애물의 제거를 포함한다. (중략)
세계은행은 낮은 수준의 가격왜곡과 급속한 경제발전 사이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World Bank 1983: 60-3). 정부의 제한된 경제개입 정책과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가격왜곡을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여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최저임금제 또는 가격통제와 같은, 가격을 왜곡시키는 힘들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1970년대 31개 개도국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World Bank 1983), 낮은 가격왜곡율과 대외지향적인 나라들이 가격왜곡이 보통이거나 높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오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결론은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견지한 나라들은 수출, 경제성장, 고용이라는 맥락에서 우세한 성과를 거두었다’(Balassa 1981: 16)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첫번째로, 낮은 수준의 가격왜곡과 높은 경제성장률간에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도전을 받았다. 세계은행의 증거자료 자체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가격왜곡은 상이한 각 나라들간의 성장률 차이에 관해 약 1/3 정도밖에는 설명해 줄 수 없다(Jenkins 1992: 193). 반면에 몇몇 부류(칠레와 같이 자유시장원리를 추구하지만 높은 수준의 가격왜곡이 있는 경우)는 그 타당성이 의문스럽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증거자료 자체가 무역정책이 본질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가격왜곡, 대외지향,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제3의 요인, 즉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Jenkin 1992: 194). 그러므로 세계에서 매우 취약한 대부분의 경제가 취하는 강력한 내수지향은 낮은 경제성장율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반영’일 수 있다(Singer 1988).
두번째로 동아시아의 산업화 과정은 강력한 개입주의적 국가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광범한 저작들은 동아시아가 단순히 시장의 힘에 기초한 성장모델이라는 조야한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White(1988), Amsden(1989), Rodan(1989)의 저작들은 국가개입이 광범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19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 단계를 지난 후에, 1961년 이후 수출증진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수입대체정책이 포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부보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같은 국가기구를 통해 산업생산을 계획하였다. 더욱이 은행업무는 1961년에 국유화되었고, 국가는 신용대부를 통제함으로써 특정산업을 육성하였다. 철강 같은 중공업은 1970년대에 그러한 특혜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수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입이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권한을 보장받음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생긴 손실을 보호된 국내시장에서의 높은 이윤을 통해 만회할 수 있었다. (중략)
2. 수정된 신자유주의적 모델
이 절에서는 국가개입이 다른 곳에서보다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시장친화적이었으며 이는 전자의 성공과 후자의 실패를 설명해준다는 신자유주의의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검토한다. 이것은 ‘시장친화적인 개입’과 ‘올바른 관리(정책)’라는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World Bank 1989, 1991, 1993).
1) 시장친화적 개입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기적에 관한 보고서(1993: 5)의 기본적인 내용은,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기본원칙을 올바르게 작동시킴으로써 고성장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아시아의 성공이 경제에서 낮은 수준의 가격왜곡에 기인한다는 기존 주장(World Bank 1983: 60~3), 다시 말해 고성장은 ‘가격이 올바르게 결정되도록 한’ 결과라는 주장에 중대한 수정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World Bank 1993: 5~6). (중략) 그러나 그 보고서는, 이들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개입과는 반대로 시장친화적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3) 이러한 개발전략하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란 사람들에게 적합한 투자 여건을 보증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경쟁적 환경을 제공하며, 국제무역에 대해 경제개방을 유지하고, 안정된 거시경제를 지속하는 것이다’(World Bank 1993:10). 시장친화적 개입은 다음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World Bank 1991:5).
(i) 국가는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에 개입한다.
(ii)국가는 ‘국제 및 국내 시장 규율’에 개입을 종속시키면서 견제와 균형을 기한다.
(iii)국가는 공개적으로 개입하며, ‘책임자의 재량이 아니라 준칙’에 따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의 국가개입은 이 기본원칙들에 따라 수행되었다. 고성장(그리고 합리적인 개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철저히 시장지향적 정책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노동시장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었다. 비록 신용대부를 할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는 보다 선별적으로 개입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여타 개도국 경제에 비해 낮은 가격왜곡과 제한된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입대체는 … 수출촉진과 수출을 위한 수입의 무관세 승인에 의해 신속하게 동반수행되었다. 그 결과 국제비교가격과 국내비교가격 사이의 격차는 제한되었다. … 시장의 힘과 경쟁의 압력은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토록 하였으며, 노동집약적인 수출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 관행의 습득과 그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World Bank 1993: 325).
2) 올바른 관리
세계은행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일면적이라는 점과 구조조정 정책들이 실행되는 제도적 배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나라들은 ‘올바른 관리’라는 개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World Bank 1989, 1992). 이 개념에 대해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다원주의, 책임성과 법률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World Bank 1989: 60~1, 192). 세계은행은 독립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민주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중요한 점은, 세계은행이 올바른 관리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관리는 ‘개발관리(development
management)와 동의어’이다(World Bank 1992: 1). 그러한 관리는 ‘단지 작은 정부가 아니라 더 좋은 정부, 즉 직접적인 개입 노력보다는 다른 것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는 데 주력하는 정부’를 요구한다(World Bank 1989: 5). 세계은행이 올바른 관리개념에 관해 처음 쓴 글에서 인용한 이 주장은, 국가지출은 비생산적이며, 합리적인 개별 기업가가 부를 창조하는 행위를 저해한다는 고전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다. 국가의 역할은 민간부문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국가의 활동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최근 보고서(World Bank 1994: 2, 10)에서 세계은행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30년 전의 동아시아처럼 고속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리라는 희망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한층 진척된 거시경제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은 동아시아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들이란 농업 감세정책, 수출업자 우선지원, 수입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재정개혁을 뜻한다(World Bank 1994: 10~14).
요컨대, 동아시아의 성공은 제한된 정부의 건전한 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예전의 신자유주의적 관점(Balassa 외 1986)이, 동아시아에서 국가는 개입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정되었다. 새로운 관점은 국가개입의 현실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힘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정책을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략) 올바른 관리란 대단히 많은 제도적 요소들을 뜻하는데, 그 제도적 요소들은 시장친화적 개입을 용인하는 한에서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것이다.
3. 수정된 모델에 대한 평가
이 절에서는 수정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1) 시장친화적 개입이라는 사고, 2) 올바른 관리라는 사고, 3) 구조조정에 대한 의의 등을 평가함으로써 검토한다.
1) 시장친화적 개입
세계은행 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은, 국가개입의 특정한 예들을 고립적으로 고찰하고 나서 어떻게 이 개입의 예들이 또 다른 개입에 의해 상쇄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과 대만이 수행한 수입대체정책이 끼칠 수도 있었던 손실은 수출촉진정책에 의해 상쇄되고, 그 결과 정부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따르는 구조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World Bank 1993: 292~316). 그러나 개입의 효과는 그런 방식으로는 적절히 평가될 수 없다. 국가에 의한 특정 조절의 효과는 그것이 경제 전체에 끼친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분석되어야만 한다. (중략)
더욱이 세계은행의 주장(1993: 316)은 섬유산업이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산업의 노동집약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커다란 보호를 받았다. 그것은 특히 1960년대 초부터 대출특혜, 세금과 관세의 면제혜택을 받으면서 국가에 의해 장려되었다(Amsden 1989: 66~8). 그러므로 대규모 섬유산업의 존재는 ‘산업정책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섬유산업이 가장 장려된 부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정책이 잘 작동했다는 것을 시사한다’(Chang 1995: 214).
마찬가지로 보호주의 정책도 수출 주력업종 선정정책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수입통제를 수출주력과 결부시킴으로써 보호주의적 정책이 잠재적인 국제수지 압박을 얼마나 경감시켰으며 또한 이것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가져왔는지를 무시하고 있다(Singh 1994: 20).
이와 유사하게, 세계은행은 한국과 대만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정책은 외국 기술도입 개방정책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주장한다(World Bank 1993: 21). 그러나 랠(Lall 1994: 651)이 주장하듯이,
그 연구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양식의 차이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없다. 이 나라들은 개방형태의 차이가 그들 자신의 혁신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상이한 의의가 있음을 알았고, 이것이 그들의 산업전략에 중대한 요소를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시장원리에 관한 국가정책은 외국기업보다는 국내기업에 의존하여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것이 중요한 연구개발(R&D) 활동4)의 증가를 촉진하였다(Singh 1994:21~2). (중략)
이것은 외국인 투자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대만보다 훨씬 ‘시장친화적’이었던 남미를 포함하여 수입대체정책을 사용한 국가(인도는 제외)들의 결정적인 실패와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Jenkins 1991: 50).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같이 ‘시장 적대적인’ 기술발전을 세계은행도 인지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이러한 정부개입은 고비용․저효율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였다(세계은행 1993: 309).
그러나 이 비용의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보면, 실상 전체 부실여신 중 적은 부분만이 가장 주력 업종인 중공업(화학과 기계)에 의한 것이며, 부실여신의 60%는 중동지역에 과도한 투자를 한 건설업에 의한 것이다. 더 나아가 1980년대 초부터 중공업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러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Amsden 1990: 631). 이 기간에 한국경제는 본질적으로 자유화된 시기였지만,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중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이 과정(단지 1981년에 시작되었을 뿐인)이 한국의 중공업을 경쟁력 있게 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무역자유화가 1980년대 중공업 확장과 함께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확장의 실제 원인은, 1970년대 국가의 주력업종 육성과 기술향상이라는 국가의 시장 적대적인 정책이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 침식당했을 첨단기술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왔다(Amsden 1993: 206~10).
이러한 예들은 세계은행보고서의 부적절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용기 있게 포기하는 결단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그들이 실패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거만하다는 것과 신고전파 학자들의 명백한 혼란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경제실패에 대해서 너무 성급히 정부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성공적으로 발전한 경제에 정부가 수행한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다’(Kwon 1994: 635).
그러한 혼란이 빈번한 오류와 무수한 모순적 주장을 낳는다. 예컨대 세계은행(1993: 6)은 정부개입과 경제성장 사이의 통계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은행은 경제성장과 ‘비개입’ 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론을 계속 사용한다(World Bank 1993: 325; Amsden 1994: 628). 그리하여 그 보고서에서는 산업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르는 산업구조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산업정책의 효과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암스덴(Amsden 1994: 629)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런 식의 검증이 고안되면, 산업화 정책은 인정될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신고전파적인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그들의 기대를 져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시장친화적 접근에 대해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개입정책들은 경제발전과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정책들이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상대가격의 왜곡은 제한적이었으며 여타 대다수 개도국보다도 그 정도가 더 작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World Bank 1993: 351). 물론 이러한 주장은 1983년 ‘세계발전보고서’에 수록된 가격왜곡 지표의 경우와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1993년의 보고서가 제시한 증거자료도 세계은행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세계은행(1993: 301)도 인정하듯이, 수출지향 정도와 가격왜곡 정도가 아시아 NICs 나라들간에는 매우 다양했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은 가격왜곡률이 낮았던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들 후자의 나라들은 가령 브라질,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베네주엘라와 같은,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수입대체산업 국가들 보다 ‘낮은’ 등급이 매겨진다. 흥미롭게도 그 보고서는, 가격에 관한 세계은행의 증거가 한국과 대만보다 브라질과 인도가 훨씬 시장친화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비록 보고서가 그 반대를 증명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아시아 NICs 내의 다양성에 대해서만 논평하고 있다.
2) 올바른 관리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가 설득력이 없다고 할 때, 올바른 관리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두 사고 사이의 관련성은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이 시장친화적 개입과 올바른 관리의 모델이었다는 주장에서 주어진다. 앞서 나는 동아시아 경제가 시장친화적 개입의 원칙 ― 이것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한 개념이다 ― 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경제는 올바른 관리 모델로도 간주될 수는 없다. (동아시아)모델의 ‘근원’에 관해, 세계은행은 오류를 범했으며, 그러므로 그 모델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라는 개념도 당연히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사고도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Healey & Robinson 1992: 94~112). 확실히 이 점에서 볼 때, 오랜 독재정권의 전통을 가진 동아시아 경제는 이 모델로 간주될 수 없다. 이것은 독재주의가 경제개발에 핵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자본주의적 개발의 역사를 볼 때 낙관론이 들어설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략)
올바른 관리라는 개념에 내재하는 약점은, 정치를 대단히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돼 있다. ‘관리’라는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세계은행은 ‘정치’ 발전을 순전히 기술관료적인 문제로 축소시킨다. 폭넓은 사회적․정치적 관심은 크게 무시되고, 따라서 ‘기업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경제와 관련하여 더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사여구로 전락한다. 국내외에서 구조조정의 결과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보게 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석은 없다. 그러한 이해 세력의 존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양태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Uvin 1994: 266). 레프트비치(Leftwich 1993: 620)가 주장하듯이, 개발은, “세계은행이 ‘관리’에 관한 글들에서 단언하는 것처럼 단지 경영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발’ 과정에서 정치의 요체(즉 자원의 사용과 생산 그리고 분배에 대한 갈등, 협상 그리고 협력)가 결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은 합리적인 관료주의가 시장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거나 적어도 시장친화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나리오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계은행이 무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에는 정치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심각한 내부갈등에 직면하자 국가에 의하여 근본적인 토지개혁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다음과 같은 토대를 마련하였다. (i) 대다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평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토대, (ii) 이후 더 이상의 빈곤화 없이 자원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시킬 수 있는 토대, (iii) 국가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는 농촌지역의 기득권 세력을 붕괴시키는 토대. 토지개혁과 그것이 가져 온 결과는 ‘관리’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정치에 대한 세계은행의 제한된 접근방식은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념 속에서 역으로 추적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동아시아의 국가의 개입은 경제 개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개입이 비효율적임에 틀림없다’는 가정이 이들의 이론적 체계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의 핵심은 국가관료는 ‘항상’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들 관료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활동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오로지 이기적이고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를 설명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기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최고의 정책적 선택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경쟁적 시장의 힘이 ‘야경국가’에 의해 번창하도록 하는 정책선택이라는 것이다(Buchanan 1986). (중략)
관리라는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세계은행은 이렇게 일관성을 잃고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 국가는 문제거리로 간주된다. 그러면서도 또한 국가는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중략)
3) 구조조정의 의의
실제로 구조조정을 평가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것은 어디까지가 구조조정 정책들이 수행된 범위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에 관한 비판적 분석은 종종, 세계은행 또는 IMF가 주권 국민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처럼 제시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국제기구들과 개별 정부들간의 복잡한 협상의 결과이다(Harrigan,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정책들간에는 어떤 ‘가족적 유사성’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그 조정정책들에는 종종 환율 평가절하, 수입쿼터제 철폐, 수출 유인책 증대, 농산물 가격정책 수정과 국가예산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은행의 앞서의 질적 규정들을 수용하는 경우조차, 특정한 경우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이유들과 관련해서 더 큰 난점들이 존재한다(Toye 1994).
이러한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1994)은 최근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국가들과 경제성장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확실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법론적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은 특정한 경제정책보다는 오히려 교역의 순조로운 증가에 기인될 수 있다. 더욱이 세계은행 스스로 제시하는 증거에서조차도 ‘올바른’ 정책을 수행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23개 국가들 사이에 백인백색의 정책상 차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Mosley et al. 1995;White 1996). (중략)
예컨대 국제적 식량기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해 보면, 구조조정이 실시된 37개 국가에서 구조조정 기간인 1986년과 93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7년간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사된 나라들 가운데 24%는 성장을 했고, 22%는 동일했으며, 52%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Engberg
-Pedersen et al. 1996:34).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단순히 생산자들에게 부과된 가격통제를 거둬들이기만 한다면 농업 산출량이 증대하리라는 세계은행의 농업에 대한 허위적인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Schiff & Valdes 1992). (중략)
이러한 평가는 세계은행이 구조조정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떠받들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Ghana)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86년 이후 가나가 수행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는 환율 평가절하, 대폭적인 수입통제 해제, 민영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규제의 자유화와 같은 ‘시장친화적’ 정책들을 포함시켜 왔다(Africa Development Bank 1994).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제조업이 성장하였는데, 이는 설비과잉으로 시달리고 있던 공업부문에 수입된 투입물이 조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만연하고 설비과잉이 사라지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결과 산업성장은 1988년에 5.6%에서 1991년 2.6%로, 1992년에는 1.1%로 급감하였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1987년 78,000명에서 1993년 28,000명으로 떨어졌다(Lall 1995: 2025).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성공한 기업은 극소수인 반면에, 살아남은 기업과 새로 진입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지방시장에 내다 팔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이다.
마찬가지로 비공식 부문이 새롭고 역동적인 자본주의 부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기대는 오산이었다. 기본(Gibbon 1996: 769)이 주장하듯이, “구조조정 제안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들 제약조건들은 대부분 조절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약들은 과거에 결코 조절된 적이 없었던 부문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관련된 초기 기술수준, 숙련노동 부족,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계 및 기업의 자원을 둘러싼) 여타의 가계소득 창출활동들과의 경쟁 등이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나라들의 전망은 이제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세계은행(1994: 153)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투자율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동유럽(Gowan 1995)과 라틴아메리카(Weeks 1995)에서의 구조조정 경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4. 후발자본주의 발전에서의 계급과 국가, 그리고 지구적 경제
이 절에서 나는 동아시아 NICs의 부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 나머지 개도국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 논의의 대부분은 한국에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신자유주의 혹은 케인즈주의)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중략)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세계은행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낙관적으로 평가해왔다는 점은 확실하다. 세계은행은,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된 경쟁이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본축적과정에 내재한 불평등, 즉 국제 노동분업관계라는 사다리를 기어올라가려고 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누적되는 기술격차, 불완전한 국내외 시장 그리고 부족한 판매기술과 부족한 하부구조 등 때문에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과 대만은 시장에 비친화적인 국가개입을 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실은 오히려 고의적으로 ‘가격을 왜곡되게 책정하곤 하였다.’ 1960년대에 섬유산업 같은 노동집약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은 손실을 보면서 수출을 하였다(Amsden 1989: ch. 6). 손실은 보호받고 있던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보상되었다. (중략) [또한] 해밀턴(Hamilton, 1986: 83)에 따르면, 사실 실제가격과 생산가격간의 괴리는 1966년 7.8%에서 1978년 11.8%로 증가하였다.5) 그러한 수치는 국가의 가격조작이 시장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상관이 없고, 실은 이것이 한국의 수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격책정’은 한국(과 대만)을 성공적으로 NICs로 이행시킨 주요 요소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은, 올바른 가격책정의 (정태적인) ‘배분적 효율성’에 대해 편협하게 사고함으로써 변동하는 비교우위의 과정이라는 ‘동학’(dynamics)을 설명하지 못한다.6) 암스덴(1994: 629)이 지적하듯이, “만일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성장전략을 결정해왔다면, 결과는 실제 일어난 것보다 나아지거나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거의 분명하다.” 예컨대, 자본통제가 없었다면 과도한 자본의 도피를 초래하였을 것이고, 수입통제가 없었다면 국내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 일거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한국과 대만은 아직도 일차상품에서 그들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현격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국가는 자본주의 발전에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도출될 수도 있을 시사점은, 그것이 합리적인 국가개입에 기초한 상이한 발전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자유주의의 그것과는 상이한) 올바른 관리의 모델이 존재하는가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나리오는 특정한 나라들에 대해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특수한 증거로서 독립적으로 적용된 ‘선험적인’ 모델로서 사용될 수는 없다. 이것은, 왜 몇몇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켜온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방해해왔는지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를 비교연구한 젠킨스(Jenkins 1991: 200~01)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적 차이를 얼마만큼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정책 효과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실패는, 잘못된 정책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자율성 부재가 어떤 정책을 배제한 결과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국가정책 ‘그 자체의’ 문제(비록 이것이 중요할지라도)가 아니라 특정한 국가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와 신케인즈주의 모두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오로지 경제 내에서의 개입의 정도와 관련해서만 평가하고 이런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본다. 대안적 접근은 국가와 경제는 양자 모두 사회적 생산관계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Brenner 1977; Kiely 1995).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핵심 요소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실시된 토지개혁이었다. 대만에서는 본토(중국)에서의 농민봉기가 재현될 것을 두려워한 민족주의 국민당이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수행했다. 그 결과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대만의 농촌은 소수의 대지주계급에 의한 억압이 종식되었고, 수많은 자영농의 탄생으로 특징지워졌다’(Amsden 1985: 85). 한국에서의 개혁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역시 강력한 지주계급의 패배로 이어졌다. 이 개혁은, 과거의 지주들을 농민 혹은 노동자로, 혹은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관리되는 신생 자본가계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종의 ‘산업에의 형벌적으로 강요된 투자’(Selden & Ka 1988: 115)가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독특한 관계의 발전은 한국에서 급속한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을 가져왔다(Seddon & Belton -
Jones 1995를 보라). 기타의 개도국에서는 특정한 계급의 지속된 권력이 이와 유사한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지연시켰다. (중략) 한국과 대만 정부는 라틴아메리카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자본을 훈육할 수 있었으며, 1960년대부터 훨씬 효과적으로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노동자의 조직적 취약성에 의해 강화되었다(Jenkins 1991: 208).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낙관이 잘못이라는 명백한 한가지 이유는, 역동적인 자본주의가 사회적 생산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신뢰, 바로 그것이다. 많은 주변부들에서는 역동적 자본주의의 출현이 여의치 않았거나 어렵게 시작되었고, 구조조정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더 이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7) (중략)
5. 결론 : 주변부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향후전망
시장친화적 개입과 올바른 관리에 관한 세계은행의 최근 문헌들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개입이 무의미하거나 혹은 무관하다고 간주하면서, 그리고 관리(governance)를 ‘기본원리의 건전한 유지’ 등과 같은 정책결정상의 순수한 기술적 문제로 한정지으면서, 자본주의적 발전에서의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기를 꺼려해 왔다. (중략)
대안적 평가는 자본축적에서의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승인하고, 특히 후발자본주의 개도국들은 시장의 작동방식 때문에 정확히 국가에 의존한다고 본다. (중략)
예를 들어 모슬리와 윅스(Mosley & Weeks 1994)는, 특정한 상황에 의존하지만, 환율의 평가절하가 수출증진을 위해 다소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함과 동시에 무역자유화와 국내생산자 보호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 세계은행의 무차별적인 요구를 비판하였다. (중략)
모든 정책들은 개도국에 존재하는 계급역량에 영향을 줄 것이며, 모든 정책은 부분적으로 이 같은 토대 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특수한 사회적․정치적 힘 관계의 결과이다. (중략)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발전은 특정한 ‘사회적 축적구조’의 발전에 달려 있다. (중략) 또한 종속이론이 …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발전의 성공은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조건에도 달려 있다. (후략)
번역 : 김두한, 최원탁 / 해외저널리뷰팀
< 참고문헌 >
African Development Bank(1994) African Development Report 1994. African Development Bank, Abidjan.
Amsden, A.(1985) The state and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In P. Evans, D. Rueschmeyer and T. Skocpol(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78-10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89) Asia's next gia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3) 'Trade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in South Korea' in M. Agosin and D. Tussie(eds.) Trade and growth. Macmillan, London: 187-2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4) 'Why ism't the whole world experimenting with the East Asian model to develop? Review of "The East Asian miracle"', World Development 22: 627-33.
Amsden, A. and Y-D. Euh(1990) 'Republic of Korea's financial reform: what are the lessons?' UNCTAD Discussion Paper No. 30. UNCTAD, Geneva.
Balassa, B.(1981)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the world economy. Pergamon, New York.
Balassa, B., G. Bueno, P. Kuczynski and M. Simonsen(1986) Adjusting to success: balance of payments policy in the East Asian NIC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Berger, F.(1979) 'Korea's experience with export-led development' in B. de Vries(ed.) Export promotion policies. World Bank, Washington: 60-82.
Berger, P. and H-H. Tsaio(1987) In search of an East Asian model of development. Transaction Books, New Brunswick.
Brenner, R.(1977)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104: 25-92.
Buchdanan, J.(1986) Liberty, market and the state. Wheatsheaf, Brighton.
Burawoy, M.(1992) 'The end of sovietology and the renaissance of modernisation theory' in Contemporary Sociology 21: 774-85.
Chang, H-J.(1995) 'Explaining "flexible rigidities" in East Asia' in T. Killick The flexible economy. Routledge, London: 197-221.
Cleaver, H.(1989) 'Close the IMF, abolish debt and end development: a class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debt crisis' in Capital & Class 39: 17-39.
CSE(1979) Struggles against the state. Pluto, London.
de Janvry, A.(1987) 'Peasants, capitalism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n culture' in T. Shanin(ed.) Peasants and peasant societies. Blackwell, Oxford: 390-8.
Engberg-Pedersen, P., P. Gibbon, P. Raikes and L. Udsholt(1996) Limits of adjustment in Africa. James Currey, London.
Evans, P.(1995)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Fukuyama, F.(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Penguin, London.
Gibbon, P.(1996) 'Structural adjustment and structural change in sub-Saharan Africa: some provisional conclusions' in Developmint and Change 27: 751-84.
Gowan, P.(1995) 'Neo-liberal theory and practice in Eastern Europe' in New Left Review 213: 32-65.
Hamilton, C.(1986)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in Korea. Westview, Lond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87) 'Can the rest of Asia emulate the NICs?' in Third World Quarterly 87: 1225-56.
Harrigan, J., P. Mosley and J. Toye(1991) Aid and power. Routledge, London.
Healey, J. and M. robinson(1992) Democracy, governance and economic policy.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Hilton, R. (ed.)(1976)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Verso, London.
Jenkins, R.(1991)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ization: a comparison of Latin American and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Development and Change 22: 197-23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2) '(Re-)interpreting Brazil and South Korea' in T. Hewitt, H. Johnson and D. Wield(eds.)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67-98.
Kiely, R.(1994) 'Development theory and industrialisation: beyond the impasse' i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4: 133-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5) Sociology and development: the impasse and beyond. UCL Press, Lond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7) Industrialisation and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UCL Press, London.
Kotz, D., T. McDonough and M. Reich(eds.)(1994)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Kwon, J.(1994) 'The East Asia challenge to neo-classical orthodoxy' in World Development 22: 635-44.
Lal, D.(1983) The poverty of development economics.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Lall, S.(1994) '"The East Asian miracle" study: does the bell toll for industrial strategy?' in World Development 22: 645-54.
ꠏꠏꠏꠏꠏꠏꠏꠏ(1995) 'Structural adjustment and African industry' in World Development 23: 2019-31.
Leftwich, A.(1993) 'Governance,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in Third World Quarterly 14: 605-24.
LEWRG(1980) In and against the state. Pluto, London.
Mosley, P. and J. Weeks(1994) 'Has recovery begun? Africa's adjustment in the 1980s revisited' in World Development 21(10): 1583-99.
Mosley, P., T. Subasat and J. Weeks(1995) 'Assessing Adjustment in Africa' in World Development 23(9): 1459-73.
Raikes, P.(1988) Modernizing hunger. James Currey, London.
Rodan, G.(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Singapore's industrialisation. Macmillan, London.
Schiff, M. and A. Valdes(1992) The plundering of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Washington.
Schiffer, J.(1991) 'Stat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note on the Hong Kong model.' i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5: 180-96.
Schmitz, G.(1995) 'Democratization and demystification: deconstructing "governance" as development paradigm' in D. Moore and G. Schmitz(eds.) Debating development discourse. Macmillan, London: 54-90.
Seddon, D. and T. Belton-Jones(1995)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economic flexibi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ast Asian NICs' in T. Killick(ed.) The flexible economy. Routledge, London: 325-64.
Selden, M. and C. Ka(1988) 'Original accumulation, equality, and late industrialization: the cases of socialist China and capitalist Taiwan' in M. Selden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socialism. M. E. Sharpe, New York: 101-28.
Sender, J. and S. Smith(1985) 'What's right with the Berg Report and what' left of its critics' in Capital & Class 24: 232-36.
Taylor, L.(1993) The rocky road to reform. WIDER, Helsinki.
Toye, J.(1987) Dilemmas of development. Blackwell, Oxford.
ꠏꠏꠏꠏꠏꠏꠏ(1991) 'Is there a new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C. Colclough and J. Manor(eds.) States or markets. Clarendon, Oxford: 321-38.
ꠏꠏꠏꠏꠏꠏꠏ(1994) 'Structural adjustment' in R. van der Hoeven and F. van der Kraaij(eds.) Structural adjustment and beyond in Africa. James Currey, London: 18-35.
Tsiang, S. and R. Wu(1985)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s boosters of take off: the experience of the four Asian NICs' in W. Galenson(ed.)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320-43.
Uvin, P.(1994)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hunger.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Watts, M.(1990) 'Peasants under contract: agro-food complexes in the third world' in H. Bernstein(ed.) The food question. Earthscan, London: 69-79.
Weeks, J.(1995) 'The manufacturing sector in Latin America and the new economic model' in V. Bulmer-Thomas(ed.) The new economic model in Latin America and its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Macmillan, London: 271-94.
White, G.(ed.)(1988) Developmintal states in East Asia. Macmillan, London.
White, H.(1996) 'Adjustment in Africa' in Development and Change 27: 785-815.
World Bank(1983) World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89) Sub-sahar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 World Bank, Washingt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1) World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2) Governance and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3)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994) Adjustment in Africa.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레이 키일리(Ray Kiely)는 East London University 강사로서, 최신 저작으로 Industrialisation and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UCL Press, London, 1997)가 있다.
1) 이 글에서 나는 세계은행을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완전히 제약받고 있는, 동질적인 기구로 간주한다.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경험적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견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Sender와 Smith가 지적하듯이(1985), 좌파, 특히 제3세계 민족주의자 진영은 종종 너무 성급하게 세계은행의 글들을 기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이다.
2) 구조조정이란 ‘경쟁적인 시장의 힘들’에 대하여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IMF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안정화 정책은, 통화의 평가절하와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단기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경감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3) 이 견해는 신자유주의의 기존 가정, 즉 전형적인 경우에 국가의 개입은 그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며 시장의 불완전성이 계획의 불완전성보다 낫다는 기존 가정으로부터 중대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Lal 1983:106~7). 그러나, 앞으로 더 명확해지겠지만, 가지각색의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한 도그마적이고 완고한 집착은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국가 개입이 그들의 효과면에서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배제하게 만들었다.
4) 한국(1988년 국민총생산의 1.9%)과 대만(1.2%)은 더 고도로 산업화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보다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1988년에 0.5%), 인도(1986년에 0.9%), 브라질(1985년에 0.4%). 이 수치는 일본(1987년에 2.8%)과 독일(1987년에 2.8%) 보다는 낮으나 벨기에(1987년에 1.7%)와 이탈리아(1987년에 1.2%)보다 높다(Sigh 1994:22).
5) 이 두 수치는, 가정된 경쟁적 자유시장 균형에 기초한 가격으로부터 괴리된 상대가격의 정도를 제시해준다. 이들 소위 가격왜곡은 그 책에서 논의된 국가 개입의 산물이다 - 그러나 그러한 가격왜곡은 신자유주의 이론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6) 이점은, 올바른 가격설정이 정태적인 배분적 효율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주요한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종종, 상관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런 효율성이 논쟁의 여지없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더 강하게 주장한다.
7) 이런식으로 세계은행은, 자본주의가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화로부터가 아니라 교역관계의 확장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네오 스미스주의적 맑스주의’(neo-Smithian Marxism)의 오류를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