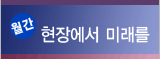ꡔ자본ꡕ 그 이후 …
이 주 유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정치경제학 비판” 8기 수요반
Q: “아니, 생산력이 발전하는 게 왜 안 좋다는 겁니까?”
A: “자본론 세미나를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학교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던 흑백 포스터 한 장을 흘깃
살펴보다가, 이 대화를 떠올리며 한노정연의 “정치경제학
비판”(『자본』) 세미나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벌써 1년
전이다. 그 후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에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적인 자극과 충격을
받았고, 더 공부해 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미나가 끝날 때마다 항상 다음 주에는
기필코 책을 열심히 읽어 오리라 다짐하면서 열의를
불태우다가도 바쁜 일상을 핑계삼아 공부를 소홀히 했던 점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끝까지 읽었다는 것(구경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임에 틀림없다.
이 짧은 글에서 맑스의 『자본』에 대해 논평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분명 나의 능력 밖의 일이다. 하지만 맑스의 분석을
19세기의 고루한 유산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한번이라도 『자본』을 ‘잘’ 또는 ‘열심히’ 읽어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의 자격은 갖추게 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맑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은 19세기 영국의 상황에만
설명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더 큰 적실성을
가진다. 만성적인 과잉공급, 금융위기의 모습을 띄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노골적인 착취 강화,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대로 나타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 등,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곳곳에서 맑스가 설명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신 정권
하에서 『자본』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체포대상 1순위였는데,
정작 그 책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 역설적이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맑스는 이 책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보다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다.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노동자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창조되는 ‘가치’가 노동을 하지 않는 자본가들의 어떠한
강압과 술수에 의해 착취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러한
원리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역사적인
고찰을 했다. 따라서 맑스의 『자본』은 자본주의에 대한 지극히
과학적인 연구임과 동시에 가장 실천적인 함의를 가진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는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남겼다. 학문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성이 무엇인지를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신 채만수
선생님,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강성윤 팀장님,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적으로
운동하시면서도 세미나 준비 또한 성실히 해 오셔서 늘 나를
부끄럽게 했던 선배님들과 동지들. 지금까지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만 집착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살아온 나에게, 세미나 팀원들 모두는 매주 따끔한 충고와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길은 더욱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되었을 것이다.
『자본』이라는 대항해의 끝은, 항해의 길에서 알게 된 지식들을
나의 신념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잘 운동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세미나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이 진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Karl
Marx,『자본』1권 프랑스어판 서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앞의 대화에 대해 사족 한 마디. 우리는 흔히
생산력의 발전을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의 과잉생산과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대, 이윤율의 저하를 낳게 되며 주기적인
경제위기, 즉 공황의 원인이 된다.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이렇다: “자본론 세미나를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