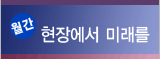국/제/노/동
경제위기 시대의 인도네시아식 ‘정의’
군중의 범죄자 즉결처형 확산
적도하의 범죄와 처벌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디안이라는 청년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곧 군중은 수백명으로 불어났고, 디안과 그 친구들은 용서를 빌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군중들은 그들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질러 버렸다. 그 때까지 2명은 아직 살아있었으며, 디안의 가족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Djalal 2000).
자카르타에서 새벽 4시경 먼 친척집에서 새의 알과 둥지를 훔친 아스따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와 농구공만한 돌을 들고 몰려들었고, 자비를 호소하는 그를 1시간 이상 때리고 돌로 쳤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휘발유를 끼얹었다. 그리고는 아내와 세 아이를 먹이고자 했던 서른 일곱살의 실업자를 불태워 죽였다(Washington Post, 2001.4.17).
이런 집단폭력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대체로 그냥 지켜본다고 한다. 경찰이 제지하면 성난 군중은 경찰을 공격한다. 군중심판을 제지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경찰차에 태우자 성난 군중은 경찰차를 포위하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경찰이 용의자를 도로 내주었던 적도 있으며,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간 데 분노하여, 경찰서가 습격당한 적도 있다고 한다. 거리처형의 주모자가 경찰에 잡혀 처벌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1999년 2월에 처음으로 성난 군중의 범죄자 화형이 보고된 이래 이러한 거리 군중재판은 일종의 모델이 되어 버렸다. ‘거리재판’은 전형적으로 범죄에 대항하는 아주 간단한 주민행동양식이다. 누군가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경우, 범죄용의자를 지목하면서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용의자를 잡아서 몰매를 주어 죽이거나 휘발유를 끼얹어 산 채로 불태워 죽인다. 이러한 행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자체심판수행’(main hakim sendiri), ‘거리처형’(hukum jalanan), 혹은 ‘대중의 무정부적 행동’(anarki massa)이라고 불리운다.
대항범죄의 전형이 된 군중재판
자카르타의 찝또망운꾸소모 종합병원은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명 이상이 군중재판의 피해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이틀에 한 명 꼴이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이를 처리하는 특별팀을 가동중이라고 한다(Djalal 2000). 2000년 한 해 동안 일간지에 보도된 “대중의 무정부적 행동”은 총 299건이었다. 이로 인해 124명이 살해되었다(YLBHI 2000a, 2000b). 물론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다.
불태워 죽이는 경우가 속출하는 이유는 가장 쉽고 싸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휘발유를 끼얹어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Robet 2001, 66). 웬만한 도시에는 거리마다 노점상과 상점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휘발유가 있어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명색이 산유국이요 유류에 대한 국가보조금도 있는 바 유류가격이 싸다. 그러니 불태워 죽이는 게 쉽고 싸게 범죄(용의)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성난 군중은 ‘범죄자’로 지목된 이가 진짜 범죄자인지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살해된 다음에 그가 진짜 절도범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훔친 물건이 크건 작건 상관없다. 살해당한 절도범 중에는 닭이나 담배를 훔친 경우도 있다. ‘저주를 거는 주술’(dukun santet) 행위를 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살해되기도 한다. 분쟁/시비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자들 중에는 차비를 안내거나 요금을 깎으려 했던 승객까지 포함되었다.
<표 1> 대중의 즉결처분에 따른 사망자 수, 원인과 처분방식, 2000년
처분방식
사망자 |
불태워 죽임 |
몰매로 죽임 |
그밖의 방식 |
계 |
절도(강도)범 |
23 |
35 |
3 |
61 |
절도혐의자 |
6 |
9 |
- |
15 |
주술사(dukun santet) |
2 |
6 |
3 |
11 |
주술혐의자 |
3 |
5 |
- |
8 |
분쟁/시비 유발자 |
4 |
10 |
3 |
17 |
강간범 |
1 |
3 |
- |
4 |
해결사(preman) |
2 |
2 |
- |
4 |
기타 |
- |
2 |
2 |
4 |
계 |
41 |
72 |
11 |
124 |
자료: YLBHI 2000a의 목록을 도식화.
물론 많은 경우에 살해된 이들은 범죄자이다.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는 마을 사람들의 도난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한 달치 봉급을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갖는 소매치기에 대한 증오를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좀도둑과 소매치기가 극성이다. 오토바이, 자전거, 소, 염소 따위는 사소한 물건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되는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난당한 가난한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Robet 2001, 64). 게다가 출구 없는 경제위기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참조로 하여, 현재 5명중에 1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The Jakarta Post, 2001.4.5).
경찰의 부패와 무능
가난한 이들의 경험 속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에 고발하면 그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비용을 신고자에게 부과한다. 범죄 용의자나 가족이나 그의 뒤를 봐주는 이가 경찰을 매수할 경우에 경찰은 그를 풀어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찰은 공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기업의 “앞잡이”(centeng)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 2>의 꼰뜨라스 기자회견 내용처럼, 경찰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뒷돈을 대준 사업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벌인 경우가 많다.
<표 2> 경찰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가 보호한 이익, 2000년 1월~6월
보호대상 |
계 |
정부기구 |
경찰(스스로) |
농장 |
제조업체 |
광산 |
양어업체 |
개인 |
기타 |
건수 |
176 |
37 |
23 |
15 |
11 |
1 |
2 |
7 |
76 |
출처: Munarman 2001, KontraS(실종자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위원회) 기자회견 내용.
경찰은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 인구가 2억 2천만인 나라에 경찰은 20만밖에 없다. 경찰이 인구 1,100명당 1명꼴로 경찰 수가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4분의 1 수준으로 적다고 한다. 경제위기라 예산도 딸리고 순찰차도 부족하다. 민주화 이후에 경찰이 군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치안문제에 대해 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자들은 동네입구마다 철창을 두르고 혹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민간경비(satpam)의 보호를 받는다.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처럼 안전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정글의 법칙’을 따라 스스로 ‘거리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본보기로 범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하르토 체제의 폭력성에 감염된 ‘병든 사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군중재판에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권과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살해되는 좀도둑 용의자들은 그 피해자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용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도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폭력적이었던 국가로부터 그 잔인성을 물려받은 것 같다. 수하르토 체제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였다. 수하르토 32년 독재 기간에 국가기구, 특히 군과 경찰은 제멋대로 임의적인 폭력을 구사하여 악명을 떨쳤다. 구타, 고문, 학살 같은 만행의 일상화는 법집행자의 도덕성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성 역시 타락시킨다. 수하르토 체제 등장의 계기였던 1965~66년 ‘공산주의자’ 학살과정에서 50만명 이상, 동티모르 점령과 식민통치과정에서 20만명, 범죄자소탕작전(petrus)에서 7천명, 아체에서 3천명, 파푸아(이리안 자야)에서 7천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이렇게 75만명 이상을 학살한 수하르토 체제는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요, 그 기둥이 “해골산”에 서 있다고 비유되기도 했다(Anderson 1999, 11~13).
수하르토 퇴진 이후에도 허다한 폭동과 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아체에서는 반군을 박멸하는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어 매일 사람이 죽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수천명이 죽어도 대수롭지 않은데 한 두명 더 죽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냐”고(Robet 2001, 68). 인도네시아의 일반인들에게 폭력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인명살상에 대한 도덕적 ‘문턱’은 아주 낮아진 것 같다.
어느 인도네시아 범죄학자는, 수하르토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임의적 야수성”(arbitrary brutality)이 이제 인도네시아인들의 혈관 속을 타고 돌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왜냐하면, 수하르토 체제는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jalal 2000).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이 겪는 특수한 고충도 바로 이것이다.
》참고문헌《
Anderson, Benedict, 1999, “Indonesian Nationalism Today and in the Future”, New Left Review, No.235(May/Jun).
Djalal, Dini, 2000, “The New Face of Indonesian Justic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3.
Munarman, 2001, “Peran Aparat Dalam Konflik Sosial”(사회갈등에서 경찰의 역할), 미간행원고.
Robet, Robertus, 2001, “Etalase Politik Kekerasan: Pembantaian ‘Penjahat’ di Jabotabek”(폭력정치의 쇼윈도우: 자보따벡 지역의 ‘범죄자’ 대중처형), YLBHI(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 편), Diponegoro 74: Jurnal HAM dan Demokrasi(디뽀네고로가 74번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저널), 9.
The Jakarta Post, 2001.4.5, “1 in 5 Indonesians ‘mentally disturbed’”.
Washington Post, 2001.4.17, “Indonesia’s Brutal Vigilante Justice”.
YLBHI, 2000a, “Korban Tewas Anarki Massa Tahun 2000”(2000년 대중의 무정부적 행동에 따른 피해자), Divisi Informasi dan Dokumentasi(문서정보실), YLBHI.
YLBHI, 2000b, “Peristiwa Anarki/Perusakan oleh Massa Januari-Desember 2000”(2000년 1월~12월에 발생한 대중에 의한 무정부적 사태와 파괴), Divisi Informasi dan Dokumentasi, YLB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