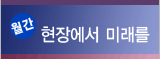제노바 정상회담에서의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입장**
보도 초이너(Bodo Zeuner)***
** 이 글은 2001년 7월 22일 아침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이탈리아 경찰의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의 한 희생자인
카타리나 초이너(Katharina Zeuner)의 아버지이자 베를린
자유대학의 진보적 정치학자인 보도 초이너(Bodo Zeuner) 교수가
밝힌 국가테러리즘에 관한 입장이다. 글의 출처는 http://www.labournet.de/diskussion/wipo/seat
tle/genua-p2.html.
***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나는 요즈음 우연히도 세바스티안 하프너(Sebastian Haffner)의
초기작품인 “한 독일인의 이야기(Geschichte eines
Deutschen)”를 읽고 있다. 이 글은 1933년 3월의 변화 없는
일상에서 사적 생활이 프로이센-독일 국가의 변동과정에서
비인간적인 테러조직에 의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매우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독일
국민의 대다수와 그들의 지도조직인 정당과 노동조합들의 저항이
부족했음을 밝히고 있다.
1933년과 오늘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비역사적
횡포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통점을 갖는다. 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진 국가기구가 지배자들의 테러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제노바에서 발생했던 바와 같이 경찰 특수대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야밤에 진압을 감행하면서 폭력적이고 살인적으로
구타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혐오스럽게 행동한다면, 1933년
나치들의 지하고문실의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제노바
디아츠 학교의 경찰투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은
사회의 교활한 파시즘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내무장관
스카졸라(Scajola)는 “보안요원들은 정당하게 행동했으며,
따라서 조롱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1933년
히틀러와 괴링(Göring)이 표현한 바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이다. 스카졸라 씨가 그것을 베껴서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철된다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유럽은 이미 다른 한 공화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33년으로 가는 수평선 옆에서 나는 결과적으로 1967년 여름의
독일, 특히 서베를린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본다.
쿠라스(Kurras)라는 폭력적인 경찰관이 1967년 7월 2일 이란
왕의 독일 방문시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한 베노
오네조르크(Benno Ohnesorg)를 사살하였다. 하인리히
알버츠(Heinrich Albertz)를 시장으로 하는 서베를린 국가기구는
당시 살인적인 경찰관 쿠라스를 포함해 경찰의 배후에서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했는데, 알버츠 시장은 시위하는
학생들의 ‘테러’에 대항할 것을 베를린 시민들에게 호소한
것이었다. 경찰청장인 뒨싱(Dünsing)도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 앞의 시위대에 대한 유혈폭력적인 곤봉투입, 즉
‘중앙으로 파고들어 마지막까지 뚫고 나오는’ 이른바 ‘쏘세지
전법’을 사용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던 당시의 경찰투입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 뒨싱과 알버츠는
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 후 알버츠는 폭력경찰을 투입하던
날처럼 그렇게 무력했던 적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도래하였는가? 국가테러에 대한 강고한
저항이 있었고,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비판언론과 거리시위에 용기있게
참여했으며, 당시의 언론폭력에 대항해 다발적 성명들을
발표했던 굴할 줄 모르는 조사활동이 있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동일하게 남은 것이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
절대적 지배자와 무제약적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러한 비인간성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저항역량도 변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국가폭력은 더 이상 독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도 새로운 사실이다.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저항도 국제화하였다는 것은 새롭고도 용기를
주는 일이다.
1967/68년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하인리히 알버츠의
경우처럼(비록 우리들을 매우 힘들게 했었지만)
베를루스코니(쉬뢰더, 쉴리, 부쉬, 블레어 등과 같은 그의
정신적 형제들)의 반민주적이고 국민 적대적인 국가기구를
억제하고 비정당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해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기회가 없지도 않다.
이탈리아는 다시 입헌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건 다른 어떤 국가에서건 국가기구는 현 지배층들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계적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이고 입헌국가적인 통제가 없이 인간성은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정치인들간의 접촉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폭력적이 되어 가는 자본에 대항해
민주적 공화국의 건설을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