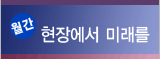철도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2)*
1)
4. 철도노동자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위에서는 철도의 인력변화와 업무량 증가현황, 산재사고 증가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철도노동자의 인력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철도청의 인력산정기준과 그것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근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철도노동자의 총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그에 필요한 인력충원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철도청의 인력산정 기준
철도청이 매년 정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철도청은 정원산정을 위한 표준 인공 산정기준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검수분야는 아래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87년도 인공산정 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93년 철도공사화를 앞두고 실시한 「철도 차량 검수 공정개선 합리화방안 연구」(한국산업경제연구원) 자료에서 이미 ‘철도청의 철도 차량 검수 공정에 대한 정원산정 판단은 전년도의 실적인공에 의해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13>의 디젤기관차는 서기소와 량기소의 실사자료이고 디젤동차는 서동소의 실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서지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인공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나 현황을 살펴볼 때, 검수 분야의 경우 전년도의 실적 인공에 의해 계속 감원해 나가거나 인력감축 계획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리한 인력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철도청의 표준 인공산정 기준은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검수원 인공산정 기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철도청의 철도 차량검수공정에 대한 정원산정 판단은 전년도의 실적 인공에 의해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을 뿐 공식적인 인공산정 기준은 없는 듯하다. 검수원 작업의 특성상 표준인공을 산정하기 어려운 요소1)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검수원에 대한 정원산정기준은 전년도 실적인공을 기준으로 한 인력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철도청은 인공산정기준 없이 그동안 인력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수주기를 늘이거나 검수항목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연간 인공실적을 계속 단축해왔고, 단축된 인공실적을 근거로 인력을 감축해 왔다. 하지만 철도청이 검수주기를 증가시키거나 검수항목을 단축한다 할지라도 검수과정에서의 작은 오류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검수원들의 검수항목을 줄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검수주기 증가나 항목 단축과 이에 따른 인원축소는 검수원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어 왔을 뿐이다. 설혹 검수원들이 시간에 쫓겨 규정에 의거한 검수를 함으로써 간단히 수리될 수 있는 고장이 대규모 고장으로 전화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암묵적 사실이다. 더욱이 철도청은 검수주기 증가나 검수항목 단축이라는 기준조차 마련할 수 없어서였는지 99년, 2000년에는 그러한 형식상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인원을 감축하였다.
<표 12> 동력차 검종별 단인공
차종 |
일상 검수 |
2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검수 |
디젤 기관차 |
1.13 |
1.67 |
8.8 |
11.74 |
14.98 |
35.28 |
새마을
동차 |
PMC |
2.28 |
5.25 |
7.07 |
11.43 |
- |
- |
부수객차 |
0.48 |
- |
3.78 |
- |
10.68 |
|
* 참조: 디젤기관차는 서기소와 량기소의 실사자료, 디젤동차는 서동소의 실사자료를 근거로 서지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인공기준이다.
* 출처: 1994.1.7. 철도청 차량국장 보고자료
<표 13> 객화차 사업별 단인공(1인공: 8시간)
검종 |
차종별 |
발전차 |
냉방객차 |
일반객차 |
화 차 |
비 고 |
정
기
검
수 |
1년 |
|
16.660 |
11.662 |
4.988 |
량 당 |
6개월 |
38.193 |
10.413 |
5.704 |
3.200 |
량 당 |
3개월 |
13.028 |
|
|
1.075 |
량 당 |
1개월 |
6.411 |
3.749 |
2.646 |
0.287 |
량 당 |
사업검수 |
1.195 |
0.261 |
0.157 |
0.065 |
발전차 = 일상 |
수선 |
0.926 |
0.926 |
0.926 |
0.287 |
량 당 |
열차
검수 |
시발 |
0.057 |
0.057 |
0.057 |
0.016 |
량 당 |
통과 |
0.024 |
0.024 |
0.024 |
0.011 |
량 당 |
|
승무 |
1.250 |
|
|
|
1일=8시간 |
기중기 |
|
|
4.00 |
|
기당 |
입출창 |
객차 |
|
|
0.417 |
|
량 당 |
화차 |
|
|
|
0.208 |
량 당 |
공작기계 |
|
|
0.110 |
|
공작기계 한, 기당 |
급수 |
|
|
0.025 |
|
량 당 |
청소검사 |
|
|
0.008 |
|
량 당 |
측등 |
|
|
0.020 |
|
게 출 |
발전차 급유 |
0.027 |
|
|
|
량 당 |
* 참고: 과거근거-객화차 관계관 회의시(87.6.4) 차량국회의자료에서 발췌, 회의 장소-영주 객화차사무소
위는 검수원에 대한 인공산정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는 이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래 <표 14>는 일 평균 작업자별 작업시간(분단위)을 인공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무궁화호 일반객차를 중심으로 작업량을 추적한 것으로써 1편성 당 전체 투입인공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조사결과가 편성 당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일상검수의 경우 작업자당 1편성을 1회 검수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작업시간을 의미하며, 경수선의 경우 작업자의 1일간 작업시간분포 및 형태가 어떠한가를 추적하는 기초자료가 된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철도차량검수공정개선합리화 방안 연구(Ⅰ)」, 1993).
<표 14> 무궁화호 검수인공
|
무궁화 일상검수 |
무궁화 6M |
무궁화 1Y |
작업자별?편성당 검수인공 |
0.1440인공 |
1.040인공 |
1.20447인공 |
작업대기
자재대기 |
0.002인공
0.048인공 |
-
0.0538인공 |
-
0.0390인공 |
* 자료: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철도차량검수공정개선합리화방안연구(Ⅰ)」, 1993.7.
<표 15> 디젤동차-경수선(일상검수)
|
인 공 |
비 고 |
작업자별?편성당검수인공 |
0.3535인공 |
1편성은 16량 작업기준임 |
기관조 작업/자재대기
전기조 작업/자재대기
대차조 작업/자재대기 |
0.0439인공
0.026인공
0.026인공 |
|
* 자료: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철도차량검수공정개선합리화방안연구(Ⅰ)」, 1993.7.
<표 16> 전동차(수도권)-일상검수
|
인공 |
비고 |
작업자별 편성당 기여인공 |
0.36179 |
1편성은 10량 기준임 |
작업대기
자재대기 |
0.02477
0.02083 |
|
*자료: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철도차량검수공정개선합리화방안연구(Ⅰ)」, 1993.7.
<표 17> 객화차 검수표준인공 및 상대비율
차 종 |
검 종 |
1량당 표준인공 |
1년검수 표준인공 대비율 |
객 차 |
1년 검수 |
11.7인/1량 |
100 |
6개월 검수 |
5.7인/1량 |
49 |
1개월 검수 |
냉방차 |
3.7인/1량 |
32 |
비냉방차 |
2.6인/1량 |
33 |
발전차 |
6.4인/1량 |
55 |
수 선 |
0.9인/1량 |
8 |
화 차 |
임 시 |
6인/1량 |
51 |
1년 검수 |
5인/1량 |
43 |
6개월 검수 |
3.2인/1량 |
27 |
3개월 검수 |
1인/1량 |
9 |
1개월 검수 |
0.3인/1량 |
3 |
수 선 |
0.3인/1량 |
3 |
* 자료: 철도청 표준인공. 한국경영개발컨설턴트부설 한국경영개발연구원, 철도청 「조직인사관리개선방안연구」 최종보고서Ⅱ, 1991.11. 재인용.
정비창은 정기적인 중수선 및 차량용품의 제작, 수리를 담당하며 해체→보수, 시험→조립이라는 내용 때문에 90% 정도가 인력작업으로 시행되는 인력의존도가 높은 직종이다. 인력의존도가 높은 정비창에서도 표준인공은 사라진 듯하며 다음 표는 95년 당시 검수일수 및 공정현황을 정리한 자료로써 당시의 현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철도청, 정비창 「공정분석자료집」 1995.11. p.10)
<표 18> 중수선 인공
차종 |
기준검종 |
검수소요일수 |
공정수 |
검수
항목수 |
소요인공 |
기타 |
디젤기관차 |
2년검수 |
15일 |
83개 |
247개 |
180인/량 |
|
디젤 동차 |
2년검수 |
18일 |
69개 |
581개 |
281인/량 |
새마을동차 |
전기기관차 |
2년검수 |
22일 |
40개 |
180개 |
383인/량 |
|
전기 동차 |
3년검수 |
20.4일 |
45개 |
329개 |
1,370인/편성 |
10량 |
객 차 |
2년검수 |
15일 |
110개 |
88개 |
165인/량 |
무궁화 |
화 차 |
2년검수 |
7일 |
60개 |
45개 |
18인/량 |
무개차 |
* 자료 : 철도청, 정비창 「공정분석자료집」 1995.11. p.10.
이처럼 검수원의 경우 인공산정 기준은 상실되어 있고, 단지 전년도 실적에 의해 계속해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승무원의 인공산정 기준
① 동력차 승무원
89년 제27차 노사협정에서 결정에 의해 기준근무시간이 결정되었으며 기본근무시간은 ‘철도청공무원 수당지급요령’ 제2조에 의하여 19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력차 운행에 필요한 총 사업시간 ÷ 1승무원당 기준근무시간
= 동력차승무원의 정원 |
* 기준근무시간(동력차승무원 인원산정을 위한 승무원 1인당 적정근무시간) - 월217시간
* 기본근무시간(시간외 근무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시간) - 192시간
② 열차승무원
열차승무원은 동력차승무원과 같이 교번에 의한 근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근무시간은 월22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미달됨은 물론, 철도 내에서도 동력차승무원과도 차별이 심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승무원의 경우 월 총근무시간이 300시간을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열차승무원 직명별 정원
= 직명별 일평균총사업시간(실적) ÷ 1일 기준사업시간(7.36시간) |
* 기준근무시간(열차승무원 인원산정을 위한 승무원 1인당 적정근무시간) - 월224시간, 월224시간을 일기준으로 환산하면 7.36시간(224시간×12월) 365일
* 기본근무시간(시간외 근무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시간) - 192시간
또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동하는 공간 속의 업무’라는 점에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동력차와 열차승무원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인원산정에서도 동력차승무원은 기준시간이 217시간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열차승무원은 224시간이다. 그리고 특별인정시간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하철 등 타 궤도산업 노동자들은 동력차와 열차승무원간의 차별은 찾아볼 수 없다.
2)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 철도청 표준인공산정 기준은 상실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을 기준 잡아 철도청의 인공산정을 인정하고2), 노동시간단축과 그에 따른 인원충원을 통하여 노동강도를 유지,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철도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고 있고 그 상황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산재사고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시간 단축과 인원충원은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그 근거, 그에 따른 인원충원 규모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철도노동자 근무형태 개선방향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제를 적용하되 월평균 176시간 이하로 단축한다.
② 휴일은 월 6개 이상 확보하되 휴일개념은 역일(曆日)로 한다.(00:00~24:00)
③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방지를 위해 인원을 충원한다.
④ 인원충원에서 예비율은 10% 확보한다.
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증감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1주야맞교대의 경우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로 개편하고, 승무는 다이아 작성기준을 새로이 만든다. |
(2) 개선방향 해설
① 노동시간을 월 평균 176시간 이하로 단축한다
현재 철도노동자들은 월 기본노동시간 192시간이 적용된 변형근로 체제 하에서 노동하고 있다. 철도가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이 변형근로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임금과 노동시간에서 월 192시간 변형근로제를 적용 받는 것은 부당하다. 1994년 파업투쟁 당시 그 해 10월 철도청과 노동조합은 1일 8시간 노동제 실시를 협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단지 협약을 구체화할 부대조항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1일 8시간 노동제 실시를 구체화할 세부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철도노동자 기본노동시간은 192시간이고 기본노동시간이란 시간외근무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인원산정을 할 때는 기준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준노동시간은 기관차승무원은 217시간, 열차승무원은 224시간이 적용되고 있고, 1주야맞교대의 경우 기준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270시간이 적용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인력감축으로 인해 예비율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기준노동시간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철도청 일근노동자의 경우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월 평균 근무시간은 175.2시간이었다. 이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이고, 철도청 전체 노동자들도 일반공무원이나 철도청 일근노동자와 같이 평등한 노동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원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노동시간을 176시간으로 하되, 당연히 총노동시간도 176시간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만일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가 확정된다면 총근무는 월간 176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인원충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야간근로시간은 현행대로 22:00시에서 06:00시까지로 한다.
다음은 노동시간과 여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응답결과인데, 시간에 대해서는 약 68%, 여가에 대해서는 약 67%의 노동자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19> 노동시간 만족도
|
노동시간 |
여가시간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매우만족 |
47 |
1.3 |
45 |
1.2 |
약간만족 |
166 |
4.5 |
207 |
4.5 |
보통 |
1008 |
27.0 |
938 |
27.0 |
약간불만족 |
1107 |
29.7 |
1053 |
29.7 |
매우불만족 |
1402 |
37.6 |
1499 |
37.6 |
전체 |
3730 |
100.0 |
3742 |
100.0 |
* 자료: 「철도민영화반대 연구팀 설문조사 중간보고」(미발표), 2001.
② 휴일은 월 6개 이상 확보하되 휴일개념은 역일(曆日)로 한다(00:00~24:00)
<표 20> 기관사 근무 현황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자 |
|
|
1 |
2 |
3 |
4 |
5 |
승무
현황 |
|
|
10시 출근
|
17시 퇴근 |
06시 출근
20:30 퇴근 |
21시 출근
|
14시 퇴근 |
일자 |
6 |
7 |
8 |
9 |
10 |
11 |
12 |
승무
현황 |
03:30출근
19:30퇴근 |
15:30출근
|
10:00퇴근 |
04:50출근
09:30퇴근 |
08:00출근
21:40퇴근 |
19:30출근
|
17시퇴근 |
일자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승무
현황 |
22:00출근
|
14시퇴근 |
03:30출근
17:30퇴근 |
17:00출근
|
09:30퇴근 |
16:20출근
|
05:00퇴근 |
일자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승무
현황 |
07:00출근
19:00퇴근 |
18:30출근
|
17:00퇴근 |
13:00출근
|
01:00퇴근 |
16:30출근
|
08:00퇴근 |
일자 |
27 |
28 |
29 |
30 |
비고 : 근무일수 - 30일
밖에서 자는 일수 - 17일 |
승무
현황 |
15:30출근
|
07:00퇴근 |
06:00출근
20:00퇴근 |
19:00출근
|
* 자료: **기관사승무사무소 승무원 99년 6월 다이아
그리고 휴일은 역일(曆日), 즉 00:00~24:00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철도청은 월기본노동시간을 192시간으로 정해 놓고 휴일이 4개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역일 개념이 적용되어야만 휴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는 동력차승무원의 한달 다이아이다. 월 30일을 근무하면서 그 중 17일을 밖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단 하루도 공식적인 휴일이 확보되지 못하는 철도노동자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달력상 주휴일은 년 52개로 월 평균 4.33개이고 법정공휴일 17개와 철도청 창립일(혹은 철도의 날)과 노동조합 창립일 2개를 합치면 19일, 따라서 년간 총 71일 이상의 휴일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노동강도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만큼 반드시 인원을 충원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반드시 단축된 시간만큼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어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무리한 인력감축 때문에 현재의 노동강도 또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때문에 인원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24시간 맞교대자와 승무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철도노동자의 약66% 수준이다.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노동강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충원한다. 단 일근을 하는 현업노동자들 중 그동안 가장 많은 감원이 이루어진 보선 등의 분야는 별도로 인원을 충원한다.
④ 인원충원에서 예비율은 10% 확보한다
현재 철도노동자들은 인원 부족으로 연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원충원을 하는데 교육, 파견, 휴직, 연가, 병가, 공가를 감안한 예비율 반영은 필수적이다.
다음은 서울기관차승무와 서울차량의 비실동 현황이다.
<표 21>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 인원설정 및 사업시간(연보-2000년)
사업시간 |
인원현황 1인당시간 |
비실동 |
설정
실적 |
정기
임시 |
정원 |
현원 |
실동 |
|
2,433:14
2,664:55 |
2,300:14
364:41 |
393
06:47 |
392
06:48 |
358
07:27 |
34
8.7% |
* 참조: 2000년 총 평균임. 실동률 : 91.3%, 이 표에서의 비실동이란 교육, 파견, 휴직, 연병가, 공가 등을 합한 비율임.
<표 22> 서울차량사무소 월인원 현황(2001년)
월 |
총원 |
사 고 자 |
실근무자 |
계 |
년가 |
병가 |
특휴 |
공가 |
교육 |
결근 |
파견 |
3월 |
16360 |
475 |
226 |
73 |
69 |
6 |
101 |
0 |
0 |
15885 |
4월 |
15062 |
558 |
242 |
114 |
68 |
1 |
126 |
7 |
0 |
14504 |
5월 |
15469 |
589 |
261 |
160 |
34 |
1 |
131 |
0 |
2 |
14880 |
6월 |
14958 |
624 |
260 |
63 |
136 |
0 |
117 |
0 |
48 |
14334 |
7월 |
15319 |
674 |
350 |
115 |
39 |
2 |
120 |
0 |
48 |
14645 |
8월 |
15234 |
976 |
674 |
59 |
52 |
30 |
109 |
0 |
52 |
14258 |
합계 |
92,402 |
3,896 |
2,013 |
584 |
398 |
40 |
704 |
7 |
150 |
88,506 |
* 참조: 총원 - 1일 근무자 × 1개월의 날수. 평균 실 근무율: 95.78%
현재 예비율 부족으로 각사무소 노동자들은 연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예비율은 1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증감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임금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임금은 생계비 개념이고 생계비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비용이므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표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정에서 임금 증가가 크게 발생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제도개편이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제도개편 본래의 목적에 어긋날 뿐더러 임금증감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직종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인원충원이라는 대명제를 앞두고 직종간 전선을 교란시키는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것이고 노동조합에는 임금인상투쟁이라는 다른 차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단 정비창 등 일근을 하는 현업노동자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는 임금인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⑥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1주야맞교대의 경우는 3조2교대로 근무체제를 개편하고, 승무는 다아아 작성기준을 새로이 만든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근무체제도 개편되어야 한다. 1주야 맞교대의 경우 3조 2교대로 개편하되,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4조 3교대 도입 등 보완책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동력차승무원과 열차승무원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두 직종 모두 ‘이동하는 공간 속에서의 업무’라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두 직종간의 차별은 없애도록 한다. 또한 승무원은 노동시간단축․인원충원과 병행하여 다이아 작성기준은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근무형태 변경과 교대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약 67%의 노동자가 근무형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약 68%의 노동자가 3조 2교대나 4조 3교대로의 교대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무형태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23> 근무형태만족도 및 희망교대변화
근무형태 |
교대변화 |
|
인원(명) |
비율(%) |
변수 |
|
인원(명) |
비율(%) |
변수 |
매우불만족 |
1,164 |
30.5 |
3조2교대 |
1,030 |
27.5 |
약간불만족 |
1,404 |
36.8 |
4조3교대 |
1,501 |
40.0 |
보통 |
1,018 |
26.7 |
현행유지 |
1,127 |
30.0 |
약간만족 |
179 |
4.7 |
기타 |
94 |
2.5 |
매우만족 |
50 |
1.3 |
전체 |
3,752 |
100.0 |
전체 |
3,815 |
100.0 |
* 자료: 「철도민영화반대 연구팀 설문조사 중간보고」, 2001.
(3) 인력충원규모 산정
2000년 기준 일근자는 전체인원의 약 34%, 1주야맞교대는 약 45%, 운전 약16%, 운수 약5%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철도노동자 근무형태별 인원현황(2000.4.1. 현재)
|
일근자 |
1주야맞교대 |
교번제 |
현원 31778명 |
10,592명 |
14,273명 |
*승무전체 6,913명
-운전4,989명(약16%)
-운수 1,603명(약5%)
-기타 321명(약1%) - 일근자로 처리 |
|
약 33% |
약 45% |
약 22% |
* 자료: 철도청 내부자료
① 시간단축에 따른 인원충원 규모 - 보선원 일근자는 별도 계산
<표 25> 근무형태별 인원충원 규모3)
|
2000년 현원 |
단축된 노동시간과 충원인원 |
일근자 |
10,592명(전체의 약33%) |
|
1주야
맞교대 |
14,273명(약45%) |
*7,623명 증원 +예비율 2,189명
→ 14,273 + 7,623 + 2,189 = 24,085명 |
승무 |
6,913명(약22%)
-동력차승무원 4,989명(약16%)
-열차승무원 1,603명(약5%)
-기타 321(약1%):일근자로 취급 |
*동력차승무원 1,162명증원 +예비율615명→4,989 +1,162 + 615 =6,766명
*열차승무원 437명증원+예비율204명
→ 1,603 + 437 + 204 = 2,244명
* 기타 321명 |
총원 |
31,778(100%) |
44,008명(12,230명증원) |
* 참조: 1주야맞교대 현재 270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단축. 단 ‘철을’의 경우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270시간을 적용하였음. 운전 217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단축. 운수 224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단축. 일근은 변화없음. 예비율 10% 반영.
2000년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동안의 감원과 강화된 노동강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임의적으로 2000년 4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는 그 당시의 노동강도를 인정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② 보선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과 인원충원
2001년 현재 보선원 현원은 3,973명이다. 보선원은 94년에 비해 거의 40%의 노동자가 감축되어 작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로반원들은 열차감시자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연장근로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보선원 일근자들의 2001년 월 평균 근무시간은 52,717시간으로써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인원을 충원한다면 300명이 인원이 필요하다.
<표 26> 보선원인원충원 규모
|
2001현원 |
연장근로 시간 |
인원충원 |
1주야
맞교대 |
751명 |
270시간×751명=176시간×인원
∴총원1152.1명(충원 402명) |
402명(시간단축)
∴402명+156명(예비율)
= 558명 충원 |
일근 |
3,222명 |
2001년 월평균
52,717시간 |
52,717시간÷176=300명(연장근로제한)
∴300+353(예비율)=653명 충원 |
총원 |
3,973명 |
|
|
* 참조: 예비율 10% 적용. 연장근로시간 계산 - 철도청 ‘시간외근무현황’(2001.1~7.)은 5시간 단위로 인원을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중간시간에 인원을 곱하여 보선원 일근자 전체에 대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출한 것으로 총시간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위의 계산방식은 보선원에 대한 현재의 노동강도를 인정하한 상태에서 연장근로만 제한하여 충원해야 할 인원을 산출한 것으로써 열차감시자 배정과 순회자에 대한 충원 요구를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열차감시자와 순회자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7>은 2001년 1월~7월 보선사무소별 시간외노동 현황이다. 월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근로를 해야 하는 보선원들의 고통을 살펴볼 수 있다.
③ 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제한에 따른 충원인원 규모
철도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176시간으로 단축하고 예비율을 10% 확보했을 경우 인원충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주야 맞교대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7,623명을 충원하고 예비율 2,189명을 포함하면 충원인원은 9,812명이다. 승무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1,599명을 충원하고, 예비율 10% 확보를 위해 819명을 충원하면 충원규모는 2,418명이다. 또한 보선원 일근노동자 경우 연장근로제한에 따라 300명을 충원하고 예비율 353명을 포함하면 653명 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도노동자의 장시간노동 억제에 따른 충원규모는 12,883명이다.
<표 27> 보선사무소별 최대 시간외노동(2001.1-7.)
사무소 |
최대 시간외노동 |
서울보선사무소 |
136시간(7월) |
수원보선사무소 |
114시간(7월) |
청량리보선사무소 |
144시간(7월) |
원주보선사무소 |
123시간(7월) |
천안보선사무소 |
179시간(6월) |
대전보선사무소 |
179시간(6월) |
김천보선사무소 |
201시간(3월) |
대구보선사무소 |
152시간(3월) |
부산보선사무소 |
146시간(3월) |
마산보선사무소 |
114시간(6월) |
순천보선사무소 |
120시간(6월) |
광주보선사무소 |
137시간(3월) |
익산보선사무소 |
114시간(7월) |
제천보선사무소 |
147시간(7월) |
영주보선사무소 |
94시간(6월) |
동해보선사무소 |
167시간(6월) |
* 자료: 철도청 내부자료
5. 결론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도 창립부터 89년까지는 철도청 근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서울지하철노동자들은 87년 노조를 설립과 단협체결,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89년 단행된 직제투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결과 철도청 근무체제를 극복하고, 8시간 노동제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서울지하철의 노동조건은 그후 설립된 다른 지하철에도 그 골격이 그대로 적용되어 서울지하철노조 투쟁은 지하철 노동조합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철도청은 오랜 어용노조 지도체제 하에서 이를 바꾸어 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철도청 노동자들의 45% 이상은 1년 내내 휴일 없이 1주야 맞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월간 평균 2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계속된 감원으로 인해 모든 직종에 예비율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역무의 경우 교대자가 연병가를 내면 48시간, 나아가 72시간 계속 근무를 하면서 월 3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전기, 보선의 경우 열차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 28> 철도노동자 인원충원 규모
1주야
맞교대 |
14,273명(약45%) |
14,273명×270시간 = 176시간× 인원
∴ 7,623명 증원 +2,189명(예비율)
→ 14,273 + 7,623 + 2,189 = 24,085명 |
승무 |
6,913명(약22%)=
동력차승무원4,989명(약16%)+열차승무원 1,603명(약5%)+기타 321(약1%-일근자로 취급) |
* 4,913명×217=176×인원
동력차승무원 1162명증원 +예비율615명
→ 4,989 + 1162 + 615 = 6,766명
* 1,603명×224=176×인원
열차승무원 437명증원+예비율204명
→ 1,603 + 437 + 204 = 2,244명
* 기타 321명 |
보선원
일근 |
3,222명(2001년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52,717시간) |
52,717시간÷176=300명(연장근로제한)
∴300+353(예비율)=653명 |
노동시간단축과 연장근로제한에 따른 인원충원 규모 |
*1주야맞교대 증원규모 9,812명
* 승무2418명
* 보선(일근+예비율) 653명
총 12,883명 이상 증원 필요. |
철도노동자들은 이러한 근무체제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부노동자들은 공무원체제를 벗어나면, 즉 민영화가 된다면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근무체제를 규정짓고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철도공무원 관련 제 규정임은 분명하지만 결국 이를 바꾸어 내는 것은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즉 이를 어떻게 사회문제로 만들어 내고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지하철투쟁에서 그 실례를 알 수 있다.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철도노동자들에게 주 40시간 노동제는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때도 철도노동자들에게 기본근로 192시간은 변함이 없었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가시적 조치도 없었다. ‘공무원 복무규정’과 ‘철도공무원 관련제규정’에 근거한 192시간 변형근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철도노동자들은 제 규정에 얽매여, 공무원체제 운운하면서 손놓고 있을 것인가?
철도노조 집행부가 민주파로 구성되면서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가 은폐되어 있던 산재사고의 사회적 이슈화일 것이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민영화저지투쟁과 함께 수 십년 동안 변치 않고 규정짓는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문제제기를 던지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이 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1년 7월~2002년 1월까지 진행한 ꡔ한국철도 민영화(사유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보고서ꡕ 중 2장 「궤도노동자 근무시간과 근무체제」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철도노동조합의 양해 하에 전제하는 것이다. 지난 4․5월호(76호)에는 전반부 1-3절이 실렸으며 이번 6월호(77호)에 나머지 부분을 싣는다.
1)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철도차량검수공정개선합리화방안연구(Ⅰ)」, 1993.7, p.Ⅴ-11. 검수원의 업무는 차량을 검수하고 수리 수선하는 것이다. 검수원의 업무는 제품의 생산이 아니라 정비업무에 해당하므로 생산직과 다른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즉 차량의 노후도, 고장개소 등에 따라 작업이 매번 다르고 일정하지 않다. 차량의 운용 다이아에 의해 작업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무소의 검수원들은 일상검수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동하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의 밑에서 작업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전반적으로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작업자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라인작업이 아니라 배치(batch)작업이므로 작업의 표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2) 이는 그 시점의 노동강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3) 1주야맞교대의 경우 취침시간을 형식상 ‘철갑’보다 1시간 많은 5시간을 배정하여 임금인하를 유발하고 있는 ‘철을’의 경우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월평균노동시간을 270시간으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