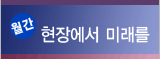검은 용암에 젖다
조 항 현/청년환경센터 회원
8월 11일 일요일 밤 11시. 나는 지난 10달 동안의 ‘전업’
환경운동을 정리하고 복학신청과 비 때문에 취소되었던
변산공동체 방문계획과 청년환경센터 대학생캠프 등을 생각하며
여유롭게 티비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늦은 듯한 밤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일정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Rio+10, 앞으로 리우+10)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지난 3월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앞으로 민간위)
발대식이 열렸을 때 1인당 참가비용이 수백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좌절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고 리우+10이 중요한 국제회의임에도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핑계로 강 건너 불 보듯 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거나 나는 민간위 문화팀의 환경설치미술가
최병수씨를 보조하고 간단한 통역을 맡는 역할로 회의에
참가하기로 했고, 말이 잘 통하는 장숙희씨도 만났다. 우리는 한
팀이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출국을 하는 20일까지 최작가님과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작업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처리했다. 그리고 틈틈이
리우+10 관련 홈페이지 등을 돌아다니며 공부도 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민간위의 교통, 숙박 등을 담당한 여행사에서 만든 안내책자를
통해서 남아공이 어떤 나라인가를 엿볼 수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행자 체재 유의사항에 있는 치안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다. 어두워진 후에는 거리를
돌아다니지 말 것, 강도가 돈을 요구하면 응할 것.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공항에 마중을 나온 교민의 주의사항을 들으니
그 섬짓한 느낌이 피부로 와닿는 듯했다. 공항에는 아침 7시가
넘어 도착했다. 왠지 느낌이 다른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를
숙소까지 데려다줄 커다란 버스에 올랐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버스기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손님을 목적지에 확실히
내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버스기사가 길을 잘 모르는
바람에 우리는 예정에 없던 시내 투어를 하게 되었다. 평일
낮인데도 길거리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햇볕을 쬐거나 자판을
벌여놓고 과일을 팔거나 잔디밭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서야 이곳 흑인의 60%가 실업자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후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면 구걸을 하거나
자잘한 물건을 파는 흑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시내 투어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지나치지 않았다. 부자 동네 투어 중
놀라운 점은 집집마다 높은 담과 철조망 그리고 경비업체가 벽에
붙여놓은 ‘Armed Response(무장응답)’라는 표지판이었다. 그
담 너머에는 넓은 저택과 풀장, 테니스장이 있을 것이었다.
사설경비회사가 이만큼 잘 되어 있는 곳도 드물 것이며, 그런
회사들이 아마 앞으로도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했다.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흑인정권시대를 열어놓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전에 수 백년 동안 있었던
인종차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나보다. 헌법상의
차별은 사라졌지만 높은 담장은 여전히 건재했다.
버스기사는 결국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온 2명의 목적지를 찾지
못해 회의장에 떨궈 놓고 우리의 숙소를 찾아갔다. 아무렴
숙소가 ‘시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예측은 빗나갔고
마치 휴양을 온 기분이 들 정도로 외딴 곳이었다.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곳에서는 자가용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버스처럼 생긴
버스를 본 적이 없고 흑인들만 가득 탄 승합차는 몇 번 보았다.
땅도 넓은데 대중교통도 그렇다보니 그 황량한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도 자주 눈에 띄었다. 멀지 않은 거리도 서울 땅 밑에
촘촘하게 얽힌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생각을 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일이 끝난 저녁에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날 저녁 즈음 전기철조망
건너편으로 기린이 나뭇잎을 뜯는 장면과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들을 보며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개들과 고양이,
공작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보기 좋았다. 그런데
이곳에도 밤이면 기관총을 들고 커다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이 곳 사람들은 개를 많이 키우는데 이 숙소에도 개 몇 마리가
살았다. 그런데 그중 커다란 개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흑인을 보면 짖어대고 경계했다. 반면에 직원이건 손님이건
백인이나 우리를 볼 때는 짖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개를
인종차별 개(racist dog)라고 이름 붙였고, 나중에 나스렉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여성운동 관련 부스에 찾아가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해주었더니 재미있어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인종차별을 접할 수 있었다.
행사장은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졌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턴(Sandton Convention Centre)과 NGO들이 모이는
나스렉(Nasrec Expo Centre)과 문화행사 및 기업들의 공간인
우분투(Ubuntu Village)가 그것이다. 세 곳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셔틀이 운행한다. 나스렉에 가서 등록을 하고 출입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여 다음날 곧바로 나스렉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샌턴에 가서 등록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 나는 나스렉에서
기자들이 모이는 프레스센터의 위치와 최작가님의 ‘떠도는
대륙’과 ‘펭귄이 녹고 있다’를 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며
돌아다녔다. 실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자를
찾고 또 찾고 얘기를 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었다. 이곳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느긋하다. 일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도 그만인
것처럼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 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작가님의 컨셉 중의 하나는 미국 대통령 부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와인잔에 레몬 꽂듯이 지구를
꽂아놓고 지구의 피가 흘러내려 와인잔에 담겨 있는 그림을
팜플렛, 포스터, 엽서, 뱃지, 현수막 등으로 제작하여 준비했다.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를 쥐어짜서 나온 피를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만 있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부시는
리우+10에는 오지도 않았고 미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딴지를 걸었으며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만 하고 있었다.
최작가님이 직접 부시 가면을 쓰고 그 와인잔에 빨대를 꽂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고 나는 옆에서 ‘부시가 나타났다. 부시가
지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외치는 역할을 했다. 아직
리우+10이 시작되기 전인 24일 토요일 낮에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이 이 퍼포먼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장소를
바깥으로 옮겨 ‘떠도는 대륙’을 설치하고 얼음으로 펭귄을
조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많은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갔다. 그 다음 월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활동가를
만났고 행사장 안의 좋은 자리를 제공받았다. 그뿐 아니라
창고까지 쓸 수 있게 해줘서 무거운 작업도구들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몇 번 짬을 내어 부스 전시장을 돌아다녔다. 특히 우리
청년환경센터와 같이 반자본 환경운동을 내걸고 활동하는 외국의
단체를 찾으려고 했다. 대만의 NGO들이 모여서 차린 부스에서
이른바 노동자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를 만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외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고 설명을 들었다. 아프리카
환경정의네트웍포럼(EJNF) 부스에서는 탄광 주변에 사는
빈민들이 어떻게 공해에 노출되는지를 사진과 함께
설명해주었다. 이곳에서도 사회적/생물학적 약자는 환경적
약자라는 사실, 그래서 환경, 빈민, 농민, 노동자, 여성의
문제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도 큰 행사였지만 10년 전의 리우 회의에 비해 NGO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리우+10을 준비하기
위해 4번의 준비회의가 있었고 4번째 준비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WSSD를 위한 이행계획 초안이 11개 장/153개 구문/615개
부속구문으로 제출되었고 그 중 75%는 합의되었으나
세계화/재정/무역을 비롯한 25%는 합의되지 못했다. 이는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입장 차이
등에 의한 것이며 특히 이행계획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포함시키는 것에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함으로써 리우+10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든 것이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리우+10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회의에 대한 비관적인
분위기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결국 부시는 오지 않았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연설 도중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비난과 야유로
연설을 몇 번이나 중단해야 했다. 회의 결과 2015년까지
절대빈민의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세계연대기금을
창립한다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연도가 빠졌고, 또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구하면서도 그것에 ‘진보된 그리고 더 깨끗한
화석연료기술(advanced and cleaner fossil fuel
technologies)’을 포함시키는 등 합의문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중국과 캐나다, 러시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나서서 미국이 없이도 협약이 발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다.
리우 회의와 리우+10 모두 세계 정상들이 모여 전지구적
환경문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다는 것만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개도국에게 지원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 양
행동해왔다. 그들은 현상만을 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각종
협약이라는 해답을 제시하면서 그것조차도 자국 산업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NGO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는데, 등록할
때 등록비를 내야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것도 돈 없는 NGO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스렉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고 곳곳에서 집회나 행진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을 뿐이다. ‘지구촌’을 컨셉으로 하여 옷과 복장을
맞춰 입고 돌아다닌 일본 사람들,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주장하는 아프리카 흑인들, ‘이스라엘은 불량국가이다’라고
주장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접근성(accessibility)을 요구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행진, 세계의 반핵 활동가들이 모인
반핵집회, 지속가능한 지구와 평화로운 한국을 위한 여성들의
행진,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행진, 부시 반대 집회 등도
열렸다. 시간이 지나 8월말이 가까워지면서 썰렁했던 행사장에
조금씩 흥겨운 느낌이 살아났다. 그러나 뭔가 풀리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었다.
이 갈증은 8월 마지막 날의 행진을 통해 말끔히 풀렸다. 8월
31일 토요일은 세계정상들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행진과 집회가 있는 날이었다. 오랫동안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될 것이어서 우리팀은 이후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한번 더 생각하고 나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날은 4개의 행진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중 인다바(Social Movements Indaba)의 행진에 함께 했다.
행진은 요하네스버그의 가장 가난한 동네인 알렉산드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턴까지 약 9km를 걷는 것이었다.
나스렉에서 알렉산드라까지는 셔틀을 타고 갔다. 알렉산드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창 밖의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수도와 전기도 없고 집은 거의 다
판자로 지어져 있었다. 나중에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니
칼라였는데 왜 내 머릿속에는 그 장면들이 모두 흑백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셔틀 안의 우리는 창 밖의 풍경이
신기했고, 창 밖의 사람들은 그런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신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서로를 의아한 눈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다.
셔틀에서 내리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붉은 색 티셔츠에는 ‘End Poverty: LAND! FOOD! JOBS!’(가난을
끝내라: 땅! 음식! 직업!)이 굵게 씌어져 있었다. 다른 티셔츠와
현수막 등에는 Landless People’s Movement,
Anti-Privatisation Forum, Tony Blair! Don’t beat about the
Bush!, Our World is not for Sale, WTO out of W$$D, Take back
the Land!, Factory gases and waste is killing our
environment-Environmental Justice Network Forum, Phansi(down
with라는 뜻) privatisation, Anti-racist, Anti-capitalist,
Resistance, Imperialism+capitalism result in privatisation
which destroy human existence, Eat money?, USA-Isreal-UK:
Axis of Evil, Free Palestine now, Stop canned hunting and
all animal abuse-Diversity Nature Animals(DNA), Shame on
Bush: protect people not polluters!, Stop sustainable
destruction, Only socialism can develop our needs!, Phansi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Bomb
Sandton 등의 말들이 씌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표현들이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웠다. 대열의 선두에는
앰프가 실린 트럭이 있었고 그곳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을 이끌었다. 가끔씩 흥겨운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는데 재미있었다. 특이했던 것은 모든
구호를 노래를 부르듯 외친다는 것이었다. 그들 특유의 리듬과
흥겨움, 억양과 몸짓이 아주 맛깔스러웠다.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의 그들 검은 피부와 붉은 티셔츠의 물결 … 물론
세계 곳곳의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연대를 과시했다. 그런데 선두에 섰던 트럭은
도요다였고 트럭 위에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소니와 캐논 카메라로 행진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날씨는 더웠다. 나는 합판과 각목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다녔는데 아침 10시 반부터 대여섯 시간을 걸으면서도 중간에
10분 정도 쉬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정말 축 쳐져서 흐물흐물 걸었다. 내가 들고
있던 피켓은 녹색연합이 나스렉에서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사진전에 썼던 것으로 ‘Axes of Devil, We
cannot live with U’라는 문구가 씌어져 있고 가운데에는
지구반지 안에 부시의 얼굴과 자유의 여신상이 금지표시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최작가님은 적절한 때에 부시 가면을 쓰고
와인잔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했고 역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도 미국의 패권주의와 부시에 대한 반감은
짙었는데 신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내 길고 긴 행진을 끝내고 샌턴에 도착했다. 샌턴 콘벤션
센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트럭은 무대로 변했고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모여
사진을 찍어댔다. 그 목소리 좋은 선동가들이 나와 “viva
anti-privatisation viva!”, “phansi Mbeki(남아공 현 대통령)
phansi!” 등을 외쳤다. 짐바브웨,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브라질 등에서 온 활동가들이 발언을 했다. 이들의 얘기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옷이나 현수막에서처럼 직설적이고
대담했다. 이들은 땅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음식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달라고
요구했고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물을 더럽히고
환경을 파괴한 저들(샌턴을 가리키며)이다, 새로운 반세계화,
반자본운동이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투쟁의 연대를 세계화하자,
팔레스타인이 해방되기 전에는 어떤 해방도 없다, 저들(샌턴을
가리키며)은 소수다, 우리가 다수다, 우리는 국가적인, 지역적인
운동을 하는게 아니라 국제적인 운동을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제국주의/신자유주의/세계은행/IMF/WTO를 반대한다 …
와 같은 얘기들을 했다. 발언은 짧고 명쾌했다. 청중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었으나 우리 옆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나이든 사람들도
있었다. 중간에 남아공 정부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와 얘기를
하려 하자, 군중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내려 왔다. 군중들은 움베키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간에 경찰헬기가 집회장소 상공에 멈추어 있자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서는 ‘우리에게 헬기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땅과 음식과 직업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팔레스타인 관련자가 발언을 마치고난 후에는 우리 뒤쪽에서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태웠다.
타다가 만 쪼가리를 마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들에게는 노동, 환경, 여성, 빈민, 농민 등의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누가 그들의 생활조건을 파괴했고
누가 그들을 못살게 하는지 누가 그들을 착취하는지 명쾌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많은 문제와 모순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애써 에둘러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델라에 이어 정권을 잡고 있는 움베키
남아공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등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한 주장들과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른 근거와 생각들을 더 알아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다시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다.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이 났고 우리도
힘든 하루 일정을 마쳤다.
9월 4일로 공식회의일정이 모두 끝나면서 우리 팀도 쉬는 시간을
가졌다. 며칠 후, 인천행 비행기가 오산 근처를 지날 때부터 창
밖을 유심히 보았다. 다시 돌아왔구나. 땅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내려야할 시간이 왔다. 이제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해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미뤄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금 힘들기도 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남았다. 그곳에서 사온 작은 선물들과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내가 남기고 온 작은 흔적들과, 내 몸에 남아있는 다른
흔적들까지. 이젠,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