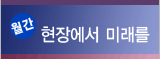교대제의 대안을 위하여
변형근로제, 불규칙한 장시간의 노동시간의 도입과 비정규직의 증대경향을 막기 위하여: 노동시간감소와 비정규직노동철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손 미 아 / 연구위원
1. 서론: 우리나라 교대체계의 가장 최악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한 자동차공장 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교대근무형태의 차이, 즉 주간고정과 주야맞교대의 차이에 의한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시간의 변화와 수면의 질과 양에의 변화를 가져와 근무 직후에 심한 졸리움 및 수면장해와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다(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2002). 즉,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노동이 인체의 생체주기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업무가 끝난 후 낮 동안의 수면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근무 끝나고 낮에 수면을 취할 때 주간근무 노동자들보다 “수면동안에 작동하는 부교감신경기능이 덜 작동”되고 있어서 야간근무 이후의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 끝나고 낮에 수면을 취할 때, 부교감신경과는 반대로 “활동을 할 때 증가하는 교감신경기능이 상대적으로 항진”됨으로써, 야간근무 끝나고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신체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야간근무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때에는 주간근무 때보다도 더 많은 신체의 소진과 에너지의 소비 및 신체의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반면에 야간작업 후 낮에 수면을 통한 휴식기를 통해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되지 못하는 점에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은 야간에 일을 할 때, 주간에 잠을 자야할 때 이중의 고로 인하여 체력의 급격한 소모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장조사연구의 결과에서는 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생체주기의 파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장시간의 야간노동시간의 철폐만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대체계의 가장 최악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대체계가 “2조체계로 수행되는 5/6일 연속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체계”라는 데에 있다. 즉, 하루 노동시간이 10~11시간 이상이므로 주야맞교대의 경우 야간노동시간도 당연히 10~11시간으로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 5~6일 연속근무에다가, 주말근무까지 할 경우, “7일 연속 밤근무”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
셋째: 한층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6일 연속 주야맞교대근무 이다보니,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주말의 피로도는 극도로 누적된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수면일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야간근무시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주일을 꼬박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루 이틀을 자청해서 쉬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중간에 노동력회복이 되지 못하여 노동자 스스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쉬게 되면 임금이 깎이게 될 것이고, 자본가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2002).
2. 외국의 사례들: 유럽에서 변형근로제, 장시간의 노동시간제의 확대 경향들
90년대 초를 전후로 하여, 유럽과 구미를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강화는 노동시간의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고(Irja Kandolin, 1998),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개의 노동시간모델이 제안되면서 교대제의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야간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생체주기의 파괴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일부는 오히려 문제점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압축 주 (a compressed work week)
최근 신자유주의시대의 노동시간의 다양화로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루 노동시간의 증대경향 ‘압축 주’이다. 이 압축 주는 유럽에서 한 주일동안에 노동시간은 변함이 없고, 하루의 노동시간은 길어질 수 있는 제도로 한 주 동안 노동시간을 압축해서 며칠동안 다 해버리는 것인데, 일을 해야 하는 날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의 장시간의 노동을 수행하고, 나머지의 날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다. “압축 주 근무”란 주당 근무일수를 줄이는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으로 주 3일은 근무하고 주 3일은 근무를 안 하거나, 또는 하루 10시간으로 주당 3일 근무하고 4일 근무를 안 하거나 또는 4일 근무하고 3일 근무를 안 하는 형태이다 (Tepas 1988).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압축 주는 24시간 동안 기계를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일이다(Duchon 등). 새로운 노동시간모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도입되고 있다(Knauth 1998). 고용주들은 비싼 장비를 사용할 시간을 확장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의 서비스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계작동시간을 개개인(노동인력)의 여러 가지 요구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기능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은 직업적인 요구도에 개인의 요구를 맞출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노동시간을 변화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을 조직하는 데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질병이나 나이로 인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압축 주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즉, 교대 노동자에게는 비번이 많을수록 밤 근무의 피로를 더 잘 풀 수가 있고 또한 사회적 관계는 여가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고 한 12시간 교대근무체계일 경우, 모든 주말이 비번이다.
그러나 압축 주 근무를 통해 근무자에게 더 많은 비번이 주어진다는 장점보다는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누적되는 피로와 각성도 저하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교대 근무자는 이미 각성도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이러한 교대근무자의 건강장해는 더 길어진 근무교대 특히 더 길어진 야간 교대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Rosa 등 1989, Ronen S, 1981).
Kecklund(1997) 등은 스웨덴에서 압축 주로 인해서 교대주기 사이에 8시간의 짧은 휴식시간을 갖는 노동자들의 수면장해를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사이에 짧은 휴식시간 (8시간)으로 인하여 수면의 장해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짧은 휴식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노동자의 경우, 깊은잠 들기 어려움, 수면장해, 반복적으로 깨어남이 있었다.
2) 지속적인 노동시간의 도입과 야간노동과 주말노동에 비정규직의 도입
최근의 경향들 유럽의 사업장들의 경향은 1단계로 24시간 노동시간 규정의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이 광범위해지게 되고, 4조에서 5조 교대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2단계로 고정적인 교대체계에서 더 불규칙하고/유동적인 24시간 체계로 변하고 있다.
섬유공업의 예를 보면, 고용주들은 최근에 생산성의 증대와 노동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노동일을 강제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직물산업을 보면, 70~8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주간에 일을 하는 전통적인 노동시간체계에서, 5일간 8시간 3교대체계, 1주당 6일간 6시간 4교대체계로 가면서 1년 동안의 생산시간을 4,500~6,000시간까지 확장시켰다. 3×8 교대체계에서 노동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일했고, 4×6교대체계로 오면서 노동시간은 36시간으로 감소되었고,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 추가 4시간의 임금은 식사시간 제외, 출퇴근시간 등으로 계산되었다.
80~90년대에는 많은 공장들이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였는데, 일요일 근무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대체계를 유지함으로써 1년간 8,000시간까지 확장하였다. 교대체계는 주로 8~6시간씩으로 하루에 3~4교대체계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34, 32, 30시간까지 축소시켰고, 40시간의 임금을 받았다.
벨기에 철강공장 사례를 보면, 3×8교대체계라 하여, 4조 빠른교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4일 일하고, 3일 휴식을 취하고, 3일 일하고 2일 휴식을 취하고, 2일 일하고 1일 휴식을 취하는 제도이다. 교대노동자에 주어진 혜택은 1년 266노동시간이 감소된 것, 야간노동에 대해서 60.4%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된 것, 주말노동이 39.3% 증가한 것, 18일의 연가기간을 갖는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 2조 10시간 교대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화학공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교대체계는 1년 동안 244 노동일을 기본 (주당 평균 37시간 20분)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의 공장에서는 3×8교대체계이며, “4일 일하고, 2일 쉬는 것”이나,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4조 (4조 3교대)체계 하에 있다. 북이탈리아의 고무공장의 경우, 최근에 연속적인 3×8 교대제 4/2 순환(4일 일하고 2일 쉼)을 채택하고, 년간 노동감소시간이 229시간에서 214시간으로 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수당을 추가로 주고 있다. 또 다른 고무공장의 경우, 300명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말에 대거 들어오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확장되고 있다.
요약하면, 유럽에서는 90년대 초를 전후하여 신자유주의 도입의 강화로 변형근로제 도입이 확대되었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이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하루 동안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야간노동과 주말노동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도입 등 변칙적인 근무형태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교대제 대응의 원칙과 실천전략들
교대제 대응방안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주야교대제가 결코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요구도에 따른 근무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
24시간 동안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노동자가 주야교대제를 통하여 야간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이고, 자본가계급이 만들어낸 것이니 해결가능한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교대제는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기계를 24시간 가동시켜 불변자본절약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형성이래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로부터 구입한 노동력을 24시간 활용하려고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매일매일의 노동력을 회복할 시간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왔다. 현재의 시기에 와서 자본가계급은 고전적인 노동시간의 관념(법적으로 하루 8시간 노동, 실제로는 하루 10~11시간의 노동시간)을 깨트리고, 변형노동시간제를 도입하여 한 노동자에게는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넘는 최대의 노동시간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위해 하루 24시간 기계를 돌릴까?를 고민하면서, 노동시간의 파격적인 변화,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입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노동자의 대안이 시급하다.
야간교대를 없애고,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야간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BEST 학술지에서는 이전에는 4일을 연속적으로 밤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었고(Knauth, 1995), 지금은 3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일 연속 10~11시간 야간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하루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한다. 매일 매일의 노동력이 재생산이 안 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수면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야간노동시간을 줄이고 매일 노동력 재생산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무엇인가? 야간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첫째: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방법이 교대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에 의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2교대조로 수행되는 5/6일 연속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체계”를 철폐해야한다. 2교대조 주야맞교대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노동으로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5조 3교대 체계, 주간 2조 8시간 교대제, 주간 2조 6시간 교대제 등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인력의 확보와 야간노동시간과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야간노동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개조에 의한 주간 2교대체계(6+6시간 주간교대제 [06:00~12:00, 12:00~18:00 (이후시간은 작업없음)])이다.
이는 야간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없을 때 한시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하루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과잉노동은 없는 상태가 된다. 임금은 보전되나 연장근무에 대한 보너스지급은 없을 수 있다. 유럽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에 대한 촉박함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교육받는 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질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자유여가활동이 보장된다. 이때 원칙적으로 노동자계급은 밤에는 공장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관철시켜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야간노동에 투입될 수 있고,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생산량감소와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2개조에 의한 8시간 2교대체계(오전 6시~오후 3시, 오후 3시~새벽 00:00시 (이후시간은 작업없음))이다.
하루 8시간근무제를 실제로 지켜냄으로써,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하루잔업 2시간”을 줄인다면 2교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은 오전 6시~오후 3시, 오후 3시~새벽 00:00시까지 일을 하게 되므로 주당 40시간이 되어 야간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체계에서도 자본가계급은 야간노동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조합은 이를 막아야 한다.
표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2교대조로 수행되는 5/6일 연속 하루 10~11시간 주야맞교대제”
교대형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 노동시간 |
10시간 주간근무
(점심시간제외)
(08:30~19:30pm) |
주간
(10시간) |
주간
(10시간) |
주간
(10시간) |
주간
(10시간) |
주간
(10시간) |
주간
(5시간~10시간) |
주간
(5시간~10시간) |
총 55~
70시간 |
11시간 야간근무 |
야간
(11시간) |
야간
(11시간) |
야간
(11시간) |
야간
(11시간) |
야간
(11시간) |
야간
(5시간) |
|
총 60시간 |
표 2. 하루 8시간씩 2조 2교대근무
교대형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 노동시간 |
8시간 주간근무
(점심시간제외)
(06:00am-15:00pm) |
주간
(8시간) |
주간
(8시간) |
주간
(8시간) |
주간
(8시간) |
주간
(8시간) |
휴무 |
휴무 |
총 40시간 |
8시간 야간근무
(점심시간제외)
(15:00pm-00:00am) |
야간
(8시간) |
야간
(8시간) |
야간
(8시간) |
야간
(8시간) |
야간
(8시간) |
휴무 |
휴무 |
총 40시간 |
③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 3조3교대, 4조 3교대, 5조 3교대 등 교대조가 늘어나고, 교대순환주기가 2교대에서 3교대로 갈수록 노동시간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가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조(오전/ 2휴식/ 7오후/ 2휴식/ 7밤/ 3휴식)에서 지속적인 5조 체계(5오전/ 3휴식/ 5오후/ 3휴식/ 5밤/ 4휴식)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주는 7일 연속일에서 5일로 감소되었고, 휴식기간은 하루가 늘어났다. 교대싸이클은 25일이다. 7싸이클 후에 다시 싸이클이 시작된다. 25주 동안 105일×8시간=840시간이므로 주당 33.6시간이 되는 것이다.
표 3. 4조 3교대의 예 : 7오전/ 2휴식/ 7오후/ 2휴식/ 7밤/ 3휴식
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2 |
휴식 |
휴식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3 |
오후 |
오후 |
휴식 |
휴식 |
밤 |
밤 |
밤 |
4 |
밤 |
밤 |
밤 |
밤 |
휴식 |
휴식 |
휴식 |
총 |
오전오후
밤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
표 4. 5조 3교대의 예 : 5오전/3휴식/5오후/3휴식/5밤/4휴식
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휴식 |
휴식 |
2 |
오후 |
오후 |
오후 |
휴식 |
휴식 |
휴식 |
밤 |
3 |
밤 |
휴식 |
휴식 |
휴식 |
휴식 |
오전 |
오전 |
4 |
휴식 |
휴식 |
휴식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5 |
휴식 |
밤 |
밤 |
밤 |
밤 |
밤 |
휴식 |
총 |
오전오후
밤휴식
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휴식 |
오전오후밤휴식
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휴식 |
오전오후
밤휴식
휴식 |
둘째: 건강권의 확보의 측면에서 현재의 교대제를 포함한 노동시간에서 “하루 중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한다. 교대제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수면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이 최소한 법적 허용시간인 8시간으로 줄어들어야 하고, 교대제 사이에 회복을 위한 휴식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는 밤 근무 끝난 다음날은 그냥 휴일이 아니라 “밤근무 해소를 위한 과정”으로 두어 휴일과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즉, Costa(1995)는 북이탈리아의 철강공장에서 5번째 조를 도입하여 주당 노동시간을 30시간까지 줄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전 교대체계가 20일 기간이었고, 2주간을 5일 일하고 2일 쉬고, 그 다음 한주를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체계였다면, 새로운 교대체계는 13일 일을 하고, 한주를 4일일하고 3일 쉬거나, 그다음 한주를 4일 일하고 2일 쉬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대근무 노동자들은 1년에 18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밤근무 다음날은 “밤근무 해소과정(Smonto Notte)”이라 하여, 첫날은 노동력회복을 위해 곯아떨어지느라 낭비되는 날로 고려하여 휴식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야간근무이전과 이후에 노동력재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회활동이나 여가의 활동도 막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야간근무 이전과 이후의 휴식시간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표 5. 이탈리아 철강공장에서 연속 교대체계
교대
싸이클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휴식 |
휴식 |
휴식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휴식 |
휴식 |
2 |
밤 |
밤 |
밤 |
밤 |
밤근무
해소과정 |
휴식 |
휴식 |
휴식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휴식 |
휴식 |
3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휴식 |
휴식 |
휴식 |
밤 |
밤 |
밤 |
밤 |
밤근무
해소과정 |
휴식 |
휴식 |
셋째: 야간노동시간의 감소가 되었을 때 임금을 감소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에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노동시간의 단축과 월급제의 도입 등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임금보전이 문제인가?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에는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임금이 상대절하되고 있고, 야간잔업을 위한 임금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 임금상승효과가 있다(한노정연 콜로키움 참조, 2003).
넷째: 노동자계급은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변형근로제 도입”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정책을 통한 자본의 노동정책은 더욱 더 치밀해지고 있다. 자본은 더 유연적인 노동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서구유럽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말교대근무시간이나 야간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기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집단이 양산되고, 이는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심화로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일부의 공장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등장했는데, 정규직노동자들이 월~금요일 사이에 고용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 12시간을 일하고, 매 2주당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특수한 주말교대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야간노동시간에 대거 투입되는 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막아져야하고, 향후 제3세계 등으로 파급될 효과가 막아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힘에 의해서 막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낸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는 2조 10시간 교대체계를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을 확장하고 있다. 관리자측은 현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3×8교대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두개조의 주말근무팀을 만들어서 2일 동안 20시간을 일하고,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주말팀이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근무시간을 토요일까지로 확장하기로 했고, 정규직 노동자를 증강시키며, 6×6 교대체계(1주 동안 6일간 6시간씩 4교대)를 채택하여, 주당 34.5시간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고령의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의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출될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이기도 하며, 또한 야간노동에 투입될 때 건강장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학자들은 45~50세의 나이든 교대 노동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간근무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밤 근무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나이든 교대근무자의 경우 “느린 교대주기 Slowly rotating shift system”에서 더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ikko Harma, 1998). 고령 노동자의 조기퇴출의 고용위기를 막고,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여섯째: 야간작업시에 노동강도 강화저지 방안이다. 야간작업시에는 육체적 하중이 심한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작업을 막아, 야간작업과 노동강도로 인한 이중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야간작업시의 노동강도 강화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활용해보자.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들은 교대순환주기, 교대방향, 선잠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교대제의 형태는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노동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다. 이 방법들은 교대제와 야간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강장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일 수 있다. 교대제의 대안이 이 부분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다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야간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채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가능한 노동자의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보자.
① 교대순환주기
교대주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주 긴 교대순환제이고, 또 하나는 매우 빠른 교대순환제이다. 우선 교대순환주기의 경우, 24시간 신체리듬을 밤 시간활동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한 “긴 교대 순환제”, 24시간 신체리듬이 낮 시간 적응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빠른 교대 순환제”가 있다. 이중에서 최근에는 빠른 교대순환제가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낮 동안의 신체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수면부족을 최소화하고, 각성도와 안녕을 증대시키는 데에 더 좋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체리듬의 첫 번째 특징은 24시간 생체 리듬이 밤 시간 활동에 상당히 느리게 보통 2~3주 걸려서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한 사이클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생체 내적 주기나 시간이 25시간에서의 그것은 24시간 보다 조금 길다는 것이다(Weber 1979). 첫 번째 특징인, 느린 적응경향은 생체 24시간 리듬의 완전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의 교대가 너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 적응된 리듬은 깨어있을 때의 각성능력과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둘 다에 영향을 미친다(Akerstedt 1985).
결과적으로 Folkard(1981) 등은 아주 긴 교대 순환제(3~4주), 또는 지속적인 밤교대 근무가 어떤 특정한 업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24시간 주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느린 순환의 이론상 장점은 인체 24시간 리듬이 밤 시간 활동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점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교대 근무동안 계속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적응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완전히 밤 시간의 리듬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업무들은 매우 빠른 순환(교대는 매 2일마다 바뀐다)이 바람직한데, 이는 24시간 순환 리듬이 낮 시간 적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빠른 순환은 낮 시간 적응의 24시간 리듬을 지킨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깨어있는 동안 경계의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낮/저녁 교대 때에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anatch 등 1982). 현재까지 빠른 순환 교대 시스템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빠른 교대는 수면 부족을 최소화하고(Fisher 등 1997), 24시간 주기의 리듬과 사회적 접촉을 좋게 하고(Kanauth 1993, 1995), 각성과 안녕을 향상시킨다(Phiilps 등 1991, Willamson 등 1986, Orth-Gomer 1983).
나아가 빠른 순환 교대 시스템은 기억을 요구하는 업무에 좋은 결과를 보고했다(Monk 등 1981). 빠른 순환에서는 측두부의 조직화의 일시적인 부조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의 부조화(EEG기록=수면 그래프)가 빠른 순환에서는 더 적으며, 결과적으로 생리적 측두부의 조직화의 재생이 주별 순환보다 빠른 순환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Foret 등 1979, Chaumont 등 1979, Vieux 등 1979).
그러나 빠른 순환의 단점은 생체리듬이 낮 시간으로 적응이 되어 있으므로 밤 시간에 적응이 안된 상태로 있으므로, 밤 시간에는 각성도가 매우 낮다는 것과 또 낮에 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빠른 순환교대제의 경우, 교대제 사이의 자유시간을 감소시키므로 이로 인해 수면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Totterdell 등 1990, Kurumatani 등 1994) 8~10시간의 빠른 순환체계는 불가피하게 수면길이를 감소시킬 것이고, 졸리움의 정도를 증대시킬 것이다(Akerstedt T. 1997).
교대제사이의 “쉬는 시간”에 대한 역치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부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빠른 교대주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대주기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는, 빠른 교대주기(2~4일)는 주당 돌아가는 교대체계보다 더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빠른 교대주기를 함으로써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낮 동안의 생체주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Atanu Kumar Pati, 1998).
② 교대의 방향
교대의 방향은 시계방향(앞으로의 순환 혹은 지연된 시스템) 혹은 반 시계 방향(뒤로의 순환 혹은 먼저 가는 시스템)이 있다. 시계방향 또는 지연된 시스템이 인체에 더 맞는 이유는 생체내적 순환주기에서 수면주기는 24시간 주기를 따른다고 하나, 실제로는 25시간 리듬에 따르기 때문에 “24시간주기인 시계시간”보다 점점 늦어진다는 것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교대 스케쥴의 시계 방향 순환이(예: 아침―저녁―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환주기에서 이 전진적 경향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쉽게 하지만, 정상 취침시간보다 더 일찍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전진 순환 스케줄은 근무자가 단계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점차 늦추어서(시계 시간의 측면에서 본 시간) 잠들기 쉽도록 한다. 시계방향 순환은 반 시계 방향 보다 교대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시계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의 변화는 생산성과 안녕(Czeisler 등 1982, Orth-Gomer 1983). 그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Epstein 등 1991, Bartom 등 1993)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감소시킨다.
반면, 역행 순환은 작업자에게 더 일찍 잠들게 강제하는데 이것은 더 어렵다. 순환리듬의 생체 내적 경향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진술했듯이 역행순환의 장점은 밤 교대에서 저녁 교대까지의 ‘긴 변화’와 잠재적으로 주어진 별도 휴식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리듬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진 순환과 보다 빠른 적응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진 순환이(시계 방향) 일관되게 잘 적응된 수면 시간을 산출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현재까지의 제한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교대 스케쥴의 시계 방향 순환이(예: 아침―저녁―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계방향이 반시계방향보다 교대작업자에게 더 좋다는 보고가 있다. 비록 제한된 증거이긴 하지만, 시계방향의 교대제(아침―저녁―밤)가 가장 좋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의 근거는 생체주기가 덜 파괴되는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③ 선잠
수면 없이 쉬는 것보다는 수면이 활동과 각성의식의 저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좋다. 그러므로 최대한의 숙면은 교대 근무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교대 근무자는 종종 야간 근무후의 낮 시간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각성신호를 보내는 생체 내부의 순환리듬과 활동적 가사일과 이웃집에서 들리는 외부적 소음이 혼합되어 낮 시간 잠자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짧은 선잠이 종종 낮 시간 수면의 긴 기간을 보충하기도 한다. 짧은 선잠은 종종 총 수면시간을 평균 8시간에 가깝게 맞추어 준다. 이러한 선잠은 심한수면 부족없이, 낮 동안 빼앗긴 수면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잠(naps)은 sleep inertia(수면으로 꼼짝 안하는 상태)를 10~15분간 유지시켰다. 50분간의 선잠으로 인해 낮 동안의 수면이 감소되었다. 이 논문은 첫 번째 밤 근무 동안에 1시간 미만의 짧은 선잠이 각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Mikael Sallinen et al, 1998).
일본의 경우 24시간 근무체계에서 수면실을 제공해서 고용인에게 직장에서 잠으로 쉴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 왔다(Omoto 1988).
밤작업의 시작 시기나, 밤새도록 작업하는 교대 작업 전의 선잠은 연속적인 작업에서 피곤완화에 효과적이고, 아침 작업수행능력을 좋게 할 수 있다(Dinges 등 1987, Angiboust 등 1972. Bonnet 1988. Dinges 등 1987. Gillberg 1984. Nilcholson 등 1985). 또한 철야작업에서 선잠은 각성 정도 유지와 각성의 저하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Dinges 등 1987, Lubin 등 1976) 한 실험 연구를 보면, 하루 밤 철야근무자의 중앙 한시간 동안 수면하게 하고 철야자의 중간 깨어있는 동안 휴식과 비교해서 각성이 증가했음을 보고했다Gillberg(1984).
1시간 미만의 선잠(naps)(예를 들면, 01:00~04:00 사이 50분이나 30분 정도의 짧은 수면)은 조기선잠을 잔 후 50분 이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생리적인 졸음상태(physiological sleepiness)가 줄어들었으나, 교대제의 말기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주관적인 졸음상태(subjective sleepiness)는 선잠에 의해서 감소되었다.
또한 선잠은 24시간 주기 리듬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빠른 순환교대의 작업자들에게 이점이고 느린 순환교대에게도 밤 근무 후 적응을 촉진하고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 조정으로서의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Minors 1981).
4. 결론
결론적으로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교대제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 주도의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전제하에, 장시간의 야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 야간교대근무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Akerstedt T. 1997. Optimal sleep/wake rhythm in shift work-some empirical observations and predictions from a mathematical model. Abstracts shiftwork international newsletter vol 14, no1, May. 1997. 74p
Ronen S, Primps SB. The compressed work week as organizational change: behavioral and attitudinal outcomes.Acad Manage Rev 1981 Jan;6(1):61-74
Duchon JC, Keran CM, Smith TJ. Extended workdays in an underground mine: a work performance analysis. Human Factors Research Group, U.S. Bureau of Mines, Twin Cities Research Center, Minneapolis, MN 55417.
Kecklund G, Akerstedt T, Lowden A, Axelsson J. The effects of compressed work hours on sleep: gender differences. Abstracts shiftwork international newsletter vol 14, no1, May 1997. 103p
Knauth P. Innovative worktime arrangement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8;24 Suppl 3:13-7
【 제 74차 콜로키움은 ‘교대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교대제의 본질과 대응방안’을 「기아자동차 화성노동자의 교대근무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발표를 중심으로 현장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활동가와 연구원 등 23명이 참여했습니다. 】
다음은 질의응답과 토론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외국 사례 중에도 수면장애를 질병 유소견으로 포함시킨 사례도 있다.
특히 운수부문의 경우 심야 노동 중에 휴게․수면이 근무시간 중에 배치되어 있다. 휴일 확보와 연속 야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과제이며 일단 심야노동시간의 축소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교대제, 야간노동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일단 임금 보전의 문제, 특히 월급제가 먼저 쟁취되어야 실제 야간 노동 축소 및 특근 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가 경영위기 시기에 ‘주간연속2교대’(잔업축소)를 대안을 제시했다면 지금도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가, 과연 임금을 축소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월급제―노동시간단축―주간 연속2교대 등의 단계 설정 방안 외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보자.
○ 앞에서 대부분 임금이 어느 정도는 인상, 충족이 되어야만 실제 노동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잔업 휴일노동의 축소가 가능하다고들 한다.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도 그러한 자본가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팽배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정반대로 접근되어야 한다. 잔업을 줄이는 것은 임금 상승의 조건이다. 자본론을 인용해봐도 그러한데, 노동시간이 오히려 먼저 줄어들어야만 총노동력 공급이 줄어서 노동자간 경쟁이 줄어들고 그래야만 시간당 임금, 노동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을 먼저 줄여야만 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 즉 노동시간단축이 임금인상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 한편 교대제 개선 방안은 건강권 문제와 함께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의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생산직과 사무직의 동일임금, 통상임금 동일대우를 주장할 필요도 있다. 그러한 근거 속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안정화시키고 경쟁도 줄여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이번 현장토론과정에 통해서 교대제 노동 형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이전에 일단 교대제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심야노동철폐 축소라는 점을 논의했고 그 후 야간노동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노동시간단축 방안들이 결합되어 검토되어야 함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