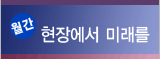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ü ��� ������ �Ϻ��� ����(����)
- ����․������ ������������ ���ݰ� ��������! -
��ȹ����
��ü��� ������ �Ϻ��� ����
�� ���� �Ϻ��� ��Ȱ�������� ��������� �� 2ȸ �߰��ϴ�
�������� ꡔ�������ꡕ 97�� 3�� No 558ȣ�� �����
���� ������ ���̴�.
�����ں��� ����Ż��å : �뵿��������ȸ ������
�����ں��� �̹� �۳� ������ ���۵� 97�� ������ ��������
�������������� ������ �ۺװ� �ִ�. �� �ٽ��� �����ں��� ����
�������� = ���������̴�. �Ϻ��濵�ڴ�ü����(�ϰ��)�� 1��
14�� �ں������� ������å ��ħ�� ꡔ���� 9��(97��)��
�뵿��������ȸ ����ꡕ(���� �빮������)��
「��������� ���λ�Ȱ�� ���� ������ ��ǥ�� �ϴ�
��������, ����3�� �桯�� ���」�̶�� ��������
��ǥ�ߴ�. �빮�������� 1997���� ���������� ���⡯����
��ġ����, 97�� �������� �ӱ�․���빮�� �Ӹ� �ƴ϶�
���․����� ��������� ��ȭ�� ���� ���������� �����ؾ�
�� ��(ί)�� ��(��)�� ������ �����ϰ� �ִ�.
�ϰ���� ���ÿ� ������ũ�� ���Ķ����� ã�⸦ ����� ���ο�
���Ϻ��� ���� ����(������ �̱�)�� �ٸ� �� 3�� ����
����ϴ� ��������� �÷����� �����ϰ�, �� �ȿ��� ���ο�
�����������⺻���� ���ȿ䰭�� �����ϰ� �ִ�. ���������
�÷����� �Ϻ��� ������� ������ �߽ɿ� �ΰ� ������������,
������������, ����ȸ���尳����, ���뵿����․���밳����,
�����λ�Ȱ������, ��������������
����․�뵿․�ں��� �ϳ��� �Ǿ� ���ο����
�����Ѵٴ� ���̴�. ���� �ƹ� ���뵵 ���� ��ȹ�� �����ϴ�
������ �������� ������ �� ������ ���� ���� �ź������ǿ�
������ ���� ��ġ�ⱸ�� ���������� �⺻�� �α��� ������ ��
�������� ���������̴�.
�Ϻ��� ���� ������ ��2�� ������� ����� ���ļ�����������
��ȭ����� �ݿ��� �Ϻ������(���� �ں����� ����������
��������� ������ ���� �ְ��Թ�������)�� ����, �Һ�Ʈ
��ȸ���ǿ��� ���װ���� �ʿ��ߴ� ��ȸ���� ����, ���������
�������� �����ñ��� �뵿․������å ���� �ݿ��Ǿ� �ְ�,
��ȸ����ü���� �ں�����ü���� ����� ������谡 �ݿ��Ǿ�
�־���. �������� ��û��(Red-Purge) ���� �ݵ��� å����
�ﴩ����, �����ü �� �ں����� ���� ����
�뵿��․�ٷ��ι��� ��ȣ�Ϸ��� ���� �۵��ϰ� �־���.
���� 50���� ��ġ�鼭 ���� �Ϻ� �����ں��� �̷��� �ӹڿ���
��� ���� �ٶ�� ��� �ں������� ������ ����������
�����ⱸ�� �αǺ��������� ����ȭ�� �����ϱ� ����
��������ȭ��, ������․������������ ��� ������ �ִ�.
���� �帧 �ӿ� 97�� ������ ���� �ִ�.
����(�Ϻ��뵿�����ѿ���, 796����)�� 2�� 13�� ������ �Ϻ�
���������� ��97�� �������ü��� �߾� �ѱȱ���ȸ���� ���� 97��
���������� �����ߴ�.
����������․����Ȯ��․���ȸ������ ���ΰ����� ��
�� �� ��ȸ���� 1�� 3õ ���� ��. ������ �ƽô� ȸ����
���ӱ��λ� ��� 1�� 3õ��, 2������ Ư�������� �ױ��� ����ȭ
���� �������ڡ��� ���Ǹ� ǥ���ߴ�. ���ڴ� 3�� 18��19����
���ִ��� ���� ȸ���ϡ��� �����ϰ� �ִ�.
���� �����(�����뵿�����ѿ���ȸ, 140����)��
���߸��뵿���հ���ȸ ������ 97�� ������������������ȸ����
����� ������ ���ϰ� �ִ�. 2�� 27�Ͽ��� ���ο��������ȸ��
�Բ� ������ ����� �߿����Ǵ翡�� ���Һ�
�����ݴ�․�Ƿ� �밳�� ����․���λ�Ȱ ��ȣ�� ����
���ΰ����� ���ɰ� ���߾��ѱȱ���ȸ���� ����. 97��
������������������ȸ���� 6�� ���� ��3�� 5õ�� �̻���
�䱸�ϰ�, 3�� 18���� ����ȸ���Ϸ� �����ϴ� ���� 19���� ��1��
���� �����ൿ�Ϸ� ��� �ִ�. ���
������(�����뵿���տ�������ȸ) ������ ���հ� �� ��� �ʿ���
������ ���� ���߸� �뵿������ 97�� ������ ���δ�.
��ö(����)�� �߾����ܱ��� �ߴ�
��ö�뵿����(��Ҿ)․����(��Ҿ)․�Ϻ���ö�뵿������
����ȸ(������֤,19����)․�����ڵ�������뵿���տ���ȸ(�
�����)․���Ϻ����뵿����(����ؽ) �� 13�� ���� ����
������ 1962� �������ü�� �Ἲ - 87��
���Ϻ�����������뵿��������ȸ(���Ҿ��)�� ��ȯ - �ϰ�,
�ľ������� �⺻���� �� ������ ������ �����ൿ�� ���� ������
�����߾���. ����(��Ҿ)�� �������� �߽��������� ��ö��
����․�ο�ȭ�� ���Ŀ��� �������������� �����ϰ� ������,
���ݵ� 1,047�� �ذ�öȸ������ �ϰ� �ִ�. ���� ��������
76���� 25�� ������ ����� 3�� ���� �Ǿ� ������ ���η���
��������.
�� �ϳ��� ��, ��ö�ѷ��� �ΰ��ι� �������� �ִ��������μ�
������ ����������� �������� ������ ������ �Դ�. ��ö�ѷ���
�����뵿���հ� �ұ���뵿�����̶�� �� ���� ����������
�Ǿ� �ִ�. 2�� 13��, �Ϻ��ο�ö����ȸ(������)�� ���信��
15�� ���� �빫����ӿ�ȸ�Ǹ� ���� 97�� ����������
1967����� 30�� �̻� ����� �� ���߾����ܱ������� �����ϰ�
���������������� �ٲ� ���� �����ϰ�, �̸� ��ö�ѷ� ����
���տ� �����ߴ�. �� ��⸦ ���� ���� ���(����)�� �뵿����
�ں����̴�. ��� �濵���� �䱸�ϰ� �ִ� ������±� ������
������ �䱸������� ��ü���� ��ö�ѷ��� ������ ���� ����
��Գ뵿���յ� �Ҹ��� ���̸� ���߾����ܱ����� ��Ż��
�һ��ϰڴٰ� �߱� �����̴�. ��Գ뵿������ �ൿ�� �濵����
���ϴ� ����ö�ѷ��� �䱸�� �ٸ� �꺰�� ���� ����Ǵ� ������
�ִ١�, Ȥ�� �������λ� �� �ӱ��λ���� ���� ����
�̿밴���κ��� �빫�� �ö� �ִ� ������ ���� ��
�ִ١��� ���� ���ǿ� ���ظ� ǥ���� ������ �ϴ� ����
���̴�.
��ö�ѷ��� ������ü �Ŀ��� ���� ���Ͽ��� �ľ��� ������
�����ϰ� ���δ� �ľ��� �����ϴ� �������� ���߾����ܱ�������
������ �Դ�. �ֱ� 2��3���� ��� �ں��� ��鸮�� �����
��ö�ѷõ� �����Ͽ�, �ݳ���� 3�� ���� �ľ��� ������
��ġ���� �ʰ� �߾����ܱ����� ���Ϸ��� �ߴ�. ��ö������
���� ������ ��վ�� �߾����ܱ����� �����ߴ� ���̴�.
�̰����� ���� �ӱ��λ� Ŀ�ٶ� ������ ������ �� ��ö�ѷ���
������������ ��ǵǾ���. �������� ����� ��ö ������
�������̰� �ӱ��λ��� ������ �ݿ��� ���� ���̴�. ������
��ǥ�ߴ� ����� �����ӱ� ����� ũ�� ����ǰ�, �� �����
�����ݿ����� �켱���� �ϴ� �ӱ������� ���������� �ǰ� �ִ�.
�뵿�ڴ� ������ ����� ���£ ���� ����, �뵿������
�⺻�� ����� �뵿�ڰ� ������ ������ �� ����� ����� ����
�ִ�. ��������� �÷����� ������� ���� ������ �ൿ��
ö���ؾ� �Ѵ١��� ���Ѵ�. �̰��� �ٷ� �뵿������ ���縦
�����ϴ� ���� �ٸ� �ƴϴ�.
������ �����ں��� ��������․��ü�� �����ְ� �ִ� ����
������ ��������ȭ��(���Ҵ��)�̴�. ���� ������
�Ϻ�ö������뵿���տ���ȸ(��˼Ҿ֤)�� 2�� 13��
�߾�����ȸ���� ����� �籸�� ���� ��Ȳ���� �����ϰ�, ����
���ݳ������� ������ �����Ҵ�. �� ��ħ�� �� ���� �����ȸ����
�����Ǹ� ������� �ǽõǰ�, ö������� �������� Ż���ϰ�
�ȴ�.
�Ǿ��� ������ �һ��ϴ� ������������
�ϰ���� �� �������� ��������ȭ��, �������������̶��
�뵿�ڰ�� ���� �⺻������ �����Ҵ�. �ϰ���� 1995�� 5����
��ǥ�� 「�Žô��� ���Ϻ��� �濵��」(�������
�ּ������� �����ϰ� �Ҿ��� ����뵿�ڸ� �����Ű�� ö����
�ɷ����� �빫������ ����)�� �̾�, ������ �⺻���� ��� ��
�� ���� ��������� �÷����� ��ǥ�ߴ�. �� �� ���� ����
������ 97�� ������å�� 「���� 9���� �뵿��������ȸ
����」�̴�. �װ��� ������ �����ں��� 97�� ������
���������� ������ ������ ���� �ϳ��� ��������ιۿ� �����ϰ�
���� �ʴٴ� ���� ����������. ���� �� ������ ����
���ں������� ���� �ӱ�ü�踦 ��� �뵿�ڿ��� ����������
ȹå�ϰ� �ִ�.
�̹� 「�Žô��� ���Ϻ��� �濵��」�� �����־���
「���� ��Ʈ������」 - ��� �ι��� ��� ��(���
�����ɷ�Ȱ���� ��․���������ɷ�Ȱ����
��․���������� ��)�� �뵿�ڰ� �� �� �ʿ��Ѱ���
���ϸ� �ϴ� �� - �� ��õ�ǰ� �ִ�.
���ϱǾ�����(�����������)������ ������� 1�� 8õ��,
��ƮŸ��․�İ� �� ���������� ���� 5õ��(�������
28%)�̴�. 10�� ���� ���Ͽ� 10����Ʈ �����ϰ� �ִ�. �����
�� 2,500���� ������(������) ���ڿ�(����)�� �����Ⱓ
�Ͻ������� �ٸ� ����� �İ��ϴ� ���� �ǹ��Ѵ�.- ���� ��
�̴�. ����ī����Ű(�����Ѧ)������ ����․���� ����
�ι��� �����������(�����ɷ±�․������)��, �������úι�
��� ��Ư�������(1�� �����) ���� �д�. ��������
�̽��̿����� ������ �������̰�, ����Ʈ ������ ä���Ͽ�,
���������� ������ ����Ѵ�. �ֱ� �̾��̱ݼ�(߲������)��
�������� ������������ �ӱ������� �����Ͽ���,
�����Ÿ����(�������)������ 98� �ű�ä�� �������
���ױ������� ��������� �����Ѵ�. �̰���
������․�������������� �����Ű�� �ʰ� �� �κ��� �ӱݿ�
���� �����ϴ� �����̴�. ���․������ ���� �ӱ�ü���
�ܱ�․������․���� �ӱ�ü��� ���� �ٲ�� �ִ�.
�̷��� �帧�� �뵿������ �ӱݱ����� �����ϴ� ���� ����
��ȭ��Ű��, �� Ȱ�� ������ ��ҽ�Ű�� �ִ�.
��ǥ�� ����ϰ� �ִ� �뵿������ ����
�ں����� �ϳ��� �Ǿ� �� ������ ����ϰ� �ִ� ���� ������
Ÿ���� ���ε��̴�. ���ڴ� ��������� �÷����� ��ȯ����
�� �ִ� ���Ż��․����â���������ȸ�� ������
�ϰ�ð� �������� �����ϰ�, ������ȭ �� �Ż�� â���� ����
��å�� ���ο� ��û�ϰ� �ִ�. �ű⼭ ���ϴ� ��������
��꿡����, 2000����� 309������ ����â���� �����Ѵ�.
�������� ������ ���� �뵿�ڸ� �ذ��ϰ�, �� ��ħ���ø�
����ڴٴ� ���̴�. 1�� 31�� �ѹ�û�� ��ǥ�� 1996��
�����Ǿ��ڴ� 225����(�Ǿ��� 3.4%)���� �־��� ����ߴ�.
����․���, ������� �� ���ι����� ������� ��ȯ��
�����ϱ� ���ؼ��� �� �� ���� �Ǿ��� �����ؾ� �Ѵٴ�
�����ں��� ��Ҹ��� �ִ�.
������� ���Ծ��� ��ǥ(ǥ������)�ൿ�� ���ʷ� ��, ��ġ������
�뼱�� ����� ���ϰ� �ִ�. ������� �۳� 12�� 15�Ϻ���
17�ϱ��� �������� �Ἲ �̷� �ִ��� 1,350���� ���� ����
�����ȸ�� ���� 「��������」�� Ȯ���ϰ�, ��
������ ��������� ���ݵ��� ��ȯ�� �ô롯��� �����Ͽ���.
�ű���� ���� �Ѽ��ſ��� �Ϻ�������� ��ǥ�� 726�� ǥ��
��dz ��� ����ü���� ������ ��ȭ�� ������ �뵿�ڸ� �����ϴ�
�� �����ϰ� �Ǹ� �츮 ���� �뵿���տ�� ���ο� ������
����� �� �ִ١��� ���� �����ϰ� �ִ�. ����
「��������」���� ����․���������� ���ʷ� ��
������ ���� ��� ���� �ʴ�.
�Ž��Ŀ����� �������������̶�� ��dz�� �غ��ϱ� ���ؼ�
������ ������롯 �ϼҶ�� �ϴ� ķ������ �����ǰ� �ִ�.
������ �����․�ʰ��ٹ������� �밡�� ���ҵ� �ӱݱ�����
�籹�� ���꺯��․ȸ����� �������ѡ� �����̶� �Ͽ�
�ݳ��ǰ�, �뵿���ձ��� �籹�� �ϳ��� �Ǿ� ��ȸ�ϰ� �ִ�.
�ű���� �뵿��․�ٷ��ι��� �����ϰ� �ִ�
��������ȭ․�������������� ������ �������� ������
���ϰ�, ��������ȭ���� ���������������� �������� ��������
�ִٴ� �Ϻ�������� �߸��� ��п� �ֵѷ� ���� ��ġ�� �ִ�.
�뵿������ ���忡�� �ŷڸ� �Ұ� �������� ���ϵǾ� ���տ���
��� ���ҵǰ� �ִ�. ���� ������ ��ġ��(����Ҿ)�� �����ϸ�
�������� ������ �����ϰ� �ִ� ���� ������� �ٽ���
�Ϻ������������뵿���տ���ȸ(����Ҿ֤)�� ��ġ����̴�.
���� ���� �뵿���տ�� ������ǥ․��ǥ�ൿ�� ����
��ġ�ൿ�� ������� ����� ������ �ּ�ȭ��Ű�鼭,
����․�������忡�� ������ ����� �����ϰ� �ִ� �Ϳ���
���� ���� �ִ�. ��� ���ϰ���� �����ϴ� ��������ȭ��
�ݴ롱��� ���� ������, �Һ� �ݴ� ���� �����, �����
���������� �м��� �����丮��(Victory Map)�� ķ������ �״�
�ڷ� ���� ������.
���� �������� ���忡�� �Ͼ�� �ִ� �����ݺ�����롯 �ϼ�
��ķ������ ��ī�ҳ� ������������ �� ����(��Ҿ)��
����(����)�̶�� �θ��� �� ������ ķ���Ρ��� �ٸ� �� ����.
�װ��� �̿��� ��ö�� ���ҹο�ȭ��Ű��, ���븦 ��ü �����
���Ƴ־���. ������� ��ħ���δ� �Ļ����� �뵿���� �պ���
����� �߾Ӽ�û․������ġü ���� ����� �������� ���ϴ�
�Ͻø��� �������������� ������ �� ���� ���̴�.
�����뵿� ������ ���� ö��
�ѱ��� ���ֳ��Ѱ� �뵿�ڴ������۴��� ����������
「���ľ� ����Ӻ�」���� �迵�� ������ ���� 6�ÿ�
��ġ���� ���dz뵿���� ������ ���� �ִ�. �������ذ�����,
���ٷ����İ�����, �������ð����� �� �뵿�� ��ȣ�� ����
��ȭ�� �뵿���� ����ȭ ���� �� �����̴�. ���� �뵿�ǹ���
��ȿȭ��Ű�� ���� ���ֳ���(50�� ��)�� �ѱ�����(120�� ��)��
�������� �ѱ��뵿� ��� �ִ��� 75�� ���� ���ľ���
�����ߴ�.
���ϳ뵿�ѵ���(DGB)�� �� ������ �������� ���� ����������
������ �ӱݵ��� ���� ���� ���� 「����� ���ڸ� ����
���α�」�� �ݴ��Ͽ� �۳� 11������ ���� �ִ� �Ը���
40�� �� ��ȸ ������ �����Ͽ���, ������
�۷ι�ȭ․������ȭ�� �帧�� ����ȸ�� �����������
��ġ���� 15�⸸�� �⺻������ �����ߴ�. ���Ͽ����� ���� ����
���Ǿ��� ��ӵǾ� �ݳ� 1���� ��ħ�� �Ǿ��ڼ��� 465�� 8õ ��,
�Ǿ��� 12.1%�� ���� �� �־��� ��ġ�� ����ߴ�. �� ���
�İ߳뵿�̳� ���ñٹ� �� ���������� �پ�ȭ�� ����� �ο�ȭ
���� Ȯ��ǰ� �ִ�. �Ű����� ���۷ι�ȭ�� ������ȭ��
�뵿�迡 �뺯���� ������, �뷮�Ǿ������� ��ȭ��Ű�� ��ȸ��
�п��� ��ȭ��Ű�� �ִ١��� �����ϰ�, �� ��ȭ�� ���Ͽ� ��ȸ��
������ ��ȸ���������� ������ �߿��ϴٰ� �����ϰ� �ִ�.
�̱������� ���Ǿ�(93�� 2��, 7.0%, 800�� ��)�� �غ��ϰ�, 96��
������δ� 5.4%���� �Ǿ����� ����߷�, ���꼺 ��°� �����
����� ȸ���� ���� �ֽ� �� ����� �ִ�. ������ �뵿����
���´� ��Ѱ�. ���̿���(Lay off), �ӱݵ���, ��������
�������� ������ ��dz�� �ż��� �Ұ� �ִ�. �ֱ� 10�� ���ȿ�
�İ߳뵿�� �� �Ͻ��� ����뵿�ڴ� 210�� ������ 3�� �����ߴ�.
�ں��� �ʿ��� �� �ʿ��� ��ŭ �뵿�ڸ� �����ϰ�, �ʿ䰡
�������� ��� �ƹ��� ���� �δ㵵 ���� �ʰ� �뵿�ڸ� ���η�
�����Ű�� ���η� ���ǹ��(����۰��)���� ���߿� �־���.
�ں������� ��������․���ڰ����� �Ϲ������� �ı�, �뵿��
��ȣ������ ö���ϰ�, �뵿������ ����ȭ�� �����ߴ�. 700�� ��
�̻��� �뵿�ڰ� �߰��̳� �ָ��� ������ �뵿�� �����ϰ� �ִ�.
�̱������� �߰� ���� ���̸鼭 �����뵿�� �����ϴ� �־߰��
�뵿�ڸ� ���������͡�(Moon Lighter)��� �θ��� �ִ�. ������
ȸ���� ������ ��κ� ���İ��� �� �����̴�. �������´�
��ƮŸ��․�İ� ���� ��κ��̴�. �������Ͽ��� �ӱ���
���� ������ 80% ������(�ֱ� 373.63 ��)���� 60��� ���ؿ�
��ġ�� �ִ�. �̱������� 70��� �̷� �¹��̰� ����������,
90��� ���ͼ���, �κΰ� 3���� �̻��� ���� ���� ������
�����ϰ� �ִ�. �����ӱ��� ���Ϸ� �¹��̷ε� ��Ȱ��
�Ұ����ϱ� �����̴�.
�̱��� �뵿�ڴ� �̷��� �ݳ뵿���� ��å�� �ں����� �Բ�
�����ؿ� AFL-CIO ȸ�� ������ ĿŬ���塯�� �缱��
����(NO)���� ���̹а� �� ȸ�忡 ������ ���� �����ϡ�(John
Sweeney)�� �����ߴ�.
�ϰ���� 1994�� 11���� ���ο� ������ ��������
����ö��․��ȭ ����� ���� 1) ����� �����ӱ��� ����
2) �뵿���İ߹� ������ ��� Ȯ�� 3) �뵿���ع���
������ȣ���� ö��․��ȭ 4) �緮�뵿���� ���� Ȯ�� 5)
���������Ұ���� ���� ��� Ȯ�� 6) �뵿���� ����������
���� �Ű� ����ȭ�̴�. �Ϻδ� �̹� ����ǰ�, ��κ���
�Ͻø��� ������ ��� �����Ϸ��� �ϰ� �ִ�. �̰Ͱ� ��������
�ʰ� �뵿��� ������ �� ����. �����ں����� �ں������� ����
�Ϲ��� ������ �ο��ϴ�
��������ȭ․�ο�ȭ․�������������� ������ ��������
��ġ�� ���������� ��������. ���� �����ϰ� �ִ� ������
�뵿��� ��缺�� ������ ������ �ݺ����δ� ������ Ÿ����
�� ������ ������ �ְ� �ִ�. ����․�������忡 �ǰ��Ͽ�
����․������ ������ �ľ������� ��ö�� ü���� �����ϱ�
���� ������ ���Ӽ��� ���������� ������ �ʿ��ϴ�.
�Ϻ��뵿��� �̷��� �������� ������ �ñ��� ���� �����
���� �䱸�ǰ� �ִ�. (ꡔ�������ꡕ No.558,
97��.3.1����) ��/��/��/��
���� : ������ / ������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