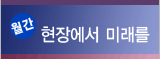국 ◦ 제 ◦ 노 ◦ 동
자본축적체제 변화에 따른 멕시코 임금구조의 변화
사공 정 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연구학과 석사)
작금의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주도적
축적체제였던 포드주의체제에서 포스트 포드주의 축적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즉 포스트 포드주의체제에서는 과거
포드주의 시대의 케인즈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조처와 노동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신보수주의의 득세속에서 과거의 코포라티즘적 계급타협정책이
붕괴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던 사회적 제도와
합의들이 철회됐다. 한편 기존의 산업별 노사관계가 단위기업
수준으로 분권화하면서 자본은 주도권을 쥐고 고용, 노동조직,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를 임의로 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멕시코 역시도 이러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등 중심부 국가의 포스트 포드주의와 달리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축적체제라는 종속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대체로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1982년을 기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양상과 이것이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멕시코의 자본축적체제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멕시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멕시코가 실시한 수입대체
산업화정책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 이하 ISI로
표기함)에서 잘 나타났다. 이 정책은 미국의 포드주의체제를
모델로 한 것이다. 특히 멕시코가 ISI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심부 자본주의국가, 그중에서도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이 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론에 입각해 내수소비에
치중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의존도가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멕시코에게는 수입자원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멕시코는 ISI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ISI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실패하고 말았다.
멕시코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높은
무역장벽과 환율의 평가절상 등을 통한 독점적 산업구조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Hirsch, Joachim, Interpretation of
Capital, State and World Market in Terms of Regulation
Theory(Non-Published Manuscript), 1-15쪽
. 즉 충분한 생산력이 담보되지도 못했고, 사회세력에 대한
통제의 미비와 사회적 분극화로 구매력 또한 미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외부적 요인에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미국기업의 일본, 유럽에의
엄청난 투자로 생산력은 발전했으나, 미국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었다. 이런 미국무역의 결함은 세계화폐로서의 US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브레튼 우드(Bretton Woods) 체제를
붕괴시켜, 세계시장의 제도화된 정치적 조절양식을 파괴시켰다.
이러한 국제적 화폐, 금융체제의 위기는 유동자산의 과잉유통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는 생산력의 발전이 국제 금융시장의
팽창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결국
국제금융시장은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ry Fund,
IMF)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점차 단기차익을 노리는
민간은행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제적인
포드주의적 조절양식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국제적 화폐,
금융체제의 탈조절화를 야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차관이
중남미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고, 멕시코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결국 수입대체산업화에 실패한 멕시코는
외채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외채탕감을 위해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노동분업체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는 여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MF식의 구조조정을 채택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포드주의 체제의 붕괴로 노동비용이 상승한 미국은
값싼 노동력을 멕시코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미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멕시코로 이양되게
되었다. 결국 마낄라도라로 대표되는 양국의 노동분업체제로
멕시코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라는 독특한
체제가 구축되어 국가부문은 탈규제, 민영화 등의 포스트
포드주의적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포드주의적 성격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Lipietz, Alain,
“Accumulation, Crisis and Ways out,” In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8, No. 2, summer, 10-43쪽
.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의 축적체제가 변화된 시점은 대략
1982년경으로 보인다. 멕시코에서 축적체제의 전환은 1982년을
전후한 국가부문의 정책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82년 이전의
멕시코 축적체제는 ISI로 요약되는 내수시장 확대전략이
중심축이었다. 멕시코의 수입대체전략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전적으로 내수위주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 기술
및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구상과
실행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내수시장 확대전략은
수요창출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므로 국가부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1982년을 전환점으로 멕시코 축적체제는 주변부
포드주의에서 후기주변부 포드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데 라 마드리드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정책이다. 이후 이러한 정책기조는 살리나스와
세디요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이다.
이성형, “1980년대 이후 멕시코 노동운동 : 코포라티즘의
‘해체’인가 ‘재편’인가?” ꡔ지역연구ꡕ 3권
3호(1994,가을) 171-206쪽
먼저 사회정책을 살펴보면 국가는 기존의 코포라티즘적
노동정책을 해체시키고 노동부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은 기존의 내수시장 중심에서
수출주도모델로 그 중심축을 전환시켰고 개방화 및 민영화를
통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시장개입을 배제시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외국기업에서 도입된 유연생산방식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기업에서의 파트타임 및 임시직 노동자를 활용하며, 감원을
댓가로 임금인상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노동력 통제방식은
멕시코 국내기업에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2. 멕시코의 임금구조의 변화
1) 멕시코의 임금변동 추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멕시코의 실질평균임금은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표>에 의하면 1992년
실질평균임금은 1975년에 비해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최저임금 역시 약 50% 가량 하락했으며 제조업부문의
실질임금도 비슷한 추세에 있다.
1980년대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것은 제조업부문의 임금구조 자체가 이전
보다 더욱 취약해졌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제조업부문의 임금하락은 총평균임금 하락과 비교하면 나은
편이다. 총고용에서 실질평균임금의 하락이 제조업부문 하락보다
그 폭이 더욱 큰 것은 제조업 부문보다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최저임금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저임노동력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1982-1983년 사이에 각종 임금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시기는 1982년 멕시코에서 뻬소화의 폭락과
경제위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으로 갈수록 임금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1982년의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 전환하여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이는 1982년 이전의 임금지표가 안정되어 있던데 반해 이후의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자본축적체제에서 임금구조의 취약성은
단순히 경제전반의 성장지표로 설명할 수 없는 축적체제의
변화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2) 임금하락의 원인
멕시코에서 실질임금하락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의 취약성과 서비스부문의
성장, 둘째 여성노동자의 증가, 셋째 비공식부문의 성장, 네째
비숙련노동자의 증가, 다섯째 노동조직의 약화 등이다. 그러면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임금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에서 살펴보자.
가. 제조업부문의 취약성과 서비스부문의 증가
멕시코의 산업구성비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시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의 임금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런
경향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제조업부문 신규투자는 외국인
기업에 의한 단순조립공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외국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Sklair,
Leslie, Assembling for Development : The Maquila Industry in
Mexico and Unitied States(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SCD, 1989), 24-42쪽
만약 값싼 노동력이 멕시코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공장이전으로 물류비용과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물류비용과
공장이전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들 두가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값싼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임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가격결정점을 떨어뜨리면서 이것이
전체 임금수준을 하락시켰다.
그나마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이 1980년대말을
고비로 바뀌었다는 점은 임금구조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즉 외국인 투자의 구성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과 구조전반이 취약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다시 임금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나. 여성 노동자의 증가
여성 노동자의 증가 역시 임금하락으로 연결된다. 멕시코의
임금통계를 보면 남녀 임금격차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남녀 임금격차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남녀
임금격차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멕시코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남성 노동자들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부문 뿐 아니라 제조업부문에서도 여성
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여성 노동자들이
갖는 임금의 유연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 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이직률과 해고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임금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측은 새로운 자본축적전략으로 이와
같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취약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 등 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Kopinak, Kathryn, “Women
Maquiladora Workers in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2, No. 1, winter, 1988, 41-4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적어 그들의
불리한 임금구조를 타파할 조직력 또한 남성보다 약하다.
다. 비공식부문의 증가
비공식부문이란 최저임금, 고용안정법, 단체협상권, 사회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모든 경제영역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비공식부문은 이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임금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멕시코에서 이런 비공식부문의 증가현상은
1982년 이후 가속화 되었다. 비공식부문의 지역별 집중도를
보면 수도권지역에 전체 비공식부문의 35%가 집중되어 있다.
이를 고용노동자수로 환산하면 약 400만명에 달한다. 다시
업종별 집중도를 보면 상업에 대한 집중률이 25.6%, 기타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률은 35.7%에 이른다. 이를 합치면
61.3%로 비공식부문내에서도 서비스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남섭, “멕시코의 사회구조변동과 도시비공식부문의
사회적 성격:신사회운동과 관련을 중심으로”
ꡔ지역연구ꡕ 3권 3호(1994,가을) 223쪽
비공식부문의 임금구조를 보면 비공식부문 총고용인구의 65%가
임금노동자이며, 35%가 자영업에 해당한다. 임금수준의
측면에서는 약 40%가 최저임금의 반이상을 못 받으며 거의 65%가
최저임금의 4분의 3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의 지속성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을 보면 다른 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짧다.
약 40%가 1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며, 23%가 6개월 동안의
실업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Ibid., 223쪽
한편 비공식부문 고용의 성별 특징을 보면 남성노동자들의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증가율은 56.9%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인구는 남성보다 빠르게 비공식부문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지표로
수도권지역에 고용된 남성 노동자의 29.5%만이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데, 여성 노동자는 43.6%에 육박한다. Ibid.,
223-224쪽
이를 종합하면 멕시코에서 비공식부문의 성격은 서비스부문과
여성의 구성비가 높고, 임금구조가 취약하며, 고용안정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의
임금구조가 취약한 이유는 법적인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게 형성된 데 있다.
라. 비숙련노동자의 증가
멕시코의 비숙련노동자는 숙련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이와 같은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숙련노동자들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비숙련노동자의 증가는 당연히 임금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낄라도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이 저임금과 비숙련노동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의 공장들이기 때문에 커다란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더우기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쇠퇴로
농업노동자들의 마낄라도라 유입현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것이 평균임금에서
임금상승분을 상쇄시키고 있다.
마. 노동조직의 약화
멕시코의 노동조직 약화현상은 자본축적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크게 두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노동부문에서 국가의 퇴장과 또 하나는 기업의 유연화공세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의 대응은 약화된
노동운동으로 소극적이기만 하다.
이런 노동조직의 약화현상 또한 임금하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는 파업관련 지표를 보자.
나타난 1982년 이후의 파업위협과 파업횟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물론 파업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단체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지표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만큼
노조측이 사용자측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양보교섭이
확대되고 있다. 1983년 포드사와 디나, 르노사 등에서는 각각
2,000명에서 3,000명의 감원을 댓가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1986년부터 시작된 ‘산업재편(Reconversión
Industrial)’ 프로그램으로 노동일, 기술혁신, 임금, 노동조직
등 과거 단체협상에 규정된 사항들은 이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통보사항이 되었다. 이성형, op. cit., 192-193쪽
결국 이러한 노동조직의 약화현상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추세는 코포라티즘의 해체와 기업의 유연화 공세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 노동조직의 움직임으로
보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교훈
이상에서 우리는 멕시코가 1982년을 기점으로 자본축적체제가
변화됨으로써 나타난 임금구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런 양상은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하락과 중심부
국가에 대한 종속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노동부문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기업의 입장에 서 있는 멕시코
국가의 신보수주의정책과 노동조직을 파편화하는 기업측의
유연화전략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노동운동은 이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다. 이는 과거 멕시코 노조들이
관변노조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인데,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진
이러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멕시코는 NAFTA의 타결과 세계경제의 국제화로 인해 노동문제를
일국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 노동자들이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독립노조의 조직력을 배가시켜야한다. 또한 전세계적인
자본축적체제의 유연화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국 차원에서 뿐아니라 세계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한/노/정/연